-

-
에논
폴 하딩 지음, 민은영 옮김 / 문학동네 / 2016년 3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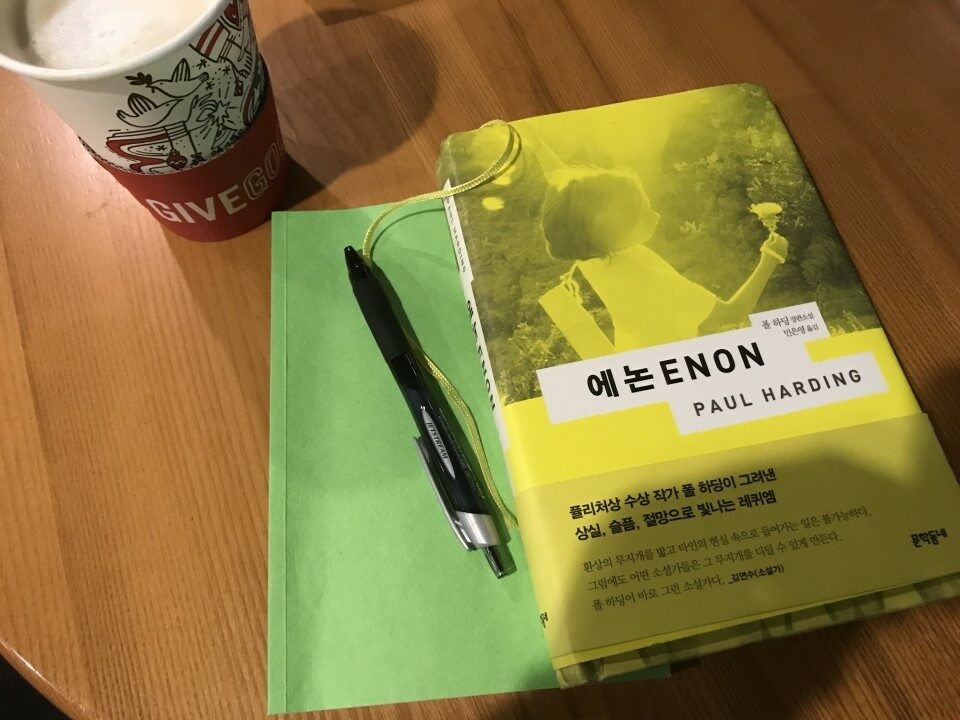
나에게는 아이가 세 명이 있다. 4살짜리 아들과 9개월 된 쌍둥이 딸 둘.
아이가 생기고 나서 뉴스에 연일 보도되는 아동학대 사건들, 혹은 아이들과 관련된
안타까운 의료사고들,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아동 사고들에 관련된 기사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이 너무 두려웠다. TV만 틀면 이영학, 조두순, 17살 여고생 두 명이 공모하여
한 명은 아이를 죽이고, 다른 한 명은 신체의 일부를 달라고 요구하여 보관하다가
제멋대로 처리했다는 둥 정말 끊임없이 연일 아동과 관련된 끔찍한 사건, 사고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마치 내 아이가 그런 일을 겪은 듯한 공포감이 내게 밀려와
나는 그 사건들의 실체조차도 제대로 알고 싶지 않은 기분이었다.
그런데 유독 요즘 한국문학에서도 아이를 잃은 부재를 그린 소설들이 많이 출간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김영하 작가의 [오직 두 사람], 김애란 작가의 [바깥은 여름].
그 소설을 읽는 내 표정이 얼마나 어두웠던지 신랑은 내게 오죽하면 무슨 일 있느냐고
물어보았고, 나는 이 단편소설의 내용이 아이를 잃은 부모의 상실에 대한 내용인데
너무 절망적이고 꼭 내가 겪은 일 같아 기분이 좀 찜찜하다고 이야기를 하자
신랑은 내게 "제발 그런 것 좀 읽지 마라~ 기분풀려고 책 읽는건데 더 슬퍼지면 뭐하러
읽니."라는 핀잔을 주었다. 사실 두 작가님의 [입동], [아이를 찾습니다.]를 읽고 난 후
내가 좀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우울했다.
단지 소설인데 불구하고 왜이리 기분이 찜찜하지 싶었는데 지금 이 [에논]을 읽고
난 후 나는 그 이유를 깨달았다. 단편소설이라 슬픔에 빠져들게만 했지, 그 슬픔을
오랫동안 느껴서 절정에 이르게 한 다음 슬픔에서 건져내주는 과정이 빠져있었다.
그냥 나를 물가로 데려가 뒤에서 풍덩 빠뜨려 물에 젖은 생쥐꼴로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고, 옷을 햇볕에 말려주는 그런 과정은 "쏙" 빠졌던
거다. 처음 당근님의 이색리뷰 소개글에 이 [에논]에 대한 간략한 소개글을 읽었을 때
이 소설을 내가 감당할 수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됐다. "상실, 슬픔, 절망으로 빛나는 레퀴엠"
이 문장이 아름답게 느꼈으나 소설 속에 빠져드는 일이 두려웠다. 나는 겁이 많은 독자이기에.
그때 문득 책장 안에 박준 시인님의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이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다. 그건 바로 이 책을 얼른 펴들고 슬픔에 푹 빠져보라는 어떤 게시와
같이 느껴졌다. 그제서야 조금 용기가 생겼다. 박준 시인님이 내게 "읽어도 괜찮을 거야..."
하고 조근조근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는 것 같다는 환상.
비교적 담담하고 사실을 나열하는 건조한 문체로 이 소설은 이야기를 시작한다.
*7page
[우리 집안 남자들은 대부분 아내를 과부로 만들고 자식들을 고아로 만든다. 나는 예외다.
내 외동딸 케이트는 일 년 전 9월의 어느 오후 자전거를 타고 호숫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에 치여 죽었다. 케이트는 열 세 살이었다...]
그렇기에 주인공 찰리가 이미 딸 케이트를 잃은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전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상을 빗나갔다. 찰리는 케이트를 잃은 후 자기 감정을
절제하려고 노력하는 부인 수전과는 달리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정신벽적인 증상
과 더불어 각종 환각과 약물, 신체적 고통을 겪는다. 비교적 이성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찰리의 심정을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어떤 부모가 먼저 자식을 떠나보내고 정상적인 삶을
이어나갈 수 있단 말인가.
*20page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가 말했다.
"그래도 해야 돼. 찰리" 수전이 말했다. 아내는 내 방으로 들어와 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수전은 내 머리를 손가락으로 빗어넘겼다.
"전부 우리가 해야만 해."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수. 하고 싶은데, 내 몸조차 움직여지질 않아."]
나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은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에 무게가
더한다고 믿는 편이다. 그 심적 고통 중에 최상위에 속하는 것이 자식의 죽음, 그 다음이
배우자의 죽음이라 한다. 오죽하면 이런 말도 있지 않나.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어야
한다."라고.
언젠가 KBS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한 백년 살아보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방송에 출연한 99세 조동환 할아버지의 인간극장을 아주 재미있고, 또 인상 깊게
시청한 적이 있다. 조동환 할아버지는 한 백년을 살았어도 아직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다. 할아버님은 7명의 자녀를 낳아준 첫 부인을 병환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고, 그 뒤를 이은 두 번째 부인도 8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보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도 하나 둘 먼저 세상을 떠났고, 무엇보다 장남 내외가 할아버님
보다 일찍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다. 유독 장남 내외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말씀
하시는 할아버님의 옆모습에서 그 아픔의 세월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의 틈이 보이는 것 같았다.
*141page
[케이트의 죽음에 어떤 심오한 선함이나 축복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은 상상 속에서는
품을 수 있었고 심지어 그것의 진실성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느낀 적이 없었다. 창조에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해서 내
슬픔이 지워지는 것은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142page
[나는 케이트의 죽음 이후 계속해서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끼는 나 자신이 당황스러웠다.
비록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고 오랜 세월이 흐른들 그 아픔이 아물 수 있으랴. 그냥 딱지가
지고 그 위에 계속 덕갱이가 져서 굳은 살로 남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에
조금이나마 둔감해질 수 있다면 그나마 상처가 치유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