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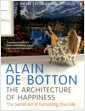
-
The Architecture of Happiness (Paperback, 영국판, New Edition) - The Secret Art of Furnishing Your Life
알랭 드 보통 지음 / Penguin Books / 2007년 3월
평점 :

품절

알랭 드 보통의 행복의 건축은 집에 한국어 버전으로 있긴 한데 오랜만에 영어 실력도 다시 점검할 겸 건축 도서가 원서로 있는 게 우리 시립도서관 전체를 통틀어 이거 한 권이라서 빌려왔다. 추석 명절 잘 보내보자... 딴짓하지 말고... 다음은 excerpts.
Echoing the attitude of Stoic philosophers or St Bernard around Lake Geneva, we may find ourselves arguing that, ultimately, it doesn’t much matter what buildings look like, what is on the ceiling or how the wall is treated — professions of detachment that stem not so much from an insensitivity to beauty as from a desire to deflect the sadness we would face if we left ourselves open to all of beauty’s many absences.
프로이드가 릴케랑 오랜 비가 끝난 날 외출했는데 릴케가 아름다운 주변을 보지 않고 땅만 보며 괴로워하는 걸 이 모든 미의 한계인 비영원성에 슬퍼했다고 한 anecdote를 읽으니 진짜 예민한 시인과는 친구 못 해먹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프로이드도 ㅋㅋㅋ 릴케에게 unsympathetic 했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기닼ㅋㅋㅋㅋㅋㅋㅋ
We may need to have made an indelible mark on our lives, to have married the wrong person, pursued an unfulfilling career into middle age or lost a loved one before architecture can begin to have any perceptible impact on us, for when we speak of being ‘moved’ by a building, we allude to a bitter-sweet feeling of contrast between the noble qualities written into a structure and the sadder wider reality within which we know them to exist. A ump rises in our throat at the sight of beauty from an implicit knowledge that the happiness it hints at is the exception.
아 근데 행복이라는 건 확실히 그전에 불행이라는 것 혹은 고통이라는 것을 겪어야 알 수 있는 거 같음. 예술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로.
We might, wuite aside from all other requirements, need to be a little sad before buildings can properly touch us.
혹시 고통이라는 것은 apriori인가...?
빌라 사보이에 단점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도 있고 읽은 적도 있지만 워낙 내 취향이라서 별 생각 없이 넘겼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뼈저리게 느꼈다. 천장은 늘 물 빠져나가는 구멍을 꽤 내든가 아니면 기울어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나야 건축 설계라곤 끽 해봤자 심즈에서 해본 게 다인데 워낙 취향이 평평한 옥상이 나오는 지붕이라 늘 그렇게 지었는데 이게 현실이라면 법정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었겠구나... 요새 구해줘 홈즈라는 예능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거기서도 나오는 전문가(보통 인테리어)가 항상 지붕이 기울어져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 르코르뷔지에 덕분에 얻게 된 지식이구나 싶어 ㅋㅋㅋ 아 재밌다.
Buildings speak — and on topics which can readily be discerned. They speak of democracy or aristocracy, opennes or arrogance, welcome or threat, a sympathy for the future or a hankering for the past.
In essense, what works of design and architecture talk to us about is the kind of life that would most appropriately unfold within and around them. They tell us of certain moods that they seek to encourage and sustain in their inhabitants. While keeping us warm and helping us in mechanical ways, they simultaneously hold out an invitation for us to be specific some of people. They speak of visions of happiness.
To describe a building as beautiful therefore suggests more than a mere aesthetic fondness; it implies an attraction to the particular way of life this structure is promoting through its roof, door handles, window frames, staircase and furnishings. A feeling of beauty is a sign that we have come upon a material articulation of certain of our ideas of a good life.
미는 어떤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미를 보고 추구하는 사람의 사고를 드러내주는 방법에 알맞을 때 느끼는 거라는 것, 꼭 건축만이 아니라 모든 대상이 그런 거 같다. 진짜 그런 거 같아. 이래야만 누군가의 미적 감각에 대한 비판도 가능하고 다양성도 어느 정도 용인될 거 같아.
Secondly, our reasons for liking abstract sculptures, and by extension tables and columns, are not in the end so far removed from our reasons for honouring representational scenes. We call works in both genres beautiful when they succeed in evoking what seem to us the most attractive, significant attributes of human beings and animals.
사물에서 인간이나 동물 등의 속성과 유사함을 찾아서 그 사물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인상이나 사고를 얻는다는 건 알면서도 인지 못 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서 선 하나를 삐쭉빼쭉 그리는 것과 둥글둥글 그리는 것을 가지고 그 선이 갖고 있는 성질(인상으로서)을 파악한다는 것도 생각해보면 늘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인지 인지도 못 하고 저절로 하고 있었어. 관습과 학습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솔직히 알랭드보통에서 얼굴 생김새로 성격을 판단하려 했던 시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에선 얼굴 생김새로 미래를 점치려 했던 시도에 대해서 떠올리고 이게 다 뭐야 ㅋㅋㅋ 아 정말 웃기고 여전히 관상학이라는 게 tv에서 재미로라도 인용되는 거 보면 ㅋ 사람은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어쩌면 이성적/합리적이라는 게 사실은 본능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가 싶기도 하다.
It was Stendhal who offered the most crystalline expression of the intimate affiliation between visual taste and our values when he wrote, ‘Beauty is the promise of happiness.’ His aphorism has the virtue of differentiating our love of beauty from an academic preoccupation with aesthetics, and integrating it instead with the qualities we need to prosper as whole human beings. If the search for happiness is the underlying quest of our lives, it seems only natural that it should simultaneously be the essential theme to which beauty alludes.
우리집(home)이라는 게 어째서 그저 부동산으로서 가치가 아니라 더 많은 뜻을 갖게 되는지 설명해주는데 너무 와닿는다.
Those places whose outlook matches and legitimates our own, we tend to honour with the term ‘home.’ Our homes do not have to offer us permanent occupancy or store our clothes to merit the name. To speak of home in relation to a building is simply to recognise its harmony with our own prized internal song. Home can be an airport or a library, a garden or a motorway diner.
Our love of home is in turn an acknowledgement of the degree to which our identity is not self-determined. We need a home in the psychological sense as much as we need one in the physical: to compensate for a vulnerability. We need a refuge to shore up our states of mind, because so much of the world is opposed to our allegiance. We need our rooms align us to desirable versions of ourselves and to keep alive the important, evanescent sides of us.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할 수 없기에 세상 모두가 우리에게 등질 때 우리를 보호할 장소가 필요하고 그곳이 바로 우리집이라고 하는 것, 이에 동의 안 할 수가 없다. 특히 너무 지쳤을 때, 외부로부터 스트레스가 극도로 넘쳐 우리집으로 피신마저 그 완전한 보호가 되지 않을 때, 거실이나 방에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우리집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 명확히 알 수가 있지...
초기 기독교 지하무덤인 카타콤 벽에 그려진 아마추어 성경 그림에 대해서: They reveal how in the absence of great patrons or craftsmen, with no skills or resources to speak of, the faithful will feel a need to daub the symbols of their heavens on damp cellar walls — to ensure that what in around them will fortify the truths within them.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을 둘러싼 주변에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게 웃기면서도 교과서라고 생각해보면 또 이해가 감...
이슬람에선 성전 안에 온갖 기하학으로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어지럽게 만들어서 신의 권위에 무릎 꿇게 하는 거랑 기독교에서 웅장한 성경 그림으로 신의 권위에 무릎 꿇게 하는 거 비교해보면 솔직히... 서양의 문화 수준이 전적으로 동양의 그것에 못 미치는 거 같기도 함. 꼭 실물로 모델을 보여줘야 이해하나 싶고...
Owning such an (beautiful) object may help us realise our ambition of absorbing the virtues to which it alludes, but we ought not to presume that those virtues will automatically or effortlessly begin to rub off on us through tenure. Endeavouring to purchase something we think beautiful may in fact be the most unimaginative way of dealing with the longing it excites in us, just as trying to sleep with someone may be the bluntest responses to a feeling of love.
What we seek, at the deepest level, is inwardly to resemble, rather than physically to possess, the objects and places that touch us through their beauty.
다 좋은데 알랭 드 보통은 고층 건물에 대해 부정적이군. 하지만 결국 도심 안에서든 외곽에서든 어포더블한 공간을 만든다면 고층 밖에 방법이 있어? 물론 르코르뷔지에의 생각이 얼마나 나이브한가는 분명히 알았다. 아예 외딴섬을 만들어버려 슬럼이 되어버렸다는 것. 하지만 그랬다고 해서 어느 정도 높이 제한이 있는 고층 건물의 유효성에 대해 부정하고 싶지 않음. 누구나 도시 안에서 공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럼에도 르코르뷔지에가 자신의 계획 안에 경제 구역을 주거 구역이랑 구분해서 떼어놓은 것은 확실히 나이브하고 멍청했던 거 같아. 그런 기획에는 더 저렴하고 접근이 다양한 교통이 기반되어야 했는데 그저 자동차와 인도만 생각했다니;;; 근데 르코르뷔지에의 유니테다비타시옹에 아직도 사람들이 사는지 몰랐어;;; 그냥 문화재로 남겨둔 건 줄 알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