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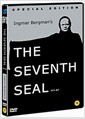
-
제7의 봉인
잉그마르 베르히만 감독, 거너 본스트랜드 출연 / 피터팬픽쳐스 / 2008년 4월
평점 :

품절


잉마르 베리만. 대학시절 이름만 들어도 떨리는 감독이었다. 영화 안에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모두 위대하게 느껴질 무렵이었다. 잉마르 베르히만의 주제의식은 그래서 궁금했었다. 그 사람은 무엇을 다루기에 거장으로 불리울까. 그의 마지막 작품인 <사라방드>를 보았다. 이게 뭔가 싶었다. 그때는 전 작품과 연계된 영화라는 것도 몰랐고 방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끝없는 수다처럼 느껴졌다. 거장이고 나발이고 영상미란 보이지도 않았고 단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보았던 기억만 남아있었다. 그게 잉마르 베리만의 첫 이미지였다.
예전에 한 영화감독이 이런 말을 했다. (아마 장 뤽 고다르인 것 같다.) 영화라는 매체는 죽어가는 시간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인간을 죽음의 운명으로 시간이 간다는 것을 죽음을 향해 가는 것으로 받아 들인 것이다. 또, 어떤 이는 말했다. 우리가 최초로 부딪치는 인간 실존의 문제는 언젠가 찾아오는 죽음의 공포다.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리지 못하며 이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다. 죽음의 문제는 언젠가 부딪힐 중대한 문제다.

베리만은 이런 사유를 영화를 통해 접근한다. 기사가 죽음(의인화)과 체스를 두어 자신의 수명을 연장한다. 그는 단지 더 살고 싶은 욕구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 특히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 명확하게 느끼기 위해서다.(죽음과 연관이 있다.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면 그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 영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머릿속으로 모든 것(교리, 성경)을 알고 있다. 겉모양으로도 신실하다. 첫 등장부터 하늘에 감사 기도를 올린다. 하지만 그는 십자군 전쟁과 흑사병을 겪으며 회의감에 빠졌다. 그는 알고 싶다. 진리의 실체를 확신하고 싶다.

죽음의 이미지는 영화 곳곳에서 배어있다. 그 안에서 비이성적인 인간들이 무지한 행위는 반복된다.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행진하는 이들. 그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흑사병이 멈출 것이라 한다. 또, 마녀를 잡아 화형시키는 사제와 군인들. 그 행동으로 흑사병이 멈출 것이라한다. 기사가 보기에 이 모든 행위들은 미신이다. 미신으로 전락한 종교행위에 대한 회의감. 맹목적인 신앙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 속의 인간들의 광기와 무관심이 그를 괴롭힌다.
기사 나는 지식을 원합니다.신앙이나 가정이 아닌 지식 말입니다. 나는 신이 내게 손을 내밀고 그 자신을 내게
드러내어 말해 주기를 원합니다.
죽음 하지만 그는 침묵을 지키고 있지.
기사 나는 어둠 속에서 그 분을 소리쳐 불렀지만 아무도 거기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죽음 어쩌면 거기 아무도 없는지도 모르지.
기사 그렇다면 인생은 끔찍한 공포입니다. 만사가 허무하고 눈앞에 죽음이 있다면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죽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나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지.
기사 하지만 언젠가 그들도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어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죽음 그날이 오면...
서양인의 사유는 기독교를 떠날 수 없나보다. <제7의 봉인>이라는 제목도 요한계시록에 나와있는 예언에서 따온 것이다. 그들에게 죽음이란 부활 또는 영생으로 이어지는 단계다. 그래서 기독교 장례를 보고 있으면 죽음에 대한 슬픔보다는 천국에 대한 기쁨이 내재되어있다. 하지만 이런 말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려한다면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기사의 모습은 마치 현대인의 모습과도 같다. 그 문제를 감독은 관객에게 던진다. 알고는 있지만 믿어지지 않는 상태로 끝없는 회의감을 경험하는 기사거나 아무런 관심도 없는 미친 동네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리고 그 근본적인 고통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 같다.

영화에서는 이와는 상반된 인물 유형이 하나 나오는데 그는 시대속에서 놀림과 괴롭힘을 당하는 존재중 하나다. 영화의 끝부분에서 그의 가족만 오로지 죽음에서 도망친다. 그는 죽음과 성모 마리아, 천사를 직접 느낀다. 그는 그 존재들에대해 의심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그의 눈으로 죽음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비춰진다. 그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듯하다.
죽음에 대해 증명할 길은 없다. 감독은 그것 전체를 영화를 통해 표현한다. 무엇이 맞는 것인가? 죽음의 대사처럼 그 날이 오면? 기사는 결국 죽었고 그는 답을 알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