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로밤바 - 1915 유가시마
이노우에 야스시 지음, 나지윤 옮김 / 학고재 / 2015년 4월
평점 :



성장소설 하면 데미안이 떠오른다. 나는 솔직히 성장소설을 몇 보지 않아서 이 책은 어떤 느낌일까 정말 궁금했었다. 이 책은 '고사쿠'의 성장일기 같은 느낌이다. 어렸던 '고사쿠'가 세상을 알고, 여자를 알고, 죽음을 알고, 인생을 알아가는 느낌? 1915년 유가시마라는 부제에서 1915년의 유가시마라는 일본 지역은 어땠을까하는 물음이 아닌, 일제 강점기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난 역시 한국사람인가 보다.
그러나 1915년의 유가시마는 순수했다. 아직 마차가 다녔고, 시골 마을에는 자연만이 놀이터였다. 한편 그 시대도 사랑이 사는 시대인 게 맞는 게, 아이들은 공부보다는 뛰어 노는 걸 좋아하고 어느 집안이나 세상사 복잡했고 첫사랑이 있었고 죽음을 알게 되고 어른을 이해 못 하는 아이들과 아이들을 이해 못하는 어른들이 있다.
'백발의 할머니'라는 뜻의 시로밤바가 대체 어디서 날라오는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어둠이 내리면 시로밤바가 나타나는 건지, 시로밤바가 나타나면 어둠이 내리는지도 아리송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궁금해하지 않았다. 땅거미가 지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희뿌연 곤충 무리를 아이들은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밤이 되면 산마루 위로 두둥실 떠오르는 달처럼.
글은 생각보다 서정적이었다. 제목인 '시로밤바'가 무슨 뜻인지 궁금했었는데, 백발의 할머니 라는 뜻이란다. 아마도 고사쿠의 어린 시절 모든 것이었던 할머니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다. 엄마였고, 선생이었고, 보호자였고, 할머니 였던 고사쿠의 할머니. 이 책에서는 어린 아이의 시점에서 본 복잡한 집안사와 순수한 사랑과 죽음에 대한 의문이 있고, 그 아이의 성장이 있다.
소름이 온몸을 휩쓸고 지나갔다. 보조리와 횡포에 의연히 맞서는 인간을 처음으로 목격한 순간이었다. 커다란 돌을 내던지려는 행위는 무모하기 짝이 없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히 악을 처단하고자 했던 과묵한 동급생의 행동은 감탄할 만한 것이었다. 그에 비해 비굴하기 이를 데 없던 자신의 모습은 어떤가. 코사쿠는 모닥불이라도 뒤집어쓴 듯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단상에서 내려오는 나카가와 선생의 모습은 더없이 멋지고 남자다웠다. 그는 분명 사키코를 위해 희생한 것이리라. 사키코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이 학교를 떠난다, 희생이란 이런 것이다. 그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겠지. 고사쿠는 세상에서 오직 자신만이 그를 이해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한편으로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다.
고사쿠는 뼈저리게 실감했다. 사키코는 예전처런 자신을 귀여워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기가 자신에 대한 사키코의 애정을 몽땅 빼앗아가 버렸으니까. 그렇다면 자신도 아기를 귀여워하지 않으리라. 고사쿠는 몇 번이고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었다.
어린 아이의 처음이라는 건 순수하면서도 충격이고 제멋대로이다. 어린 아이는 휙휙바뀌고 자신의 좁은 세계에 확신이 있어 그 세계의 깨짐을 견디기 어려워한다. 고사쿠에게 동경과 질투라는 감정은 어쩌면 유사한 감정일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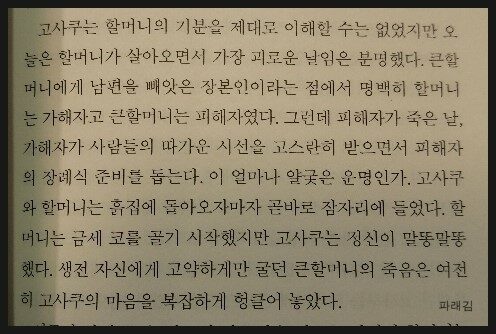
그 순간, 고사쿠는 무어라 설명하기 힘든 묘한 슬픔에 사로잡혔다.……그것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못 견디게 지겹고 무기력해 보이는 그녀를 위해 자신은 아무것도 해 줄 게 없다는 데서 오는 막막한 슬픔이었다. 이런 감정을 느낀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지독하게 말라비틀어진 할머니의 모습은 고사쿠의 마음을 적잖이 헝클어 놓았다. 험악한 바람에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며 서럽게 떠밀려 오는 불안하고 가냘픈 형체를 보며 고사쿠는 마음이 한없이 먹먹해짐을 느꼈다.
고사쿠는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할머니가 참 많이 늙어버렸음을. 마을의 어느 노인보다도.
그로부터 2년이 흘렀다. 그때는 죽음이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사키코는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자신과 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자신은 이제 사키코와 만날 수 없으며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가리라. 이미 까마득히 멀어져 버렸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멀어지겠지. 죽음이란 그런 것이다.
인간이란 죽고 나면 점차 잊히다가 결국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닐까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죽음'과 '세월'이었다. 어린 '고사쿠'는 첫사랑같은 '사키코'의 죽음을 겪고, 큰 할머니의 죽음을 겪고, 가여울 정도로 늙은 '백발의 할머니' 시로밤바가 된 할머니를 보내게 된다.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는 글이 정말 인상 깊었다. 나는 죽음이란 멈춰버린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 사람은 멈춰있고, 살아있는 나는 세월이라는 흐름에 떠밀려가고 있다고.. 같은 느낌은 멀어져 간다는 것 정도일까. 어렸던 그는 죽음을 알게 되고 이젠 여자를 알게 된다.
코사쿠는 생각했다. 여자란 동물은 알면 알수록 종잡을 수 없는 존재라고.
그해 봄은 고사쿠에게 인생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지금껏 무심하게 접했던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다. 말하자면, 고사쿠는 사춘기에 들어선 것이다.
사랑에 빠진다는 건 무엇일까? 첫 사랑은 뭔가 다른 느낌이 난다. 뭐랄까 순수하고 순수하고 순수할 것만 같은 느낌. 고사쿠의 첫 사랑은 현실적인 느낌이다. 절대적이지 않고, 상처가득한? 뭔가 시작될 듯 시작인 것 같지 않은, 뭔가 정제되지 않고 흘러가는 그런 달콤 쌉사레한 느낌이다. 남자의 첫사랑은 판타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별나게 고즈넉한 그날 밤,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도 서글픈 얼굴을 하고 고사쿠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뭐든지 하고 싶은 걸 해라. 인간의 삶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 버리니까."
마지막으로 '인생'이라는 거... 마지막에 갈수록 이 글의 끝은 어떨지 무척 궁금해졌다. 고사쿠는 어떻게 컸을지, 그 끝은 어딜지.... 엔딩이 아닌 끝없는 이야기 일 것 같은, 우리네 이야기에 끝은 어딜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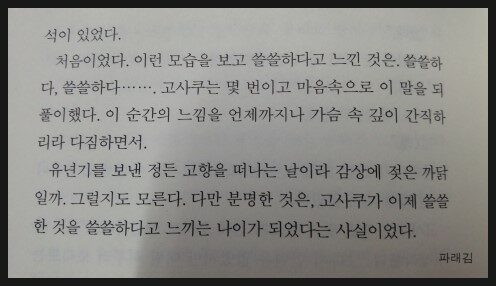
인생은 짧다. 인간의 삶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린다. 이 책은 인생같았다. 어디에도 있을 법하면서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린... 이 책은 연작의 뒷이야기가 있다고 들었다. 이제는 쓸쓸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고사쿠의 앞으로의 성장이 궁금하다. 끝없는 이야기에 발을 들여놓고 말았다. 우리네 인생이 그런 것 같다.
이따금 잠에서 깨면, 조그만 창 너머로 다가가 밝은 햇살이 한 아름 쏟아지는 푸른 논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눈이 시리도록 화창한 봄날이었다.
화창한 봄날은 지나갔지만... 다시올 봄을 그리며 책을 덮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