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든 요일의 기록 - 10년차 카피라이터가 붙잡은 삶의 순간들
김민철 지음 / 북라이프 / 2015년 7월
평점 :

절판


카피라이터의 일상기록이라는 점에서 처음에 흥미가 있었다. 카피라이터는 한 문장으로 많은 것을 말해야 하는 사람인데, 책 문장 하나하나가 특별할 것 같았다.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읽고 듣고 찍고 배우고 쓰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얼마나 읽었으면, 얼마나 잘근잘근 씹으며 읽었으면, 얼마나 스스로를 다독이며, 좌절하며, 희망하며, 다시 좌절하며 읽었으면 책이 이럴까. 모든 장이 손때가 덧입혀져서 부풀어 있었다.
선생님은 도대체 어떤 시간을 산 것일까.……아득했다. 몇 번 뵌 적도 없고, 오래 말해본 적도 없는 선생님이었지만 갑자기 선생님의 모든 시간을 다 돈 것 같은 느낌이었다. 책 한 권이 그랬다. 글자 한 자도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 책은 모든 것을 제 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
나는 엄청난 문장들의 집합을 기대했는데, 책의 내용은 정말 일상의 기록이었다. 그녀가 일상에서 느낀 것들을 기록한 느낌이랄까? 처음엔 문장을 기대했다가 실망했지만, 보면 볼수록 그녀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었다. 그러면서도 일상 가운데 카피를 잡아내는 힘이 그녀에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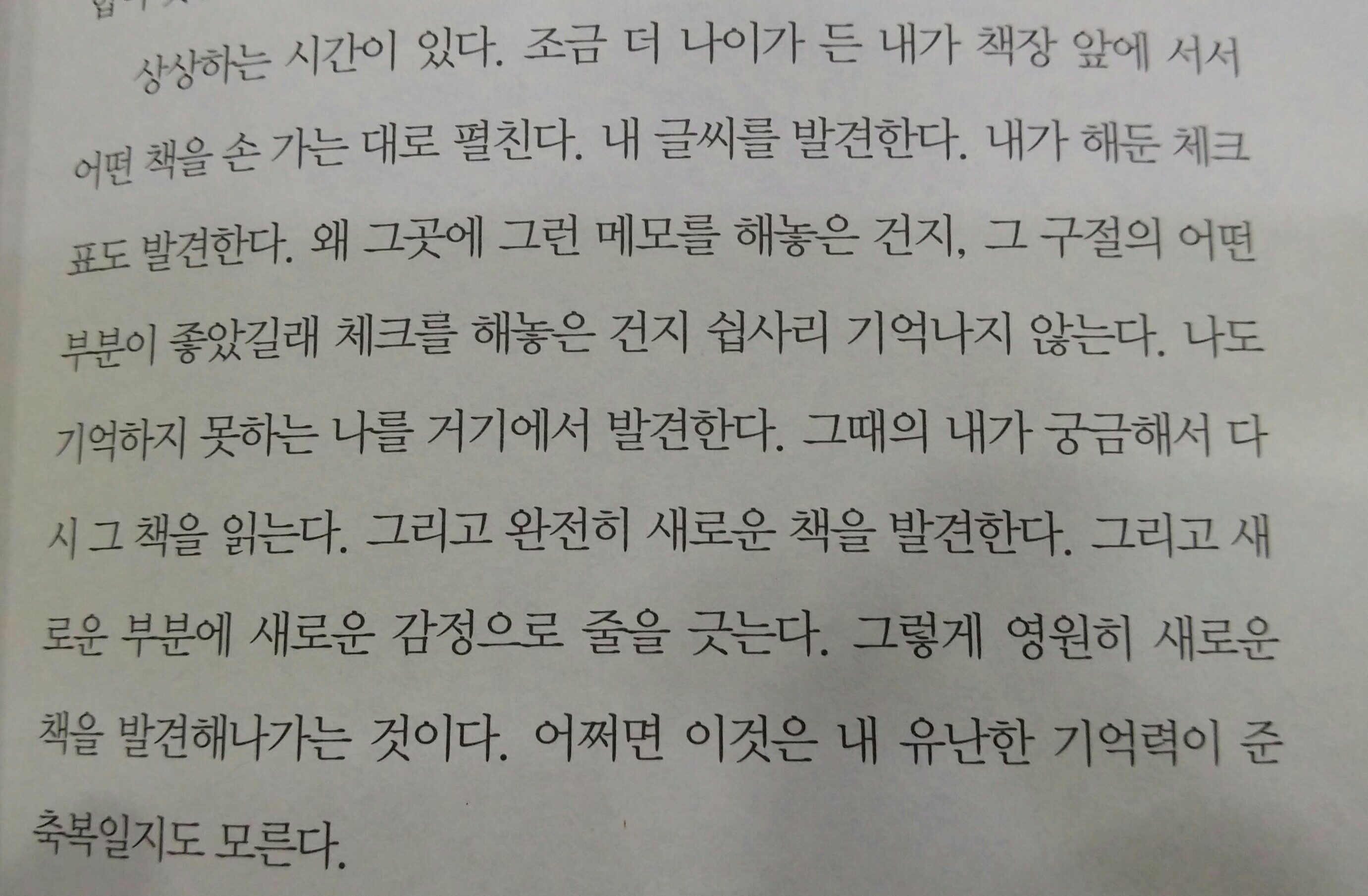
이 책은 정말 부제 그대로의 느낌이었다. 일상의 특별한 순간들. 그냥 지나가는 일상에서 순간순간을 잡아내어 새로운 순간으로 만들고 있었다. 교수님의 서재, 본인의 기억력, 독서, 결혼 생활, 회사생활, 여행 등등 정말 일상이 책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소설을 읽는다. 소설을 읽으며,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막연하게나마 인간을 배운다. 감정을 배운다. 왜 그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왜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신지, 왜 분노하지 않는 것인지, 왜 그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인지, 왜 나와는 다른지, 왜 나와는 다른 선택으로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짚어간다. 내가 이해할 순 없어도, 내가 껴안을 순 없어도, 각자에겐 각자의 삶이 있는 법이다. 소설책을 편다. 거기 다른 사람이 있다. 거기 다른 진실들이 있다. 각자에게 각자의 진실들을 돌려주려면 책을 읽을 수밖에 없다. |
책을 보는 내내 그녀에겐 일상이었던 것들에 매료되는 나를 발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나의 일상은, 지금, 이곳에, 있다. 나란히 앉아서 그 사람과 마시는 맥주에 행복을 느끼고, 그 사람의 눈빛 속에서 다시 나를 찾아, 다시 일상을 꾸려 나갈 힘을 얻어야 한다. 그래야만 한다. 그것이 나의 일상이기 때문이다. 여행은 일상이 될 수 없다. 꿈꾸는 그곳은 이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지금,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그곳에서도, 그때, 불만족스러울 것이다. 때론 책이 우릴 구원한다. 책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책으로 구원받는다. 드물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곤 한다. 귀하게도, 고맙게도. 그러니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다. 일상에 매몰되지 않는 것, 항상 깨어 있는 것,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 부단한 성실성으로 순간순간에 임하는 것, 내일을 기대하지 않는 것, 오직 지금을 살아가는 것,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것, 피할 수 있다면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일상에서 도피하지 않는 것, 일상을 살아나가는 것. 산다는 건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연속이다.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모든 선택에는 '만약'이 남는다. ……가보지 않았기에 알지 못하고, 선택하지 않았기에 미련만 가득한 단어이다. 그 모든 '만약'에 대한 답은 하나뿐이다. '나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라는 답. |
그녀라는 멘토가 토닥이며 "언니는 이랬어..."라고 말해주는 느낌이었다. 특별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일상에서 순간순간 특별한 순간을 찾아내라는 조언. 그녀의 조언이 와닿았다.
읽고, 듣고, 보고, 경험하고, 지금까지 말한 그 모든 행위가 마지막에 '쓰다'에 도착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점일지도 모른다. 나는 읽고서 쓰고, 보고서 쓰고, 듣고서 쓰고, 경험하고서 쓴다. ……쓰고서야 이해한다 방금 흘린 눈물이 무엇이었는지, 방금 느낀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왜 분노했는지, 왜 힘들었는지, 왜 그때 그 사람은 그랬는지, 왜 그때 나는 그랬는지, 쓰고 나서야 희뿌연 사태는 또렷해진다. 그제야 그 모든 것들을 막연하게나마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쓰지 않을래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많은 것들 가운데 기껏해야 몇 개만 쓸 수 있을 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손가락 사이로 후두둑 떨어져나갈 것이다. 나는 내가 쓴 것을 읽고, 그 때의 경험을 음미하고, 손가락 사이로 떨어진 세세한 감정 같은 것들은 잊어버릴 것이다. 죄책감도 없이, 내가 쓴 몇 문장만 경험했다고 믿으며,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믿으며, 그것이 쓴다는 것의 어쩔 수 없는 맹점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라고 쓸 수 있어 진실로 다행이다. |
인생의 기록, 감정의 기록, 눈의 기록, 몸의 기록, 언어의 기록.
다섯 기록들을 통해 그녀는 인생을, 일상을, 순간을 이야기 하고 있었다. 문장 하나 하나가 모두 특별하진 않았지만, 유난히 와닿는 문장이 많았던 건 그녀가 카피라이터여서 일까 아니면, 일상이 소재라서 일까. 책을 다 본 지금, 호기심이 생긴다. 서평의 마지막을 가장 인상 깊었던 한 문장으로 대체하려 한다.
내가 이해할 순 없어도, 내가 껴안을 순 없어도, 각자에겐 각자의 삶이 있는 법이다.
그녀와 나는 많은 공통요소도 없고, 그녀를 이해하거나 껴안을 순 없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