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상에게 어쩌면 스스로에게 - 이 시대 7인의 49가지 이야기
김용택 외 지음 / 황금시간 / 2013년 7월
평점 :

절판

"세상에게 어쩌면 스스로에게"

이 책은 7명이 각기 7개씩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쓴 것이다. 세상에게 썼고, 어쩌면 스스로에게 이 일곱개의 이야기를 썼다.
7인이 각기 7개씩, 총 49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7인은 시인도 있고, 칼럼쓰는 기생충 박사도 있으며, 요리업계에 종사하는 이들도 있다.
세상에게, 어쩌면 스스로에게....하고 싶은 말이 뭘까?

시인 김용택의 이야기. 그는 시인이다. 교사였지만 시인이다.
그는 그의 일상이 시가 된 이야기를,
그리고 그 자신이 시인이 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자유를 이야기한다.

현실의 고민을 잠은 너무나 쉽게 덮어버린다.
눈을 뜬 순간 다시 고민에 빠질지라도... 눈 감은 그 순간만큼은 잠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어야 한다.
보면서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가 부러웠다.
소설의 규칙과 그다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자신'이 되기도 하니까.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기회라는 건 자주 있는 게 아니다.
젊은이들이여. 칼럼리스트가 되어 보고 싶지 않은가? 내가 해봐서 아는데, 굉장히 보람있다.
편지에는 쓰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다. 흰 편지지 앞에선 왠지 솔직해지고픈 충도을 느끼게 마련이다. 내 젊은 시절은 편지의 시대였다.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작가들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다.
다들 책과 글쓰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바'들은 내가 태어날 땐 분명이 없던 것들이다. 삶의 지향을 규정하는 '나의 의식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묻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기 성찰의 물음이다. 이 물음 없이 지금 생각만 고집하며 살아간다며 자치 소중한 삶을 그르칠 위험이 크다.
글을 쓰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그리고 그것이 책이 되고.
이 일련의 과정을 각 작가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경험을 보태어 말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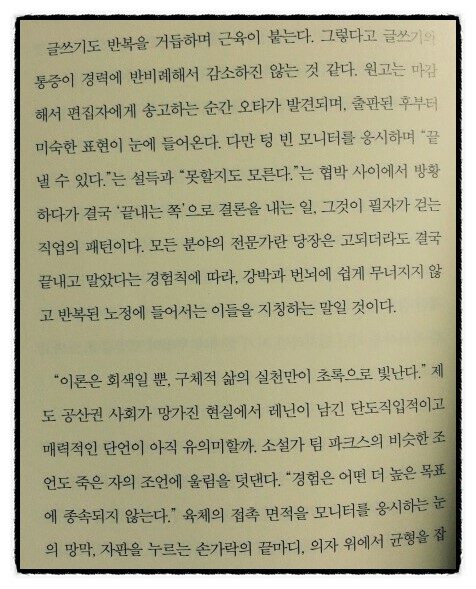
육체의 접촉 면적을 모니터를 응시하는 눈의 망막, 자판을 누르는 손가락의 끝마디, 의자 위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엉덩이 발바닥으로 제한한다면 생의 경험은 매우 축소될 것이다. 생의 지평은 모니터와 언어의 굴레 너머로 확장되어 있으니까.
처음에 난 이 책을 착각 했었다. '세상이 어쩌면 스스로에게'라고.
그러나 보면서 '세상에게 어쩌면 스스로에게'가 제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상이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너만의 스토리를 만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 책을 통해 여러 분야의 글쟁이들과 대화를 나눈 것 같아 글쟁이를 소망하는 아마 글쟁이로서
가슴이 설레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