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언제 들어도 좋은 말 - 이석원 이야기 산문집
이석원 지음 / 그책 / 2015년 9월
평점 : 
구판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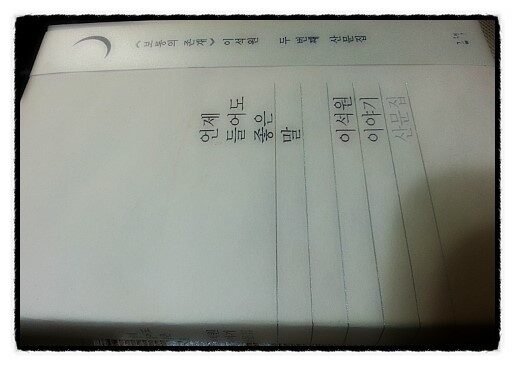
노랑 표지의 '보통의 존재'로 이석원의 글을 읽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동안 한 권의 소설을 쓰고 두 번째 산문집이다.
첫 번째의 강렬한 노랑의 표지만큼이나 책 내용이 강렬해 '이렇게 삶이 아무렇지않게 파란만장 할 수 있구나' 싶었다.
그의 소설이 나왔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읽질 않았다. 궁금했지만 어쩌다 보니 시간이 지나게 되었고 크게 이슈가 되지 못한 걸 보니 그다지 성공한 책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본문 중에도 스스로 책에 대한 평가가 좋질 못했다. )
그러다 다시 그의 산문집을 펴 든 순간, '그래, 이 느낌이었어!' 을 기억해내고 그의 톤 낮은 목소리와 스토리에 취하게 됐다.
첫 번째 이야기가 그의 신변에 관한 이야기라면
두 번째 이야기는 늦게 찾아 온 그의 사랑이야기다.
사십이 넘은 이혼남인 그와 이혼 소송을 진행중인 여자와의 러브 스토리.
정말 사랑한다면 나이와 환경은 중요한게 아니라고 말한다.(어느정도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런 말 할 수 있는 나이가 있다는 걸 나이 먹어 본 사람은 다 안다.
아무것도 모를 때, 오직 사랑만이 밥을 먹여 주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을 수 있을 때.
제도의 벽도 세상의 눈도 다들 그 나이에 대해 호의적이고 '죽어봐야 저승을 알지'하면서도 철없음이 어느 정도 통하는 때.
모두들 그때가 좋았지 고개를 끄덕이지만 다시는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은 때.
그러나,
마흔을 넘기고 상처가 있고 상대도 똑 같은 상처가 있음을 알게 되면 동병상련의 마음이 생겨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싶지만
앓은 기억이 있는 사람은 다시 앓게 되는 걸 두려워 해 마음의 문을 열기가 더 어렵다는 걸 많이 보고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깊어져 가는 사랑으로 앓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사춘기 소년처럼 토라지기도 하고 이성을 잃고 온 몸을 던지기도 하고 자학과 가학의 밀땅도 잊지 않는다.
스스로를 괴롭히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며 자꾸만 깊어지는 관계에 겁을 내면서도 사랑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온 몸을 관통하는 전율의 순간들을 아끼고 사랑한다. 겁쟁이면서도 용감하다.
끝없는 나락이었다가 솟아날 구멍을 찾는 결말까지...너무 솔직해서 설마 싶고 너무 절절해서 가슴 아팠다.
책을 읽는 동안 이게 소설인지 산문인지 헷갈렸다. 허구의 소설이라면 참 잘 읽히는 사랑 이야기구나 싶었겠지만, 그의 생각과 신변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적은 산문집이라고 한 만큼 이렇게 '까발리고'도 온전히 사생활을 지켜갈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만한 용기가 없다면 이런 사랑 이야기를 쓸 생각도 않았겠지.
그에게 [언제 들어도 좋은 말]은 우리가 보통의 연인사이에 주고 받는 듣고 싶은 그런말이 아니다.
긴 침묵의 시간을 어색하지 않게 건널 수있고 아무렇지 않은 일상의 안부처럼 물을 수 있지만 내 대답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 있는 말.
-뭐해요? -
작가의 사랑 이야기가 그 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기로 했다.
뭐해요?
언제 들어도 좋다는 말로 안부를 물으며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는 독자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