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실의 시간들 - 제19회 한겨레문학상 수상작
최지월 지음 / 한겨레출판 / 2014년 7월
평점 : 
구판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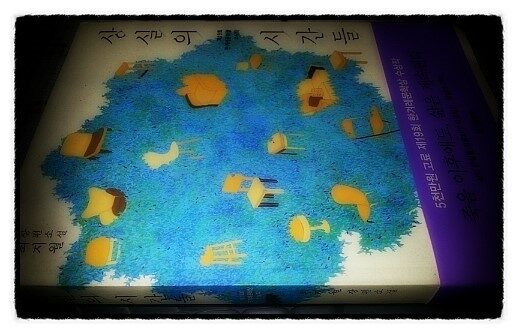
보통은 어떤 한 집단이 형성되면 자연스레 권위라는 게 형성되기 마련이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책이든.
권위가 자연스레 형성되었다손 치더라도 권위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가령, 사자가 초원의 왕으로 군림하며 권위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덩치를 유지하기엔 꿀이나 훔쳐먹고 머루나 다래로 연명하기엔 영양결핍으로 죽기에 딱 맞아'하는 결심으로 산에서 내려 온 곰을 보고만 있거나 물리치지 못한다면 그 권위는 곰에게로 넘어가 버리고 만다.
죽기 살기로 싸우고 내가 금 그어 놓은 영역 안으로 한 발이라도 들여 놨다간 니 가죽이 내 깔개가 되리라는 포효가 있어야 한다.
포효가 위협이 되어야 함은 말할것도 없고!
한겨례문학상은 어쩐지 포효소리가 위협적이지 않고 날로 위축이 되어가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상 중의 하나다.
문학을 전공해서 문학에 조애가 깊고 글을 보는 눈이 날카로워 조목조목 어디가 허하고 어디가 실한지 짚어 내는 깜냥이 있어서 하는 소리는 아니다. 한 달에 많으면 서너 권, 적으면 한두 권 책을 읽는 평범한 독자일 뿐이다.
읽다보면 남들은 다 허접하다고 해도 내 취향인 책이 있어 좋게 평가 하기도 하고, 깊이와 무게를 가진 좋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내 취향이 아니라서 지루했던 책이다 여기기도 한다.
그러므로, 한겨레문학상에 대한 내 생각은 오로지 개인적인 내 생각일 뿐이다.
육식 동물에게 풀을 멕였다든가 초식 동물에게 닭을 잡아 주었더니 배부른 소리 하더라... 쯤 여기면 될게다.
한겨레문학상이 19회 수상작을 낸 거면 문학상을 주기 시작한지 20년이 다됐다는 말이다.
문학상마다 특징이 있고 나름의 색깔이 있다. 우리는 이런 문학 성향을 지향하고 있다를 작품의 계열을 더듬어 보면 알수 있다.
안정의 추구냐 파격의 시도냐로 딱 구분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곳이든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작품상의 권위가 세월이 지날수록 탄탄해지리라는 건 짐작할 수 있다.
내가 한겨레 문학상을 다 읽어 본 건 아니다.(작품 계보를 보니 여섯 편 읽었다.)
읽어 본 작품 중에 기억나는 작품은 최근에 읽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은 작품과 이전에 읽었으되 괜찮게 기억되는 작품 딱 두 편이다. 그런데 그 두 작품 사이에도 간극이 너무 커 같은 문학상을 탔다고 믿기 어렵다. 같은 문학상을 탔다고 해서 쌍둥이 처럼 닮아야 하느냐? 는 아니다. 응모된 작품들 중 가장 좋은 작품이 상을 타는 것이다. 상을 주고 보니 지난번 애랑 색깔이 다르네? 그러면 안되지 비슷한 애를 찾아야지! 하라는 것도 아니다.
어쩌란 말이냐고? 물론, 나도 모른다. 내가 전문가가도 아니고 문학상 심사위원도 아니니 뭐라 얘기할 수 없고 얘기한다고 해도 씨알도 안멕히는 말들 뿐일 게 뻔하다.
하지만, 사자의 울음을 들어야 하는 초원에서 곰의 포효를 듣는 낯선 기류가 날로 진해져 간다는 느낌이 드는 상이 한겨레문학상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문학이 초원에서 들리는 곰의 포효라면 할 말 없다.
[상실의 시간들]은 평범한 사람이 죽은 뒤 남겨진 자들이 감당해야 할 죽음의 뒷치닥거리를 기록한 내용이다.
가족 일원의 상실로 인한 남겨진 가족들이 나눠 가져야하는 일정한 책임과 대처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소설 자체로만 본다면 흡인력도 있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 자료를 찾고 고치고 다듬어 나간 흔적이 역력하다. 이 다음에는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겠구나 기대를 해도 좋을 작가구나 여겨진다.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상실의 시간들]은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려 하다보니 넣지 않아도 좋을 재료들이 섞여 있어 뭐야? 야채 비빔밥에 고등어가 들어가도 되는거야? 싶을 때가 많았다는 것이다.
고등어가 안되는 건 아니지만 고등어 맛이 너무 강해 야채 비빔밥이라는 정체성이 없어졌다는 거다.
어디서 그렇게 고등어 냄새가 많이 났어요. 고등어맛 조미료만 조금 섞었을 뿐인데...한다면 유달리 고등어맛에 민감한 내 미각 탓이다.
그리고, 고등어 맛에 민감한 내 미각으로 한 마디 감히 아뢸 기회를 준다면 청소년을 소재로 한 성장소설을 쓴다면 발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거라는 거다.
'상(賞)이라는 건 더 잘하라는 매'였다는 걸 지나고 보면 알게 된다.
잔칫상 잘 받아먹고 나서면서 한다는 소리가 '물이 제일 맛있네!'로 끝나는 것 같아 뒷통수가 따갑고 다시 초대해선 안되는 손님 명단에 오른 것 같아 벌소릴했군 싶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어디나 있는 법이니 괘념치 말아달라는 줄행랑의 서로 맺는다.
작가의 건필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