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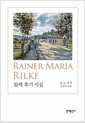
-
릴케 후기 시집 ㅣ 문예 세계 시 선집
라이너 마리아 릴케 지음, 송영택 옮김 / 문예출판사 / 2015년 4월
평점 :




기이한 일입니다. 릴케의 시를 거의 접하지 못했는데도 저는 릴케의 시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으니 말입니다. 왜일까요. 혹시 [말테의 수기]를 시로 착각한 걸까요. 곰곰 생각해보니 윤동주 시에 단서가 있더군요. 저 유명한 <별 헤는 밤> 말입니다. 바로 그 시에 있는 “...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이란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을 좋아한다면서도, 그가 사랑했던 릴케의 시집을, 이제야 저는 집어들게 되었습니다.
[릴케 후기 시집]에는 릴케의 시들이 창작 시기 순으로 묶여 있습니다. 덕분에 릴케의 시세계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짐작하게 되더군요. <공물>이란 시에 “지금도 이름 없이 물처럼 반짝이고 있는 모든 것을 / 너의 이름으로 제단에 부르고 싶다.” 같은 열정적인 어조가 묻어난다면, 이 후에 쓰여진 <노래>라는 시에는 “한 번도 너를 잡아두지 않았기에 / 나는 언제까지나 너를 소유하고 있다.”처럼 좀더 성숙한 시선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랑에 관한 릴케의 성숙한 시선은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라는 시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몇 행을 옮겨보겠습니다.
네가 떠난 서럽고도 싸늘해진 자리에서
나는 너를 찾지 않는다. 네가 거기 없다는 것까지도
너에 의해 따뜻해지고, 더 진실되고,
결핍 이상의 것이 되어 있다.
동경은 너무나 자주 엉성해진다. 나는 왜 나를 내던져야 하는가,
창가의 좌석을 비추는 달빛처럼
어쩌면 너의 영향이 가볍게 나에게 미치고 있는데.
당장 자기 곁에 사랑해마지 않는 연인이 없다고 해도, “찾지 않”으며 달빛이 창가를 비추듯 연인의 영향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걸까요. 저는 이번에 릴케 시집을 읽으며 루 살로메라는 여자에 관해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굉장한 여자더군요. 릴케는 루 살로메를 사랑했는데, 릴케가 원래 이름 ‘르네’를 루 살로메 때문에 ‘라이너’로 바꾸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름만이 아니라 글씨체까지도 말이죠. 루 살로메는 니체에게도 사랑을 받았고, 프로이트와도 깊은 우정을 나누었다고 하니, 지성사에서 ‘뮤즈’라는 명칭이 어울리는 사람을 꼽으라면 반드시 맨 윗줄에 놓여야 할 듯합니다.
확실히 릴케의 시는 후기로 갈수록 깊이가 느껴집니다. 이 시집을 읽기 전 릴케의 시는 낭만적 분위기가 가득하리라고 막연하게 예상했지만, 인생에 대한 통찰도 그 못지않게 듬뿍 담겨있더군요. “시간을 낭비한다는 말은 참 이상한 말이다. / 시간을 붙들어두는 것, 그것이 문제이거늘.”(<시간을 낭비한다는 말은>)라는 시라든지, “더 작고, 가장 날씬한 나는 / 다른 수유를 위하여, 떨어지는 눈물을 위하여 속을 비운다.”(<눈물 항아리>) 같은 시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인생의 비애나 애수는 그다지 묻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시 한편 한편에 생기가 깃들어 있다고 말하는 편이 옳을 듯합니다. 한없이 머물고 싶은 생기라고나 할까요. 그 가운데서도 제가 영원히 머물고 싶은 생기가 깃들어 있는 시를 소개하며 글을 마치려 합니다. 정말이지 최근 몇 년간 만났던 시들 가운데 제게 가장 깊은 울림을 안겨준 시입니다.
<세계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안에>
세계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안에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쏟아져 나와
세계는 지금 밖에 있다. 세계는 붙잡을 수가 없다.
나는 왜 들이마시지 않았던가, 그것을 들어 올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넘치는 얼굴에서 세계를,
냄새를 풍기며 입 가까이에 있던 세계를.
아, 나는 들이마셨다. 끝없이 들이마셨다.
그러나 나에게도 세계가 너무 많아서
들이마시면서도 나 자신이 넘쳤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