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의 시간을 안아주고 싶어서
김상래 외 지음 / 멜라이트 / 2023년 9월
평점 :



MOTIVATION:: 책 한 권, 12개의 색깔

요즘은 이런 류의 책이 좋다는 생각을 한다. 거의 99%의 책은 1인 작가에 의해 쓰인다. 하지만 최근 읽었던 책 중에 자립준비 청년 3인의 사진과 글이 담긴 <EYEs of HOPE: 새로운 세계로부터>, 워킹맘 9인의 이야기를 다룬 <엄마들의 이유 있는 반란>를 읽으면서 책 한 권에서 여러 가지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선했고 읽어나가는데 부담도 덜했다. 작가의 스타일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나가기가 굉장히 버거운 책들도 있는데 이런 책 들은 그러기가 쉽지 않다. 마치 주식으로 비유하면 분산투자와 같은 느낌이다.
<나의 시간을 안아주고 싶어서>라는 책은 1999년생 대학생부터 1970년생 게임회사 대표까지, 변호사, 카페 사장,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전문가, 칼럼니스트 등 다양한 작가들의 글을 엮어서 쓰였다. 사실 사람이 다른데 같은 게 있겠는가, 쌍둥이도 생긴 걸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데 현재의 나이와 하는 일, 경험해온 스토리들이 다 달랐고 특히 시점 또한 유년, 청년, 중년의 모습을 담아놓아서인지 책 한 장 한 장을 궁금증과 기대감을 충분히 즐기며 넘겼던 것 같다.
공통점 또한 있다. 12개의 색깔을 가진 그들의 스토리가 하나같이 진솔하고, 과거를 감추지 않고 보여주었으며 또한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다.
내가 살았던 그 과거의 장면을 우연히 마주칠 때면 나 또한 과거를 생생하게 상상하게 되는 재미 또한 있었다.
KILLING PART:: 할아버지의 간장 계란밥

나는 장손이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댁에 가면 거실에 놓이는 밥상 중에 항상 할아버지, 아버지, 작은아버지와 함께 앉았다. 옆에는 고숙, 고모, 형, 누나들이 앉았다. 사실 너무 어렸기에 어른들과 식사하는 것이 불편한지도 몰랐고 항상 할아버지께서 갈비와 맛있는 육전을 내 앞으로 가져다주셨기에 좋기만 했다. 그때는 그게 장손에 대한 대우이자 책임감임을 전혀 알리 만무했다.
그리고 명절이나 주말에 할아버지 댁에 간다는 연락을 드리면 항상 할머니께서는 '우리 리더왕 좋아하는 감주 해놔야겠네'라며 맛있는 식혜를 해주셨다. 지금도 기억에 나는 게 식혜를 밥통에 만들고, 그것을 시원하게 투명한 2L 페트병에 담으시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어린 나이 달콤한 것이라면 뭐든지 좋아할 때라 매번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식혜를 양껏 먹고 왔다. 특히 가라앉아있는 밥풀을 좋아해서 밥공기에 한가득 담아서 떠먹기도 했다. 그런 모습이 할머니의 눈에는 너무나도 복스러웠나 보다. 그에 반해 나의 어머니께서 하셨던 불평이 지금도 기억에 난다. '어머님은 매번 식혜만 만들고 계신다니까..'
할머니께서는 당뇨로 오래전 돌아가셨고 이젠 더 이상 그 식혜 맛을 느낄 수 없게 되었다. 당뇨가 단것을 많이 먹어서 걸리는 병이라고 친척 형이 말해주었고 나는 나 때문에 할머니가 아프셨다고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난다.
시간이 지나 할머니의 식혜 맛이 그리워 그 맛을 찾아보려 했지만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식혜는 당연히 할머니의 손맛을 느끼기 어려웠고 떡집이나 방앗간에서 판매하는 식혜 또한 여러 군데의 것을 사서 마셔봤지만 그 맛은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도 기억에 난다. 할머니만 만들 수 있었던 그 식혜의 단맛이...
저자 또한 할아버지가 해주신 간장 계란밥의 맛을 잊을 수 없다고 한다. 계란 프라이는 흰자 노른자 모두 바싹 익히고, 간장 두 스푼과 참기름 반 스푼을 넣고, 커다란 밥그릇에 숟가락으로 밥을 꾹꾹 눌러가며 비벼 계란이 잘게 부서져 밥알 사이에 박히는 모양새가 된 그 간장 계란밥. 저자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입원생활을 오래 했고 아버지는 병간호를 하시느라 부모님을 집을 자주 비운 상황에서 할아버지 손에서 커온 저자. 아마 그 간장 계란밥에는 할아버지의 근심과 저자의 눈물맛이 더해진 게 아닌가 싶다.
CONCLUSION:: 마루, 맨션, 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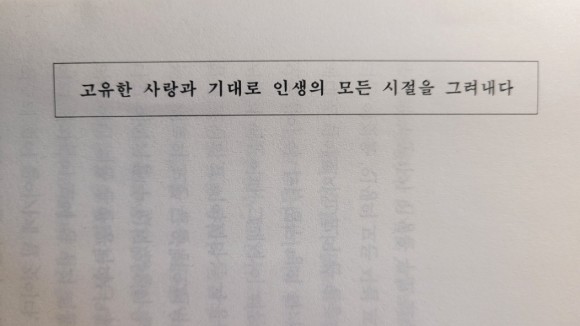
전라남도 화순 춘양에 위치한 외가댁. 거긴 나의 어린 시절 놀이공원과 같았다. 4남 4녀 대가족을 이룬 어머니의 가족, 유독 주말마다 외가댁에 온 식구들이 자주 모였다. 매년 집 마당에서 찍은 가족사진을 보면 정말 장관이다. 10명의 가족에서 20명, 30명, 40명을 넘어가는 사진들. 그렇게 가족 모두가 끈끈하게 살아왔고 외가댁에서 정말 많은 추억들을 만들었다. 위로 형들만 몇 명인지 세어지지도 않는다. 나의 어린 시절 형, 누나, 동생들과 노는 것은 내가 가장 기다리는 순간이었고 함께 집에서 숨바꼭질이라도 할 테면 진짜 누굴 찾았고 누가 남았는지를 새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그리고 여러 방에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잠을 자고 다 같이 식사를 했던 추억. 나의 어린 시절 외가댁은 대궐 느낌이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한참을 안 가보다가 집 정리 문제로 우연히 외가댁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처음 그 집에 들어선 순간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거짓말 하나 안 섞고 나는 집을 1/10로 축소시켜 놓은 줄 알았다. 이건 내 어린 시절 추억 속에 그 대궐이 아니었다. 어떻게 이런 집에서 40명에 가까운 가족이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생활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야외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 1칸,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지도 않았다. 그런 곳에서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어떻게 함께 지냈던 걸까. 지금 살라고 하면 죽어도 못 살 것 같았다. 너무 허무했다. 이 집을 괜히 다시 봤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내 어린 기억 속엔 없는 게 없고 숨바꼭질을 하면 숨을 곳이 너무 많아서 행복했었는데... 내가 커서 이 집이 작아 보인다고 혹자는 말한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어릴 적 감성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저자는 마루가 있는 ㄷ자 마당이 있는 한옥에서 살다가 그렇게 기대하고 원했던 맨션과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고 한다. 깔끔하고 넓고 현대식의 집. 그런 집에서 살다 보니 언제든 넓은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마루가 있는 그 집이 생각난다고 한다. 아파트 창이 아무리 크고, 그곳에서 보이는 하늘이 넓다 해도 ㄷ자 마당이 있는 집만큼 저자를 품어줄 수는 없었다고 한다. 아파트가 주된 주거공간이 된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요즘 귀농을 하며 옛날 전통 한옥집을 리모델링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아지지 않았나 싶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