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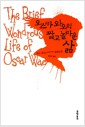
-
오스카 와오의 짧고 놀라운 삶
주노 디아스 지음, 권상미 옮김 / 문학동네 / 2009년 1월
평점 :



‘뚱뚱한 사람을 사귈 수가 있을까?’
오스카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늘 이 생각을 했다. 외모지상주의가 지배하는 우리 사회에서 뚱뚱하다는 건 대머리와 더불어 여자들이 꺼리는 양대산맥이다. 대머리가 유전에 의한, 어쩔 수 없이 그리 된 것이라면, 뚱뚱하다는 건 게으르고 의지가 박약한 결과물이란 생각이 든다. 최근 비만도 유전이고, 웬만한 의지로는 고칠 수 없다는 게 밝혀지긴 했지만, 한번 주입된 선입견은 고쳐지지 않았다. 4년쯤 전 사귀었던 남자는 그런 편견에 기름을 부어줬는데, 그는 제대로 시간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무슨 이벤트 같은 걸 해준 적도 없다. 움직이는 건 무지하게 싫어해 몇 달을 사귀는 동안 같이 숲길은 고사하고 덕수궁 돌담길조차 걸어본 적이 없다. 그저 한자리에 앉아 술만 들이붓는 그 앞에서 난 자주 외로움을 느꼈다. 그와 헤어진 이유가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가 평소 내게 많은 추억거리를 남겨 줬다면, 그리고 그의 배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 않았다면, 몇 달 후 그가 그 일을 벌였을 때 내가 대번에 결별 선언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젊은 시절을 키스 한번 못하고 보낸 오스카를 보니, 그리고 그가 아무 여자에게나 들이대는 처절한 모습을 보니 갑자기 배가 나온 그 남자에게 미안해진다. 그는 내게 자주 말했었다.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해 줘서 고맙다.”고. 그땐 그렇게 말하는 그 남자에게 화를 냈었다. 자기가 어때서 그러냐고, 좀 자신을 가지라고 하면서. 난 솔직하지 못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면 난 좀 부끄러움을 느꼈으니까. 그런 내 마음을 어쩌면 그도 알아차렸는지 모른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다니기보단 음침한 구석자리에 앉아 술만 마셨을지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에게 잘해주지 못한 건 나였다. 사실 나도 그렇게 잘나지 못했는데. 아주 못생긴 건 아니라해도, 적어도 이 소설에 나오는 여자들만큼은 아니잖은가.
먼저 룰라. “청치마 밑으로 쭉 뻗은 다리는 부당하다 싶을만큼 길었다”
다음으로 벨리, 엄청나게 큰 가슴과 엉덩이를 가진 이 여인은 권력의 실세가 이름을 묻자 “벨리”라고 대답한다. “아냐.” 그 실세가 말한다. “네 이름은 예쁜이야.”
재클린은 또 어떤가. “진짜 이유는...재클린의 주체할 수 없는 미모였다...엉덩이-허리-가슴의 삼갑자가 제대로 맞아떨어진 이런 신체 조건은 트루히요(당시 독재자)와의 말썽을 예고했다.”
<오스카 와오의 짧고도 놀라운 삶>은 트루히요라는 독재자가 지배하던 시대의 도미니카를 그린 소설이다. 말도 안되는 부당한 일이 날이면 날마다 일어나던 그때, 100킬로를 넘는 오스카는 이런 정치적인 일들에 초연한 채 오직 여자를 안을 생각만 했다. 그가 되지도 않을 소설을 쓰는 건 만날 여자가 없어서, 여자가 나타날 때까지 버티기 위해서일 뿐이었다. 그가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 싸우지 않았다고 나무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오스카에겐 체제의 잔혹함보다 여자와의 사랑이 훨씬 더 중요했고, 그럴 자유는 인정받아야 하니까. 내가 만일 1940년대 도미니카로 갈 수 있다면, 거기서 오스카를 만난다면, 그에게 정말 잘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 책을 읽고나서 나도 외모보다는 내면에 관심을 기울이는 여자가 되었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