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간의 탄생 -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ㅣ 한림 SA: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16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편집부 엮음, 강윤재 옮김 / 한림출판사 / 2017년 7월
평점 : 
절판

털은 왜 있을까 … 인간의 탄생으로 살펴보는 진화와 미래
[리뷰] 『인간의 탄생(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한림출판사, 2017)
인류의 기원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화석 기록을 선호하는 편이다. 화석 기록에 의하면 가장 오래된 인간 구성원은 오늘날 에티오피아인 곳에서 19만 5,000년 전에 살았음을 말해준다. 『인간의 탄생(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사이언티픽 아메리칸 편집부 저, 강윤재 역, 한림출판사, 2017.)은 이러한 인간 진화의 숨겨진 이야기가 담겨있다. 화석 표본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인류의 비밀을 풀려는 과정을 설명과 인터뷰로 채운 것이 마치 다큐 같기도 하고 소논문 같기도 한 책이다. 인간의 계통에 속하는 모든 생명체 집단인 호미닌(hominin)으로부터 인류의 여정은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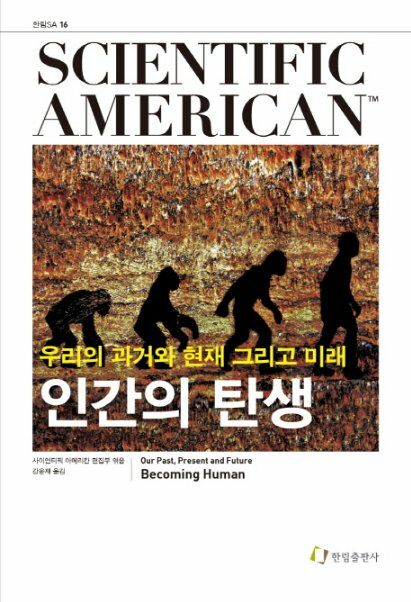
농업 혁명을 야기한 인류 유전자
책은 다양한 이야기가 들어 있지만 인류 진화 책을 자주 본 나로서는 아는 이야기가 많았다. 처음 들은 이야기는 서너 가지 있었는데 그 중 세 가지 정도를 정리하며 생각해보려 한다. 첫째는 초기 인류의 식생활, 둘째는 인류의 피부, 셋째는 인간의 협동과 미래다.
초기 인류의 식생활은 생각보다 다양했다. 암시에 불과하지만 치아에 포함된 탄소 동위원소의 비율을 보면 C3식물(나무와 관목)을 먹었는지, 아니면 C4 식물(풀과 사초)을 먹었는지 구분을 할 수 있다. 또한 인류가 먹은 동물로, 그 동물이 어떤 식물 종을 먹었는지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최초의 아프리카 호미닌들이 C3과 C4가 뒤섞인 음식을 먹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시대 살았던 영장류에 따라 식습관은 조금씩 달랐기에 확실히 ‘그렇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오늘날 인류가 1만여 년 전의 농업 혁명으로 녹말 음식들을 풍부하게 먹은 것도 어쩌면 초기 인류로부터의 영향 때문일 수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녹말 음식 따위 거들떠보지도 않고 농업 혁명 역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으로 인류가 진화하고 문화적 변동을 겪었더라도 특정 먹을거리에 유전적으로도 적응하지 못한다면 역시나 농업 혁명 따위 일어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침에서 나오는 아밀라아제 유전암호를 포함해 여러 소화효소가 이를 도왔다. 도시화를 가져온 조건에 농업화가 톡톡히 역할을 한 것이다.
털을 잃은 인간
재미있는 건 『인간의 탄생』을 읽기 전 나는 ‘왜 동물은 털을 가지는지’ 고민을 하고 있었다. 고민을 연구하려고 메모에 ‘털의 유무’로 짧은 소회를 써 넣기도 했다. 왜 같은 극지역이라도 지방으로 가득한 동물이 있는 반면 털이 가득한 동물이 있을까, 와 같이 말이다. 책에는 포유류인 인간이 털을 가지지 않은 이유가 나온다.
인간은 발가벗은 피부를 지닌 유일한 영장류다. 학자들은 수 세기 동안 이 질문을 심사숙고해왔다. 화석 기록으로는 인간 털의 흔적을 알 수 없다. 모두 분해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유류를 대상으로 보자면 털은 외부와의 마찰, 습기, 햇빛, 기생충과 미생물로부터의 보호, 위장, 구성원 인식, 사회적 과시 등 다양한 기능을 하기에 인간도 이러한 기능 중 몇 가지를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포유류지만 어둠 속에 사는 두더지 같은 경우는 털이 없다. 고래나 상어, 물개 같은 해양 포유동물에게도 털은 없다. 털이 불필요한 환경들에 살기에 그렇다. 그런데 코끼리와 코뿔소, 하마까지도 털이 없는 이유는 뭘까. 큰 동물들은 몸이 과열될 위험에 항상 놓여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털이 없다는 설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설득력이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그럴까. 유난히 오래 뛰어야 하는 인간의 경우 체온 유지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피부를 통해 바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해주는 발가벗은 피부와 촉촉한 땀의 결합으로 과거 우리 조상들이 과열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고 있다. 인간은 더운 날 말과 경쟁하는 마라톤에서도 이길 수 있을 정도다. 그런 유전자들은 피부에 숨겨져 있다. 반면 인간의 겨드랑이와 성기 털은 페로몬 전파용이고, 머리털은 꼭대기 열을 막는 용도이기에 남아 있다고 한다.
협동을 통해 진화하는 인류
위와 같이 책은 추측성 연구 결과가 많기에 답을 바라며 읽을 경우 아쉬운 느낌이 들 수 있다.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따로 나오기는 해도 사진과 도표가 몇 없어 책이 어렵게 보일 수도 있다. 다행히도 내용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예시가 많았다. 인간이 초협력자 집단이라고 설명한 부분의 경우 동물 세계 협력에 대한 다섯 가지 예시가 함께 나왔다. 이로써 인간의 협력을 비교하여 볼 수 있었다.
박쥐들은 필요할 때 다른 박쥐의 도움을 받았다가 도움을 되돌려준다고 한다. 박쥐의 이러한 호혜는 ‘직접적 상호 호혜’다. 꿀벌의 경우 서로 유전자를 공유한다는 이유로 자신들 친척을 위해 희생한다. 이는 ‘친족 선택’이다. 인간의 경우 앞의 두 협력 말고도 다른 협력들로도 사회를 구성한다. 조력을 제공하는 개체들끼리 무리를 형성해 배신자들과의 경쟁을 극복하는 ‘공간 선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 좋은 평판을 쌓고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타인으로부터 선의의 도움을 받으리라 기대하는 ‘간접적 상호 호혜’, 서로를 도우려 하고 공동선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집단 선택’이 그러하다. 이러한 협력의 다섯 기제는 아메바에서 얼룩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생명체에 적용되고 있다.
책의 마지막은 인류의 미래에 대해 나온다. 역시나 고고학적 시선에서 설명되어 있다. 인류의 진화는 눈으로 보이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게 주장이다. 티베트 고원 사람들의 경우 해발 1만 4,000피트에 달하는 광대한 스텝 지역에 사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만성 고산병과 높은 유아 사망률로 살지 못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고작 지금으로부터 3,000년이 채 안 되는 시기에 티베트인들은 적혈구 생산을 조절하는 유전체 기작을 얻어 적응하게 되었다. 자연선택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미래는 자연선택보다는 기술에 따른 진화가 올 가능성이 크다. 인공지능을 선두로 인간의 능력들이 분산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에이즈 문제 등도 인간이 에이즈와 공생하거나 퇴치할 유전자를 가지기 전 이러한 자연선택보다는 기술로 문제를 극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래에 우리 인류의 크기가 더 커질지 아니면 부족한 에너지와 식량으로 작아질지는 모르지만, 우리 인간이 가진 복잡성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갈 것은 확실하다. 알고 보면 인류의 과거를 파헤치는 고고학 그리고 관련된 『인간의 탄생』과 같은 서적들은 정확히는, 인류 미래를 연구하는 학문과도 같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