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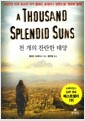
-
천 개의 찬란한 태양
할레드 호세이니 지음, 왕은철 옮김 / 현대문학 / 2007년 11월
평점 :

구판절판

며칠을 앓고 나서 제 엄마에게 간신히 한다는 말이 바로 아빠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10여 년 전 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지, 얼마나 큰 고통을 반복적으로 겪은 후에 나온 말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런데 마리암이 숨을 죽인 채 머릿속으로 초를 세며 아버지와 하루를 더 보내게 해달라고 간절히 신에게 비는 장면에서 비로소 그때 그 녀석의 마음이 어떠했으리란 것을 내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그들 부자의 모습은 이러했다. 유난히 피부가 희고 팔다리가 길쭉한 14살씩이나 된 녀석이 몸집에 큰 아빠 옆에 순한 고라니새끼처럼 찰싹 달라붙어 아빠의 팔에 자신의 팔을 감고서 TV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어 시간 전에 보았을 때 모습 그대로였다.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데 그런 아빠가 어디 도망이라도 갈까봐 집안에서조차 붙잡고 있으려하는 그 어린 아이의 집착에 가까운 몸짓이 어찌나 이상스럽고 강했던 지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아내인 엄마와 한 집에서 살지 않는 아빠는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한데 유명인사인 녀석의 아빠가 무척 바쁘기도 하지만 아빠에게는 돌아가야 할 다른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아빠가 오기론 한 날은 며칠 전부터 설레다가 막상 아빠를 만나 함께 식사하며 학교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녁이 되어 아빠와 헤어질 시간이 다가올수록 아이는 피가 마르는 것이었다. 아빠가 돌아간 후엔 이불을 뒤집어쓰고 엉엉 통곡에 가까운 울음소리가 방 밖으로 새어나갔다고 한다.
그 어떤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아빠와 지낼 수 있는 시간들에 대한 기쁨이 너무나 컷기에 그 짧은 만남 후 닥친 긴 상실의 고통을 달랠 길이 없었다. 얼마나 헤어지는 고통이 컸으면 그렇게 좋아하는 아빠가 차라리 오지 않기를 바랐을까!
잘릴을 기다리는 마리암의 설렘과 기대감 뒤에 남았을 그 상실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그 아이를 통해 나는 안다는 것 이상의 깊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심리학을 공부하기로 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었고 행동으로 표출된 그들의 내면 속 깊은 절규를 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큰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한 사람이더라도 그가 그렇게 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터이고 누구에게도 털어 놓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기에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 길을 선택한 것이었다.
이것이 내가 특별히 문학에 관심을 두고 고전부터 현대소설까지, 타 문화권의 일상을 다룬 이야기들에 미치도록 심취하는 이유이다. 물론 재미있으니까 읽는 것이지만 내게 문학은 많은 유형의 사람들, 때론 복잡하고 그냥 지나치고 싶으리만큼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넓게 열린 문이기 때문이다.
천 개의 찬란한 태양에서 만난 사람들은 나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바라볼 수 없는 건너편에 거하는 사람이란 느낌이 강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헐벗고 자유를 억압당하며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은 북녘 동포들이라고만 확신하며 살아왔는데 그와는 또 다른 차원의 웃음을 잃어버린 표정 없는 사람들을 보았다.
호세이니가 왜 그토록 국가차원의 전쟁과 가정 안에서의 전쟁을 치열하게 묘사했는지, 그리고 그런 혼란과 불확실의 상황에서 그토록 확실하고 분명하게 자신을 태워 주변 모든 것을 밝혀주고 보호해주는 거대한 사랑을 그렸는 지 자신의 민족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에겐 무척 이해하기 어려운 난제 중 난제인 것 같다.
사생아를 뜻하는 페르시아어 하라미를 처음 대했을 땐 내가 아끼던 10년 전 그 아이의 일도 있고 해서 적대감까지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마리암이란 하찮은 사생아의 구차한 일생과 변명으로 일관된 이야기이겠거니 하며 독자 리뷰만 보고 덜컥 선택한 것이 후회막심했다. 그리곤 도대체 무슨 변명을 어떻게 포장해서 늘어놓을 심산인지 오기가 생겨 다음 장으로 읽어 내려간 것도 이 자리에서 털어 놓아야겠다.
나에겐 마리암의 불행이 불운이라고만 여겨졌다. 마리암이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랬다. 그런데 라일라를 살리기 위해 20여 년 이상 같이 산 남편을 삽으로 내리쳤을 때 그 때 비로소 마리암에게 마음이 열린 것 같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논리적인 말주변과는 거리가 먼, 특히 자신을 방어할 만큼 능수능란한 거짓말과는 거리가 먼 그 마리암의 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지능이 높을수록, 많은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인맥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인간들을 그것을 악용해 자신보다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모함하며 횡포를 일삼는 것을 낙으로 여기는 악한 본성을 가진 존재들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줄 것이 없을 것만 같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억압 받으며 부양할 짐짝취급을 받으며 살아온 마리암에게는 자신보다 더 지켜주고 싶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에게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오직 그가 제 몫의 인생을 살아주기만을 바라는 진짜 사랑, 어머니가 자신의 몸에서 나온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말이다!
따분한 표정의 판사 앞에 서서 애써 자신의 정당방위를 주장하지 않는 조용한 마리암의 모습에서 가장 엄숙하고 고결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 죽음을 받아들이며 준비하는 그 자세에서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미워함이 없이 자신의 살인에 대한 죗값을 치르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 정결한 마음에 나는 놀랐고 고개가 숙여졌다. 한 영혼이 남기고 떠난 아름다움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이지 사람이 무엇인지 다시 보게 되었다.
나는 아침마다 구치소 앞을 지나간다. 그 곳을 지나갈 때 면회를 신청하러 신분증을 꺼내드는 사람들도 보기도 하고 구치소 앞마당에 오가는 몇몇 사람들도 보기도 한다. 회색빛 벽돌담이 둘러쳐진 그 곳을 지날 때마다 이 곳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짓고 저기에 갇혔을까 생각하다가 감옥은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사람들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말이 떠오르곤 했었다. 그렇다! 내가 매일 지나치는 구치소 안에도 마리암과 같은 거룩한 희생과 사랑을 담은 천 개의 찬란한 태양이 분명히 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