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22/63 - 2
스티븐 킹 지음, 이은선 옮김 / 황금가지 / 2012년 12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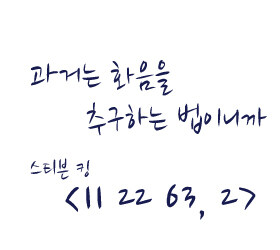
세상의 모든 것은 ‘진짜’와 ‘가짜’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것을 보고 느끼고, 느낀 점을 다시 표현한 것이라 할지라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것은 타고난 재주일 수도 있고 노력에 의해 어떤 경지에 이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설을 ‘진짜’와 ‘가짜’로 구분할 수 있다면 이 소설은 ‘진짜’에 속하는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무언가를 억지로 쥐어 짜낸 듯하여 어설퍼 보이는 글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런 글입니다. 하지만 스티븐 킹의 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단어나 상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쉴 새 없이 굽이치며 끊임없이 쏟아지는데, 그건 억지로 만들어 낸 서술이 아니라 자연스레 흘러나오는 서술입니다. 그래서 그의 글에선 어설픈 느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약간 삐딱한 표정으로 ‘그래서 어쩌란 말인데’라는 미국식 개그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만, 그 느낌이 전혀 과장되거나 작위적이지 않습니다. 보통의 영미권 스릴러 소설과 다르게 말입니다. 하지만 그토록 장황한 표현들도 사실은 스스로가 엄청나게 절제한 후 배출한 느낌의 것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글이라는 표현수단으로 한정하지 않았다면 그는 우리에게 더 장황한 이야기를 주절주절 끊임없이 들려주었을 거라고 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더라… 하며 말입니다.
소설 『11 22 63』은 쉽게 말해 과거와 현재를 오갈 수 있는 시간여행의 토끼굴을 통해 한 남자가 과거로 향하고, 1963년 11월 22일에 암살당할 운명인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구하려 한다는 내용의 SF소설입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해야하는 만큼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소설의 이야기가 더욱 현실감을 갖도록 하려했을 겁니다. 그런 노력의 흔적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조사 내용을 소설에 무리해서 담으려 했기 때문일까, 사실 소설 중반에는 하품이 나올 정도로 지루한 전개가 꽤나 길게 이어집니다. 오스왈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조사하는 장면들이 그러합니다.
반면 현재의 남자와 과거의 여자가 만나 서로 밀고 당기고 사랑을 나누는 장면들은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 때문에 과거로 왔던가 라며 멍한 기분에 휩싸일 정도로, 큰 뜻을 품고 과거로 향한 이유를 깡그리 다 잊게 만들 정도로, 영혼을 쏙 빼놓고도 남을 정도의 사랑…, 사랑…, 그리고 사랑… 오! 시간을 뛰어넘는 사랑이여.
어쩌면 실제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에서 지루함을 느끼게 하고, 어차피 현재로 돌아가면 무의미해질 부분에서 흥미를 느끼도록 한 것이 작가가 의도한 장치였을지 모릅니다. 일종의 최면처럼 말입니다. 1960년대 과거에서의 생활을 약간은 몽환적인 느낌이 들도록 유도하며 천천히 녹아들게 하면서 과거로 온 목적을 잃게 만들고, 중요한 일에 대한 질문에 혼돈을 느끼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사랑보다 중요한 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시간 여행 소설이 보일 수 있는 전형적인 갈등 구조와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말을 보이며 천 이백여 페이지에 걸친 장황한 이야기는 끝납니다. 개인적으로 무척 마음에 드는 결말입니다. 시간 여행을 다룬 소설은 항상 보통 이상의 재미를 선사하는 듯합니다. 이번 소설을 통해 스티븐 킹의 쫀득쫀득한 글로 풍덩 빠져들 토끼굴을 발견한 듯해서 매우 기쁩니다. 그런데 스티븐 킹의 토끼굴을 아무리 휘젓고 다녀도 중심을 다잡고 있을 어떤 일정한 화음이 반복된 소리를 내는 듯해서 정말로 신기합니다. 그의 글은 항상 비슷한 느낌의 화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럽고 익숙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글을 즐겨 읽나 봅니다. 매번 보통 이상의 ‘진짜’소설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의 소설은 반복되기 때문에.
2011년이 그때처럼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제이크 에핑이 그때처럼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텍사스 한복판, 파티로 불을 밝힌 체육관 안에서 테너 색소폰이 흐느껴 울었다. 그 소리가 달콤한 산들바람에 실려 밤공기를 갈랐다.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은밀하게 유혹하는 드럼 연주도 들렸다.
나는 그 순간,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을 했던 것 같다. (33쪽)
과거는 화음을 추구한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역사는 반복된다.’가 되지 않을까? (193쪽)
‘잊자.’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미 엎질러진 물. 돌이킬 수도 없는걸.’
사실 돌이킬 방법이 있긴 했지만. (349쪽)
‘이게 다 한 작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느 게 진짜 목소리이고 어느 게 되돌아온 가짜 목소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완성형에 가까운 메아리로구나.’
모든 게 퍼뜩 선명해지는 순간이 찾아오면 세상에는 별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사실이겠지만, 이 세상은 외침과 메아리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기계 장치에 불과하다. 톱니와 바퀴로 이루어진 척하지만,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신비로운 유리 덮개 밑에서 시간을 알리는 꿈의 시계인 척하지만 그게 아니다. 그 뒤에는 뭐가 있을까? 그 밑에는, 그 주변에는 뭐가 있을까? 혼돈, 폭풍. 망치를 휘두르는 남자들, 칼을 휘두르는 남자들, 총을 쏘는 남자들, 군림할 수 없는 게 있으면 왜곡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으면 비하하는 여자들. 조명 하나 외로이 비추는 무대에서 어둠을 무릅쓰고 춤을 추는 인간들, 그 주변을 에워싼 공포와 상실의 세계. (399쪽)
안녕, 새디.
당신은 나라는 사람을 모르겠지만, 사랑해요, 달링. (720쪽)
그녀는 꿈을 꾸는 사람처럼 내 손을 잡는다. 그녀는 정말로 꿈을 꾸고 있고, 나도 마찬가지다. 달콤한 꿈들이 모두 그렇듯 눈 깜빡할 사이에 끝나겠지만…… 짧기 때문에 달콤한 것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흘러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 (734쪽)
크롱의 혼자놀기 : http://ionsupply.blog.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