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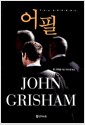
-
어필
존 그리샴 지음, 유소영 옮김 / 문학수첩 / 2008년 12월
평점 :

품절

'製作所'에 오시는 분들 중 대다수가 그렇겠지만 끄적이는 자도 역시 얻는 정보 대부분을 인터넷을 통해서 얻는다. 정보라는 것이 양보다 질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돌멩이 10개 중에 1개의 귀한 보석을 건지는 것과 돌멩이 100개 중에 보석 10개를 건지는 것은 단순 확률만으로 비교했을 때는 같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9개의 보석의 차이가 나게 된다. 아무래도 정보의 근원의 특성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정보의 근원 중에서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더 찾게 되는 것이 아닐까? 비록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쓸모없는 90개의 돌멩이가 생기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남들 눈에는 평범하게 스쳐지나가는 돌멩이가 정작 나에게는 어떤 보석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검은 갯벌 속에 깊숙히 숨겨져 있는 아직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진주가 내 눈 앞에 나타날 수도 있는 법이다. 결국 객관적으로 똑같은 물체라고 해도 그것의 가치는 사람마다 달라지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며, 객관적인 확률도 매순간마다 바뀌기 마련이다.
게다가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자신에게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습득하는 능력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은 내용이니까 '製作所'에 오신 분들도 잘 알겠지만, 그런 능력뿐만 아니라 잡석에 둘러싸여 영롱한 빛이 가려진 보석을 찾아서 가공하는 능력이 더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분명 처음에는 아주 초라하고 별 볼품없는 정보일지라도 여기저기를 수정하고 덧붙여서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로 다시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우연한 기회에 점심식사를 하러 들어간 식당에서 펼쳐든 신문의 맨뒷장에 한뼘도 안 되는 광고에서 존 그리샴의 신간 작품을 발견했다. 그리고 며칠 뒤 인터넷 서점에 주문을 하고 바로 뒷날 손에 넣게되었다. 그리하여 이번 '安經'에서 소개할 작품은 역제가 원제의 발음인 『어필』(『The Appeal』)이다. 책 마지막 장에는 이번 작품이 21번째 작품이라고 하는데 '정통 스릴러'인지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지난 존 그리샴의 작품인 『크리스마스 건너뛰기』를 만난 이후로 꽤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 상당히 반가웠다.
솔직히 이번 작품은 그동안 만났던 존 그리샴의 작품과는 뭔가 색다른 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도 누가 작품 속 주인공인지 모르는 구성때문이 아닌가 싶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소설의 3요소 하면 주제, 구성, 문체이고,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사건, 배경, 인물이지 않는가. 주제나 문체는 작가가 가진 고유의 특성이니까 모든 작품에 당연히 있겠지만, 구성은 작가의 능력이 반영되고 한 작품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등장인물 중에 주인공이 없이 사건을 이끌어나가고 그것을 한편의 이야기로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가? 어쨌든 명불허전이라고 유명한 작가는 이러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일도 현실로 만들었고, 단순히 현실로 만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한편의 멋진 작품으로 완성시킨 것이다.
비록 작품의 배경이 되는 법정과 사법제도가 끄적이는 자와 이 '安經'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흥미나 이해를 하는데 약간의 장벽이 될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해서 전혀 재미를 못 느끼거나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니 아직 작품을 읽지 않은 독자분들을 위해 미리 안심시켜 드리는 바이다. 이 작품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약간의 음모론과 이미 알고 있지만 모르는 정치계의 비릿한 비리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
암을 일으키는 유독물질을 주민들의 식수원에 몰래 버리고서는 모른척하는 기업과 맞서 싸우는 주민들과 그 주민들을 대표해서 모든 것을 다 소비한 부부 변호사. 비록 재판에서 승소하여 엄청난 배상금과 함께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으나, 악덕기업은 대법원에 항소하고 때마침 대법관 선출이 맞물러지면서 검은 세력이 판사 선출에 마수를 뻗히게 되면서 끝까지 누가 승리자가 되는지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가 시작된다.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미국의 사법제도와는 다르기 때문에 소설같은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지극히 적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해서 과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니며,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힘은 또다른 힘을 부르는 특성이 있나보다. 권력이든 재력이든 무력이든 어떠한 힘을 가지게 되면 다른 힘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렇게 새로 가진 힘으로 기존에 가졌던 힘을 지키려고 쓰며, 이는 또다른 힘을 가지고 이 두 힘을 지키고 싶어하니까 말이다. 물론 정정당당하게 얻는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냐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보다 쉬운 길로 가려다보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확실히 정치는 정책과 논의의 타협과 양보의 화합물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르는 또다른 면은 서로의 이득을 챙기려는 욕심과 욕심의 투쟁이 아닌가싶다. 그리고 상대편보다 우위에 점하기위해서 비열한 술수도 서슴없이 쓰고,어디서 흘러나온 것인지도 모르는 검은 돈이 들어가기도 하는 더러운 진흙탕의 싸움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직접 싸우는 자들의 윤리나 도덕성을 문제시 삼아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을 앞세워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배후의 자 또는 세력의 윤리와 도덕성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나마 사람들 눈에 보이는 악취는 치울 수 있지만 보이지 않으면서 계속 악취로 고통을 주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가져오니까 말이다.
비록 끄적이는 자가 정치에 대하여 혐오적인 측면이 다분히 있으나, 중립적이거나 우호적인 사람일지라도 이번 작품을 읽고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한번쯤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않을까 생각한다. 끝으로 이번 작품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문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민주주의여, 고맙다. 시민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라."
- 끄적이는 자, 우비(woobi@hanmail.net) -


이 문서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