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헬프 1
캐서린 스토켓 지음, 정연희 옮김 / 문학동네 / 2011년 5월
평점 :



21세기가 되고도 대략 10년이나 지나 있는 지금까지,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을 얼마나 많을까. 단순히 교과서에서만 보던 그런 기준들 말고 말이다.
공공연하게 그어놓고 있는 선들을 나는, 다른 이들은 한번이라도 체감해본 적이 있는지.
여성과 남성에 그어놓은 선들, 피부색에 그어놓은 선들, 그리고 지위와 빈부에 그어놓은 선들. 우리는 이 선의 존재를 얼마나 체감하고 있었고, 한 번이라도 넘어보려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했던 걸까.

캐스린 스토킷의 장편소설 <헬프>는 가볍지 않은 주제들을 때로는 가벼운 수다로, 때로는 따뜻한 정으로 감싸안는다. 주인공은 세 명의 여성이다. 세 명 중 한 명은 흑인 가정부를 엄마처럼 따랐던, 그러나 지금은 그 흑인 가정부가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는 20대의 백인 여성이다.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백인 가정에서 헬퍼로 일하고 있는 흑인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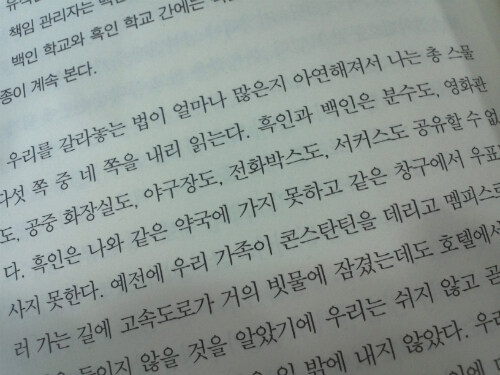
이들의 관계는 아이러니하고도 기묘하다.
60년대,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미시시피 주에서 거의 모든 백인 아이들은 흑인 가정부를 엄마로 여기며 자란다. 흑인 가정부는 정작 본인의 아이들을 돌보지 못한 채, 백인 아이들을 엄마처럼 키우는 것이다. 그렇게 자란 백인 아이들은 어느새 엄마와도 같이 생각했던 흑인 가정부를 기실 노예로 대하게 된다. 어렸을 적 따뜻한 손길에 웃고 울었던 기억은 마치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듯. 그리하여 흑인은 백인과 같은 화장실을 쓸 수 없고, 같은 의자를 쓸 수 없고, 서로 사랑이라는 가장 인간적인 감정조차 가져서는 안되는 존재로 각인된다.
그러나 엄마와도 같던 흑인 가정부를 잊지 못하고 있는 한 백인 여자가 있다. 갓 대학을 졸업한 스키터는 고향에 돌아와보니 가족과도 같던 흑인 가정부가 없어졌다는 걸 안다. 그녀에겐 엄마와도 같던 사람이 없어진 가운데, 가족들은 작가의 꿈을 가진 그녀에게 끊임없이 외모를 가꾸고, 좋은 집안의 남성과 결혼할 것을 종용한다.
그녀의 꿈을 응원해주는 이가 아무도 없는 가운데, 그녀는 흑인 가정부의 눈과 입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책을 기획한다. 흑인과 백인 사이에 단순히 선이 그어져 있고, 그 선을 인식하는 이야기를 넘어, 그 선과 상관 없이 맺어진 많은 우정들과 사랑들에 대해서도 적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책은, 이미 고전이 되어버린, 그러나 너무나 기독교, 백인 남성의 입장에서 써내려간 소설 <앵무새 죽이기>와 뚜렷한 차이점을 갖는다. 생각해보면 어떤 시선이 더 옳은가는 참 간단한 문제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의 이미지는 그대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생각하는 우리나라 교포와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60년대를 배경으로 써내려간 이 책이 여전히 현재, 우리에게도 의미를 갖는 이유다.
스키터는 흑인 가정부들의 입을 통해 나온 이야기들을 직접적으로 써내려갔고, 그 이야기는 차별문제를 한 단계 넘어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순수한 우정이 가능할 수 있는지, 신의가 맺어질 수 있는지를 말한다. 아주 당연하고 가볍지 않은 주제임에도 이야기는 시종일관 따뜻하고 유머러스하다. 어찌되었건 사람 사는 세상인데 어찌 차별만, 울음만, 서러움만 있을까. 작가 캐스린 스토킷은 이 점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 같다. 착한 소설임에도 지루하지 않고, 두 권임에도 길지 않다.
미국에서는 신인 작가의 등단작이 이렇게까지 화제가 된다 하여 ’폭풍’같은 책으로 이 책을 설명한단다. 간만에 아주아주, 선물하고 싶은 책을 만났다. 이런 만남 정말, 흔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