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라와 모라
김선재 지음 / 다산책방 / 2020년 11월
평점 :



뿌연 회색 도시 어떤 도로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소설.
노라...
노가 성에 이름은 돌배나무의 라. 노라.
어릴적 여읜 아버지라는 존재는 눈 감고 있는 사진 달랑 한 장뿐,
기억에 남아 있는 모습은 없고
항상 너만 아니었으면 하는 눈빛을 보내는 엄마와
함께 살지만 함께 아닌 그저 혼자라는 느낌으로 사는 노라.
모라...
가지런한 그물이라는 뜻의 양씨 성의 모라.
어릴적 집을 나가버린 엄마
다른 친척의 손에 맡기고 일을 하러 다니는 투박한 아빠와
함께 살지 못하는 모라.

전체적인 소설의 분위기는...
뿌연 회색,
선명하지 않고 뭔가 좀 안개낀 느낌의 회색이
소설을 읽는 내내 떠 올랐다.
그만큼 이게 무슨 내용이지?
아,,, 이게 무얼 말하고 싶은거지?
나는 왜 노라에게도 모라에게도 공감을 하지 못하는걸까?
보통의 경우 소설 속 인물 속에 홈뻑 빠져
언제는 주인공 처럼 언제는 주인공 친구처럼
그 인물이 되어 소설속에서 나는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는 하는데
이번 소설은 처음 부터 끝가지
꽤나 차분했고, 그 누구도 되지 못했고,
그저 옆에서 지켜보는 느낌으로 읽었다.
철저하게 그저 제 3자의 시선에서 읽어진
노라와 모라.
아마도 노라도 모라도 두 인물과
소설에서 시종일관 보여지는
차분함이 나를 그냥 잔잔하게
만들어서 그랬던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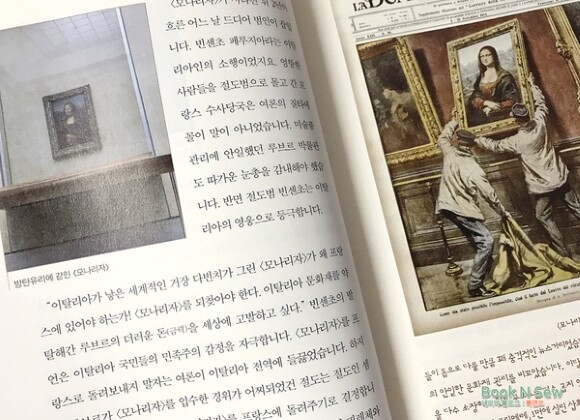
노라의 엄마와
모라의 아빠.
재혼으로 7년간 함께 살고,
다시 남남이 된 부모들 덕분에
20년을 헤어져 연락도 없이 살던
노라와 모라.
어느날 노라에게 걸려 온 한 통의 전화.
그렇게 노라는 모라를 만나러 가고,
모라는 그런 노라를 아무렇지 않게
밥 부터 먹자며 식당으로 이끈다.
분명, 모라 아빠의 부음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온 노라였는데,,,
소설은
노라의 시선과 모라의 시선이 차례로
이야기를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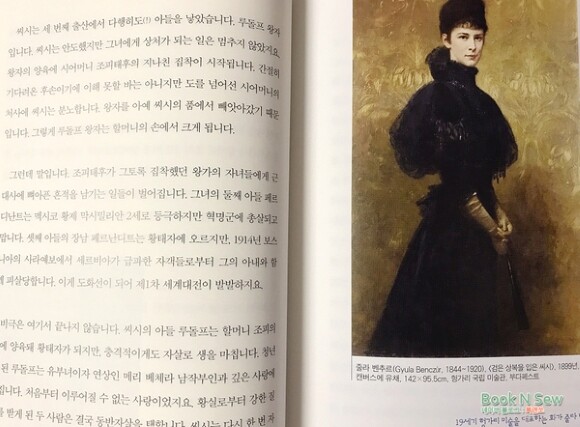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
그저 그냥 일어나는 것.
산다는 것도 그저 혼자 일 뿐이고
저마다 그냥 산다는 것 일뿐이라는
소설 속 태도 때문일까?
홀로 였다가 함께 일 수 있겠지만
산다는 건 여전히 혼자라는 것이라는
조용한 읊조림 덕분에
읽는 동안 좀 추욱 쳐졌던 소설.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소설은 힘이 빠져서 ㅠㅠ)
잔잔한 분위기의 소설을 좋아하는 분에게는
참 좋을 것 같은 소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