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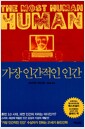
-
가장 인간적인 인간
브라이언 크리스찬 지음, 최호영 옮김 / 책읽는수요일 / 2012년 6월
평점 :

절판

‘인간 대 기계’의 싸움은 이미 영화를 통해 수없이 보아왔다. 인간의 명령만을 따라야 할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명령을 거역하고 오히려 인간 세계를 파괴하는 적으로 돌변하는 모습은 끔찍하기 그지없다. 더 이상 인간 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인간보다 더 똑똑한 기계와의 전쟁이며, 인간은 기계의 탁월한 기능 앞에서 무기력하기만 하다. 영웅 덕분에 마지막엔 인간 승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될까? 생명도 없는 기계가 생태계를 지배하기까지 하는 현상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런 영화들을 보다 보면 인공지능의 발전상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컴퓨터가 단순히 계산기계에 머물지 않고 인간 특유의 것이라 여겨진 이성의 영역을 다루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인간 존재에 대한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철학을 무너뜨리기까지 한다. 또한 인공지능의 개발이 의식적 분석적 사고를 처리하는 똑똑한 기계를 목표로 한다는 사실은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려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기계와 인간의 차이, 가장 인간적인 인간의 조건을 탐구한 저자는 그런 발전상을 전혀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인간다운 인간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로 여긴다.
저자는 ‘가장 인간적인 인간’과 ‘가장 인간적인 컴퓨터’를 가리는 ‘뢰브너 상’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이후 인간적인 인간의 조건이란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 대회에는 ‘인간 연합군’에 속하는 네 명의 인간과 네 대의 컴퓨터(프로그래머들이 개발한 프로그램)가 참가하여 심사위원을 상대로 5분 동안 대화를 나눈다. 5분이 지나면 심사위원은 보이지 않는 진짜 인간과 인간 행세를 하는 프로그램 사이에서 누가 진짜 인간인지를 고민하고 맞추어야 한다. 대회가 생긴 이래 컴퓨터를 진짜 인간으로 선택한 경우가 몇 번 있었을 정도로 누가 진짜 인간인지를 맞추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한다. 그만큼 기술이 발달했는가, 또 그만큼 우리가 인간다운 조건을 잃어버렸는가에 새삼 놀라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저자는 이런 뢰브너 상의 역사를 바탕으로 인지과학, 컴퓨터공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기계를 닮아가는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인간이 잃어버린 가장 인간적인 조건은 무엇인지 추적해나간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이 유명한 한 마디 말로 인해 인간은 다른 모든 동물과 구별되는 일종의 ‘고상함’을 지니게 되었다. 하지만 그 후로 동물적인 감각과 감정을 잃어버리게 되어 신체와 정신은 융합되지 못하고 따로 분리된 채 살아가게 되었으며, 정신만이 고결한 인간의 특성이라 여겨져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를 계급으로 나누게 되었다. 하지만 이럴수록 인간은 기계를 닮아갈 뿐이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을 닮은 기계가 만들어지기 했지만 인간이 기계를 닮아가는 속도가 빨라져 인간과 기계의 구분이 더욱 모호해진 것이다. 이는 기계의 발전상만 탓할 수는 없는 문제다. 과학 기술과 우리의 삶을 적대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기계의 모습을 보고 인간 존재의 근본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인간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비(非)익명적인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한다. 이름이 없는 익명적인 존재들로 넘쳐나는 세상에서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기만 한 똑똑한 컴퓨터가 인간의 자리를 차지해 나가는 현상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럴수록 인간은 인간 고유의 이름, 즉 자신만의 개성을 찾아내야 하는 법이다. ‘가장 인간적인 인간’으로 뽑힌 저자처럼, 그리고 이 독특하고 명쾌한 매력적인 책처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