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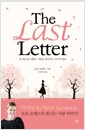
-
더 라스트 레터
조조 모예스 지음, 오정아 옮김 / 살림 / 2016년 7월
평점 : 


손편지를 쓴 적이 언제였던가 곰곰이 생각해본다. 글씨 쓰는 것에 그다지 자신이 없기 때문에, 편지 쓰는 것을 기피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어쩌다 가끔,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해 느낌을 적을 때가 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상들을 빠르게 써 내려가다 보니 당연히 글씨체는 엉망이 되고, 나중에 다시 읽어보게 될 때는 망연한 마음이 든다. 에헤. 이래서 내가 손글씨를 기피하지, 하는 것도 빼놓지 않으면서. 하지만 중고등학교 시절, 손편지를 통해 친구들과 진심을 나누었던 교류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떠오르는 미소와 함께 그때 그 감정들이 다시금 떠오르곤 한다. 이다지도 열중했었구나, 하면서 말이다. 이번에 읽게 된 조조 모예스 신간 <더 라스트 레터>는 손편지가 갖는 엄청난 위력이 담긴 작품으로 1960년과 2003년, 두 인물을 보여주며 늘 그랬듯 사랑에 대해 또다시 질문을 던지고 있다.
1960년.
제니퍼 스털링은 교통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은 채로 병원에서 깨어난다.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단어들에게서 낯섬을 느끼며 서서히 하나씩 깨우쳐가는 중이다. 퇴원을 하고, 자신에게 광산업으로 성공한 사업가 남편이 있다는 것이, 그 남편이 타인처럼 느껴진다는 것이, 이 괴리감 속에서 허우적 거린다. 그러다 한 통, 두 통 발견하게 된 편지들을 읽으며 자신이 잃었던 기억의 구멍의 실체가 다른 누군가와 나눴던 진실한 사랑이었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주위 사람들을 만나가며 탐구 중이다. 그러나 그 남자가 죽었다고 듣게 되고 독선적인 남편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의문을 품어갈 때쯤, 한 파티 장소에서 죽었다던 앤서니를 만나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남편의 꽃이 아닌, 인격적인 객체로서 살아가는 길을 택하지만 앤서니와는 어긋나게 된다.
2003년.
신문사에서 특집 담당 기자로 일하고 있는 엘리 하워스는 신문사 이전으로 정리하는 중, 자료실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하게 된다. 40년 전 앤서니가 제니퍼 스털링에게 보낸 진실한 사랑의 편지였다. 그녀 역시도 현재, 스릴러 작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유부남 존과 불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도서관 로리의 도움을 받게 되고 이 편지를 가지고 칼럼을 쓰려고 주인을 수소문한다. 40년간 한 통도 받지도 못했음에도, 같은 사서함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은 누구일까. 그들에게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일까.
**
조조 모예스 작품들을 많이 읽진 않았지만, 소위 흔한 로맨스 소설에서 말하는 사랑해서 행복했다,라는 공식은 통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그리고 이건 무게들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사랑한다. 그리고 더해진 아픔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사랑한다. 그리고 주어진 가시밭길을 헤칠 수 있겠는가. 사랑한다, 사랑하니까, 사랑만을 바라보던 사람에게 과연 어디까지 사랑을 위해 희생할 수 있겠는가, 사랑을 믿고 어디까지 걸어갈 수 있겠는가 끊임없이 질문하며 독자들의 대답을 기다린다.
이번 작품 역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소재 자체는 대단히 민감한 '불륜'이다. 이것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 것인지는 도덕적 잣대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매력적인 이유는 1960년대 실상을 반영한 수동적인 여인상을 가진 제니퍼가, 사랑을 제외한 채 세상 잣대로 남편을 고르고 파티와 옷과 보석만을 가치로 살아가던 그녀가, 앤서니를 통해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통해 능동적인 여성상으로 변모해 가는 모습들 때문일 것이다. 그의 사랑과 진심이 가득 담긴 '편지'를 통해, 그의 진심을 절절히 깨달으면서 말이다. 말보다 글이 가지는 위력이란 이토록 거대하기에 나 또한 앤서니의 편지를 읽을 때 가슴이 설레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또한 이 진실된 편지를 통해 존과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사랑을 하고 있는 엘리를, 진실한 사랑을 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상처를 주는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만든다. 엘리 역시 존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닌, 좀 더 진일보하고 자신을 위한 사랑을 위해 한걸음 나아갈 수 있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며, 앞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선언을,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예전 두 작품 <허니문 인 파리>와 <당신이 남겨 두고 간 소녀>에서 그림이라는 매개체로 다른 시대에 사는 두 인물의 사랑을 이야기했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손편지를 통해 사랑을 이야기한다. 소재 자체가 불륜이라는 민감성 때문에 완벽히 받아들이기엔 미진한 면이 있지만 인물들의 섬세한 심리묘사들이 퍽 만족스럽다. 오랜만에 고전을 읽는 듯한 기분으로 감정의 진폭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제는 흔하디 흔한 인터넷이 기반 위에 전자우편이라는, SNS라는 통신수단에 뒤로 밀려나버린 손편지. 어쩌면 구식이라 느껴질법하지만 여전히 정성 가득하고, 로맨틱하고, 진심을 어루만질 수 있기에 오래된 흑백사진처럼 그 잔상이 오래도록 남을 수 있었던 <더 라스트 레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