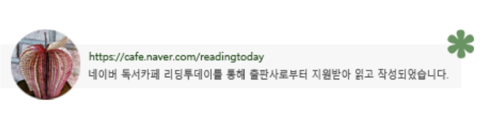-

-
팬이 ㅣ 특서 청소년문학 26
김영리 지음 / 특별한서재 / 2022년 3월
평점 :




『팬이』를 읽으며 나는 소재와 연출에 감탄했다. 앞에서 읽을 땐 이해가 되지 않았던 장면, 의심되었던 연출이 마지막 챕터에 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다. 물론 스토리는 기본으로 감동 요소에 올라 있다. 하지만 나는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소재와 연출에 담긴 뜻에 더 집중하면서 읽었던 것 같다. 정말로, 처음이다.
▶ 영화 <월-E>와 <아무도 몰랐다>
『팬이』를 읽으면서 등장인물들이 실제 있는 인물처럼 느껴졌던 것은 아마도 이 영화 소재 때문일 것이다. 현실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영화를 허구 속 그들 또한 알고 있다는 것. 그로 인해 절로 유대감이 쌓이고, 내적 친밀감이 쌓인 느낌이 들었다. 영화의 주제를 이용하여 인물들이 무엇을 원했고, 또 어떠한 문제(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도 그랬다. (물론 여기서 <아무도 몰랐다>의 경우 실제 있는 영화인지는 잘 모른다. 찾아보니 <아무도 모른다>는 영화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가 아동 성폭행을 다룬 영화이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영화가 떠오른다.) 즉, 영화를 이용하여 현실과 허구의 벽을 허물고, 나아가 인물들이 가진 고민을 한층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를 활용한 것이 좋았단 생각이 들었다.
▶ ‘나는 살아있다’ 페스티벌
『팬이』에는 모든 예술가의 꿈의 무대인 ‘나는 살아있다’ 페스티벌이 있다. 무명 위술의 꿈 또한 그랬고, 그렇기에 중요 공간이 되기도 했다. 나는 소설을 읽으면서 왜 페스티벌의 이름을 ‘나는 살아있다’라고 지은 것일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다. 예술가들은 예술을 함으로써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껴서? 아니면 예술을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왜 이름이 ‘나는 살아있다’인지 페스티벌의 유래 같은 건 작중에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에 더욱 많은 상상력을 펼칠 수 있었다.
또 한편으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위술의 행위 예술에 대해 한 번 되뇌게 되었다. 고통은 사람들만의 고유 영역이다. 그렇기에 팬이도 예술가가 되고 싶어 고통을 느끼고 싶어한다. 위술은 고통을 주는 행위 예술로 입소문을 타게 되고 페스티벌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즉, 고통으로 ‘나는 살아있다’라고 외치는 것이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꼭 고통으로만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지, 살아 있단 걸 느끼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을 수 있었다.
▶ 그녀와 남자, 호칭
호칭에 관한 건 내가 이 소설을 통틀어 가장 반전 있는 연출로 보았고, 그러므로 이렇게 완독 서평을 쓰고 싶다 마음먹은 계기가 된다. 소설 처음부터 워리의 엄마는 ‘그녀’로 지칭되고 아빠는 ‘남자’ 혹은 ‘그’로 지칭되어 나온다. 때문에 나는 읽으면서 왜 워리의 엄마를 단순히 엄마라고 하지 않고 ‘그녀’라고 짓는 걸까 의아했다. ‘그녀’라는 것은 너무 두리뭉실하기 때문이다. 로봇심리학자 수잔을 지칭할 수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 소설을 읽으면서 인물을 헷갈리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니까. 하지만 작가는 아무래도 이를 노린 것 같았다.
워리의 엄마를 처음부터 ‘그녀’로 함으로써 그녀가 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했다. 제 아들을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찾아가 법정에 설 만큼의 일을 벌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고, 보육원으로 가 사회봉사를 채워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고, 한 아이를 너무도 사랑하는 엄마가 될 수도 있었으며, 로봇이 되고 싶어 하는 아이를 위해 로봇심리학자 수젼이 될 수도 있었다. 소설을 다 읽고 나서야 나는 그것을 깨달아버린 것이다. 내가 얼마나 한 인물을 단편적으로만 보려고 했는지, 그리고 사람들에겐 얼마나 다양한 면모가 있는지. 워리가 왜 워리 라는 이름을 갖고 새로운 무언가가 되고 싶어했는지 말이다.
호칭이란 사람을 명명해준다. 하지만 때론 그 이름 안에 나를 가두게 만든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도 대중들에게 내보이는 이미지 때문에 쉽게 그것을 할 수 없다. 그렇기에 요즘 아이돌이 일명 ‘부캐’를 만들고 그러는 것이 아닐까. SNS에서 사람들이 여러 아이디를 만드는 이유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팬이』 또한 마찬가지였다. 로봇이란 틀에서 벗어나고 싶어 ‘팬이’가 되길 원했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될까 봐 ‘워리’가 되길 원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 그리고 당신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