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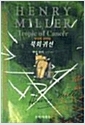
-
북회귀선
헨리 밀러 지음, 김진욱 옮김 / 문학세계사 / 1991년 6월
평점 :

절판

대단하다! 그는 거의 성자와도 같다. 별로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작품과 완전 일치하는 인간형이라면. 헨리밀러의 소설을 읽노라면 소설을 썼구나 하는 생각보다는 언제 어디서나 길거리에서, 방에서, 술집에서...등에서 즉시 일기를 써내려간 듯한 느낌이다. 작위적인 데가 없고 고친 것 같지도 않은, 흐르는 듯이, 몽환적으로, 즉흥적 느낌이 강하다. 시라고 하기엔 너무나 장황하고 일기라고 하기엔 너무도 고급스럽고 외설고백이기엔 너무도 철학적이고 사색적이다. 예술가이기엔 너무도 허욕과 욕심이 없다. 그러면서도 예술가인 것은 나무라데없는 문체를 구사한다는 점이다. 즉흥적이기에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는, 하나의 운명같은, 우연같은 문체!
그는 변덕스럽고 동물적이면서-이는 곧 본능에 완벽히 충실한 점이기도 함- 상반되게도 인간으로서의 위대한 징표인 하늘이 선사한 재능, 신을 닮은, 그 '객관적 시선, 감수성, 통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불교적으로 말하자면 禪의 실천과도 흡사한. 미친 듯 이 본능에 경험을 내맡기고 헛된 욕심- 명예, 물욕, 고상- 및 일체의 안정 따위를 바라는 욕망이 없었다. 없었다기보다는 차라리 구애받지 않았다. 즉 여건이 허락하면 그는 잔인하게, 터질 듯이 향락과 쾌락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운명이 허락하면 가장 더러운 가난, 퇴폐에도 전락할 베짱이 있었다. 때로 엄습하는 우울이 있었지만 그것에 심각해하지 않았다. 평생을 통해 여인에 대한 애정이 있었지만 집착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고독에 집착하지도 않았다.
구질구질한 습성인, 예술가들의 배부른, 푸념, 응석, 하나의 거창한 생의 목표로 이 작품을 쓴 것도 또 아닌 듯 하다. 차라리 거부할 수 없는 없는 어떤 끼, 감수성과 깨달음의 자연스런 본능으로 써내려갔다고 할까.
그의 주장대로 '작품과 작가가 완전한 동일성'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는 신념은 나의 신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일성을 갖는 작가라해도 존경을 표시할 수는 없다. 하나의 인간 동물같은 정신 뿐이었더라면, 또 하나의 사색 뿐인 몽상가였더라면..... 내가 헨리밀러를 존경하는 것은 천성적인 동물성과 천성적인 신적 감수성, 냉철, 자유, 태연함 등에 따른 그의 용기이다. 누가 이렇게 솔직해서, 동물적이어서 아름다울 수 있을까. 다만 그가 외설적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외설은 차라리 동물적이지 않다. 너무도 인위적이고 허위적이어서 표면적이어서 겉으로 호리는 듯, 헛된 상상력의 사기성이 있어서 구역질이 나는 것이다.
그는 허위가 없는 인간 동물 자체였으며 또한 하나의 인간으로서 시인이었으며 또 신의 경지까지 맛본 드문 존재자였다. 몇 천년동안 지켜온 이야기 식의 소설, 허구와 형식을 대충 얼버무려 표현한 쓸어 버릴 만큼 많은 문학을 남김없이 무시해 버리고 오직 자기만의 방식으로 줄줄 써내려간 글, 마치 가장 완숙한 경지의 화가가 가장 초월하 경지의 솜씨로 하나의 어린애 낙서같은, 우스꽝스런, 엉성한 그림을 남긴 것처럼. 그것은 교훈 따위를 전달하지 않으려했기에 오히려 커다란 교훈을 떠오르게 한다.
도대체 열렬히 본능을 지키며 생을 소모하는 것 이외에 이 지상에서 연약한, 한계적 생명체가 할 수 있는 미덕이란게 뭐 특별한 것일까. 안정? 고상? ...... 삶은 그저 제식대로 살아 버리면 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