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 부러뜨리는 남자를 위한 협주곡
이사카 고타로 지음, 김선영 옮김 / 현대문학 / 2015년 6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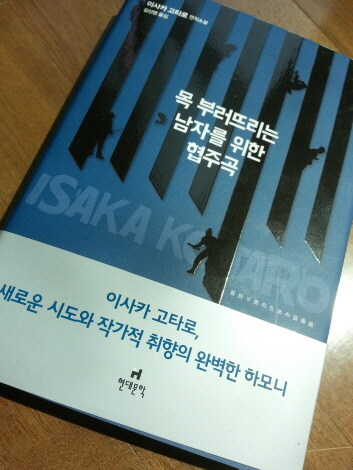
[목 부러뜨리는 남자를 위한 협주곡]이 내게는 이사카 고타로의 첫 책이다. 오래 전부터 이사카 고타로라는 작가에 대해 이런저런 자리에서 들어왔으면서도, 번역된 그의 작품이 한 두 권이 아니라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만약 이사카 고타로의 작품을 읽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책은 최적의 이사카 입문서가 되리라. 마치 마술이라도 보고 있는 기분이다.”라는 추천사를 읽고는 이거다 싶어서 주문해버렸다. 물론 여기에 [목 부러뜨리는 남자를 위한 협주곡]이라는 무시무시하면서도 우아해 보이는 제목도 한 몫 하긴 했다.
그나저나 목 부러뜨리는 남자라니! 세상에 이런 캐릭터를 어디서 구경이나 해봤나 싶다. <목 부러뜨리는 남자의 주변>에서 처음 등장하는 오야부라는 남자는 결코 좋은 사람이라고는 말 할 수 없지만, 곰곰 살펴보면 그의 행동은 누군가의 짐을 덜어주게 된다. 현금자동지급기 앞에서 쩔쩔 매는 아이엄마나 할머니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기와 닮은 남자를 대신해 빚쟁이들을 처단해주기도 하며, 괴롭힘 당하는 소년으로 하여금 버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한다. 목 부러뜨리는 남자 오야부는 기묘한 방식으로 곤경에 빠진 이들이 삶에서 제 나름의 실마리를 발견하도록 돕는다. 오야부 같은 무시무시한 청부살인업자가 이 답답한 세상에서 어떤 이의 숨통을 틔워준다는 것이 내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나의 배>는 이 소설집에서 나를 특히 미소 짓게 해준 소설이다. 일흔을 바라보는 와카바야시 에미 할머니의 이야기다. 에미 할머니는 탐정 구로사와에게 50년 전 긴자에서 만났던 추억 속 남자를 조사해 달라고 의뢰한다. 비록 추억 속 남자와 나눈 기간은 며칠에 지나지 않았지만, 평생을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살아온 에미 할머니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던 것. 에미 할머니는 더불어 구로사와에게, 60년 전 일곱 살 때 유원지에서 미아가 되어 만났던 소년과의 첫사랑도 들려준다. 에미 할머니의 남편이 프러포즈할 때 했던, “나의 배에 함께 타 주지 않겠느냐”는 말. 그러니까 에미 할머니는 추억 속 그 남자의 배를 탔으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이따금 떠올렸던 것이다.
작가는 에미 할머니의 50년 전 풋풋했던 시절을 되돌려낸다. 어처구니없게도 폭력의 현장에서 얻어맞던 남자와 데이트를 하게 된 에미. 이 장면의 묘사는 사랑스럽고 환하다. 두 남녀가 수줍게 주고받는 대화의 현장에 들어가 직접 그 이야기를 훔쳐 듣고 싶을 정도다. 에미 할머니의 옛사랑의 흔적을 더듬어 찾아간 구로사와는, 솜씨 좋은 탐정답게 추억의 그 남자를 찾아낸다. 그 남자의 사진을 기대하는 에미 할머니 앞에서 구로사와는 카메라로 에미 할머니의 남편이 누워있는 침대를 찍는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여주며 말한다. “당신이 찾던 남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60년 전 에미 할머니의 첫사랑까지도 구로사와는 부가서비스라며 일러준다. 마찬가지로 그 소년도 에미 할머니의 남편이었던 것이다.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있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인생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미 할머니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이 내게 말할 수 없는 울림을 주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장 킥킥 거리며 읽었던 <미팅 이야기>가 있다. 고리타분한 미팅이란 소재를 도대체 작가는 어떻게 풀어냈을까 궁금했는데, 웬걸, 미팅을 소재로 이처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데 놀랐다. 서로 다른 동기를 지니고 참가한 3쌍의 남녀. 그 중에는 이전에 연인 사이였던 두 남녀도 있다. 미팅 참가자들이 서로의 심중을 비끼며 나누는 대화의 묘미는 흥미진진하다. 여기에 한 배우가 목뼈가 부러져 살해당하는 사건까지 끼어들고, 이를 두고 참가자들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한다.
무엇보다 <미팅 이야기>의 근사한 엔딩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미팅이 끝나고 참가자들이 모여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이다. 미팅 자리에서 여자들에게 좋은 평가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목 부러뜨리는 남자로 의심까지 받았던 사토라는 남자. 이 별 볼일 없어 보이는 남자가 갑자기 악기점에 들어가 견본용 전자피아노 앞에서 서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한다. 밤의 공기를 빙글빙글 휘젓는 멜로디, 사람을 울게 하고 위로해주는 멜로디다. “촌스러운 코트에 푸른 수염 자국, 눈썹이 덥수룩한” 남자도 이런 멜로디를 들려줄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목을 부러뜨려 살인을 막 끝낸 남자도 천재 피아니스트의 콘서트 포스터를 보며 동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반전의 캐릭터들이 나로 하여금 이사카 고타로의 다른 소설들을 찾아보고 싶게 만든다.
[목 부러뜨리는 남자를 위한 협주곡]에서 내가 특히 눈여겨 본 것은 이사카 고타로 소설이 지니고 있는 어떤 균형 감각이다. 그 균형 감각은 <월요일에서 벗어나>에서 내 고개를 절로 끄덕이게 했던 빈집털이 탐정 구로사와의 말에서 잘 드러나 있는 것 같다. “난 사람 마음이나 선악은 잘 모르겠어. 다만 적어도 공정해야겠다고 생각할 뿐이야. 상대를 비판할 때도 상대 사정은 고려하고 싶어.” 이 말이야말로 이사카 고타로 소설 세계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사카 고타로 소설에 따르면, 선악을 판단하는 일은 작가의 권리가 아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사적 복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누명 이야기>에서 그 아버지의 복수가 정당한지 여부에 작가가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도 그래서일 테다. <누명 이야기>의 목 부러뜨리는 남자는 다만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짐을 대신 져줄 뿐이다. 이것은 “세상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사카 고타로의 안간힘이기도 할 것이다. 이 소설집 도처에 보이는 그의 균형 감각이 미덥고 고맙다. 그래서 이사카 고타로 소설 한 권을 이제 막 발견한 내 자신에게 이렇게 되뇌어 보는 것이다. “웰컴, 이사카 고타로 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