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리 한시 삼백수 : 5언절구 편 ㅣ 우리 한시 삼백수
정민 엮음 / 김영사 / 2014년 12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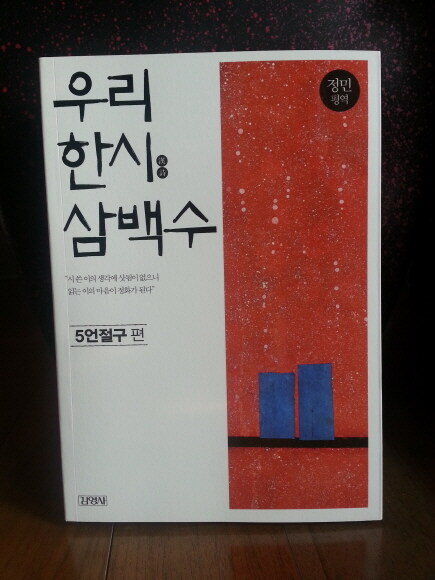
새해를 맞이하며 정민 교수의 [우리 한시 삼백수] 5언 절구 편을 펼쳐들었다. 얼마 전 읽은 [잠시라도 내려놓아라]에서 멋진 당시(唐詩)들을 맛보아서 더 그랬겠지만, 좀 더 본격적으로 우리 한시를 읽고 싶은 열망이 가득하던 차에 만난 책이다. 사실 몇 년 전 그런 열망이 나를 찾아오긴 했다. 길을 걷는데 갑자기 <송인>이라는 한시가 떠올랐던 것이다. 그때 정지상의 <송인>을 찾아 읽는데,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해지네”라는 시구가 어찌나 아름답게 느껴지던지... 고등학교 국어시간이나 한문시간에 접했을 때는 별 느낌이 없던 그 한시가 말이다. 그때부터 한시에 관심을 지니고 두루 읽어보고 싶었으나 시중에 나온 책들은 한문을 잘 모르는 내게는 너무도 버거웠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정민 교수의 친절한 안내를 따라 한시를 만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삼백수가 담겨있어 제법 묵직한 책 두께에 마음이 든든해진다. 책을 넘기다 보니 내가 알고 있는 역사 속 인물들의 이름이 눈에 띄어 반갑다. 정도전, 성삼문, 서경덕, 정철, 황진이, 김상헌, 송시열, 박지원, 정약용 등 꽤 된다. 언뜻 보기엔 짧고 단순해 보이는 이 시들에 우리 선조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담아냈겠지,라고 생각하니 책의 무게가 더해지는 느낌이다. 실제로 김수향이라는 분의 한시 <눈 오는 밤에 홀로 앉아(雪夜獨坐)>에 붙은 정민 교수의 설명을 보면, 우리 선조들의 삶에서 한시가 차지하는 자리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김수향은 진도 유배지에서 사약을 기다리면서 이 한시를 지었다고 한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습하는 상황에서도 한시를 지을 정도로, 한시는 삶과 분리될 수 없었던 것이다.

책을 넘기다보면 우선 발상이 기발한 시들이 이곳저곳에서 눈에 띤다. 먼저 황진이의 <반달을 노래함(詠半月)>이다. “곤륜산 옥 누가 깎아 / 직녀의 빗 만들었노. / 견우와 이별한 뒤 / 속상해서 던졌다네.” 이토록 사랑스러운 위트를 한시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이제껏 살면서 나는 수없이 반달을 보아왔지만, 반달을 빗으로, 그것도 직녀의 빗으로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뒤에 이어진 “견우와 이별한 뒤 속상해서 던졌다네”라는 말은 또 어떤가. 애절한 사랑의 표본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비틀면서 새로운 자극을 준다.
좀 더 화끈한 시를 볼까. “꽁꽁 언 시월 얼음 위 / 댓잎 자리 한기 엉겼네. / 설령 님과 얼어 죽어도 / 새벽닭아 울지 말아라.” 15세기 김수온이라는 사람이 고려가요 <만전춘별사> 첫 연을 번역한 것이라 한다. 수백 년 전에는 10월에도 얼음이 얼었나보다. 그 얼음 위 대나무 잎만 깔아놓더라도 님과 함께라면 얼어 죽어도 좋으니 새벽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다. 이렇게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애절한 사랑을 노래한 시를 읽노라면, 이 겨울 조금 추운 것이 뭐 그리 대수겠는가.
다음에 볼 송익필의 <산을 내려오며(下山)>는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한 시다. “새벽 풍경 맑게 울 제 / 단장 짚고 내려왔지. / 꽃도 이별 아쉬운지 / 물을 따라 나왔다네.” 시인은 새벽 풍경이 울리는 소리를 들으며 지팡이를 짚고 산을 내려오고 있다. 시인의 눈에 시냇물에 떠내려가는 꽃이 보인다. 누구나 보았을 이 풍경을 두고 시인은 이별을 아쉬워하는 꽃을 연상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한시가 형식에 얽매여 있는 낡은 문학 장르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을수록 내가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된다. 3어절 구문으로 이루어진 5언시 형식은 시를 마주하는 내 상상력에 그 어떤 제약도 가하지 않는다.
처음엔 번역문에만 눈이 갔는데, 조금씩 한문 구절에도 눈을 주게 된다. 나는 한자를 잘 모르지만, 음이 달려 있고 본문 아래에 주요 한문 표현에 대한 풀이가 있어서 크게 어렵지는 않다. 강백년의 <산길(山行)>이란 시에서 “十里無人香”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인향(人香)”은 사람의 말소리를 뜻한다고 한다. 사람의 말소리를 두고 ‘향기’라고 표현하다니. 사람의 말을 이보다 아름답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만 같다. ‘인향’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검색해보니, 그와 같은 뜻으로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어여쁜 말이라면 널리 알릴 만한데 이상한 일이다. 이 책이 널리 읽히게 된다면 우리 한시에 등장하는 좋은 표현들도 우리 삶에서 되살아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재기발랄하고 우아하고 기상천외한 한시들을 왜 모르고 살았을까. 이 책을 읽고 나면 밖으로 나가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이를 적절하게 표현해낸 시를 골라 소리 내어 읽고 싶어진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책에 실린 5언시들 앞에서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순간을 경험한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얼마 전 안나 카레니나에 관한 로쟈 이현우 선생의 글에서 봤던 멋진 말을 빌려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인생을 저렴하게 만드는, 최소한 마흔 일곱 가지 방법을 알고 있다. 한시를 읽지 않는 건 그 가운데 하나다.” 저렴한 인생을 면하게 된 기념으로, 이 책에서 특별히 아끼게 된 한시 한 편을 적으며 글을 닫는다.
언제나 짹짹짹 우는 새
어이해 언제나 족한가?
사람들 족함을 모르니
그래서 언제나 부족타.
-송익필, <새 울음소리에 느낌이 있어(鳥鳴有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