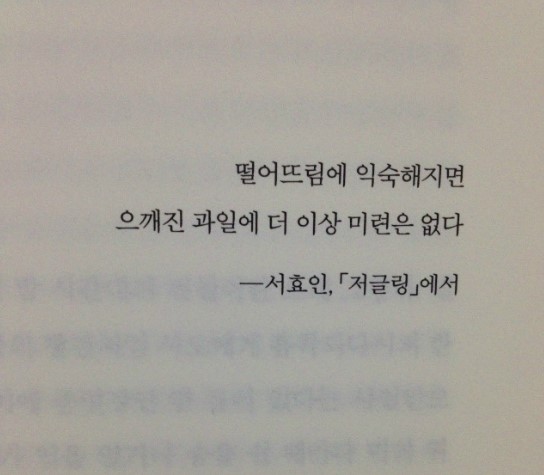-

-
파과
구병모 지음 / 자음과모음(이룸) / 2013년 7월
평점 : 
구판절판

p.9 그러니까 금요일 밤 시간대의 전철이란 으레 그렇다. 밀착을 넘어 연체동물의 빨판처럼 서로에게 흡착되다시피 한 생면부지의 몸 사이에 종잇장만 한 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마운. 누군가 입을 열거나 숨을 쉴 때마다 머리 위로 끼얹어지는 구운 갈비와 마늘 냄새, 문뱃내에 들숨을 참더라도 그걸로 닷새 치 노역이 끝났음을 확인하며 안도하는 시간. 다음 역 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한 무더기 노동자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피로와 고뇌와 한편으론 얼른 귀가하여 젖은 휴지 같은 몸을 매트리스에 부려놓고 싶다는 갈망 사이로 그녀가 들어선다.
"금요일 밤 사람 많은 전철은 피곤하다"라는 내용을 비유적 표현으로 늘여 쓴 문단. (굉장한 길이의 4 문장이다) 작가의 글솜씨가 돋보인다.
이외에도 책 전체가 묘사, 비유적 표현이 많이 되어 있어 마치 캐릭터가 내 주변 어딘가에 실제로 살아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처음, 서장은 늙은 할머니가 지하철 하차 시에 쥐도새도 모르게 한 남자를 살해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지하철에서 꼬장 부리는 남자를 왜 죽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왜냐하면,
앞에 나온 내용이라고는 같은 지하철 칸에 타고 있던 남자가 젊은 여자에게 자리 양보 안하느냐고 시비거는 부분만 나왔을 뿐이기 때문이다. 구체적 살인동기는 설명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독성분에 대한 잠깐의 설명 뿐.
매우 흥미로운 파과의 시작이다!
서장과 종장을 포함하여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파과는 65세의 현역킬러 조각의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스펙터클한 한 여자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
덮어놓고 싸지르기만 하고 낳은 자식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무능한 부모를 둔 덕에 어린나이에 그녀는 당숙네 집으로 식모살이를 하러 가게 된다. 힘든 더부살이도 잠시, 당숙의 딸이 시집을 가게 되면서 당숙과 당숙모는 어린 그녀에게 공부도 시켜주고 미래를 위한 지원을 약속한다. 그러나 희망도 잠시 그곳에서 일어난 한 사건으로 인해 그녀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껴버리게 된다.
p.153 소녀는 류의 가게에서 얻은, 무슨 욕인지 모를 영어가 앞뒤로 적힌 커다란 박스 티셔츠와 긴 면바지를 입고 술병이 담긴 상자를 메어 날랐다. 티셔츠는 어깨선이 거의 팔꿈치까지 내려왔고 끝단은 무릎을 덮어서 소녀는 부대를 뒤집어쓴 것처럼 보였다. 작은 아이가 힘을 곧잘 쓰고 일도 바지런히 잘하니 소개받은 클럽 지배인은 그녀의 나이 외에는 아무런 불만을 표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있어 운명과도 같은 류와의 만남. 일하던 곳에서 미군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 했으나 타고난 영민함과 민첩성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나고, 이 일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류와 함께 방역업을 시작하게 된다.
p.176-177 류에게 의지하고 류가 세상의 전부였다 해도 그에게 느낀 감정은 집착과 애정의 착종에 다름 아니었다. 혈연이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아홉 달 반을 배 속에서 키운 아이는 탯줄이 떨어지기도 전에 해외 입양 브로커의 손에 넘어갔고(......) 그랬는데 이제와서 타인의눈 속에 둥지를 튼 공허를 발견하고 생겨나는 이 연민이라니, 살과 뼈에 대한 새삼스러운 이해라니. 노화와 쇠잔의 표지가 아니고서야 이런 일관성 없음이라니.
p.222 달콤하고 상쾌하며 부드러운 시절을 잊은 그 갈색 덩어리를 버리기 위해 그녀는 음식물쓰레기 봉지를 펼친다. 최고의 시절에 누군가의 입속을 가득 채웠어야 할, 그러지 못한, 지금은 시큼한 시취를 풍기는 덩어리에 손을 뻗는다. (...) 어쩔 수 없이 그녀는 부서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건져 봉지에 담고, 그러고도 벽에 단단히 들러붙은 살점들을 떼어내기 위해 손톱으로 긁는다. 그것들은 냉장고 안에 핀 성에꽃에 미련이라도 남은 듯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다. 그녀는 문득 콧속을 파고드는 시지근한 냄새를 맡으며 눈물을 흘린다.
단 한번도 정상적인 가정을 이뤄본적이 없는 그녀. 어쩌면 그러한 애정의 결핍때문에 방역업자라는 직업을 갖게 된 것이 아닐까. 일생동안 유일하게 자신을 보듬어준 사람을 위해서.
그러나,
살고자 해서 사는게 아니라 살아있기에 그저 하루 하루를 살아갔던 이 방역업자 안에서 무언가 어떤 욕망이 살아난다. 그간 잊고 있었던 자신의 여성성.
무자비한 킬러였지만 그녀 안에 남아 있던 여성성은 사랑했던 이의 죽음과 피붙이 혈육과의 생이별 후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녀를 끝내 무너뜨리고 결국 그녀가 현업에서 손을 떼게 만든다.
pp.332-333
이 순간 그녀는 깨지고 상하고 뒤틀린 자신의 손톱 위에 얹어놓은 이 작품이 마음에 든다. 무엇보다 그것은 진짜가 아니며 짧은 시간 빛나다 사라질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사라진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이 농익은 과일이나 밤하늘에 쏘아올린 불꽃처럼 부서져 사라지기 때문에 유달리 빛나는 순간을 한 번쯤은 갖게 되는지도 모른다.
지금이야말로 주어진 모든 상실을 살아야 할 때.
결국 사람은 언젠가는 부서지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주어진 상실 속에서 얼마나 부단히 자기 자신과 부딪히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개개인의 삶의 종착지는 달라질 것이다. 설령 모두가 다 똑같이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어차피 살아내야 하는 삶이라면
긍정을 갖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숨김없이 살아간다면
먼 길을 돌아 간다 해도
결국엔 자기 자신에 이르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