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앙리 픽 미스터리
다비드 포앙키노스 지음, 이재익 옮김 / 달콤한책 / 2017년 11월
평점 :

품절


책을 좋아한다면, 소설을 좋아한다면 대부분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소설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란 생각을 감히 해본다. 내가 글을 잘 쓰든 못 쓰든 그런것은 제쳐두고 나를 감동하게 해준 이 소설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인생을 바꿔 줄 만한 멋진 작품을 탄생시키고 싶다는 욕망, 나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소설은 어렵다. 읽는 것도 쓰는 것도 항상 그렇다. 그렇기에 작가 중에서도 소설가는 특히나 더 큰 경외심이 들 수 밖에 없다.
하나의 소설이 탄생되기 까지 작가의 창작의 고통부터 출판사의 출간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겹겹이 쌓여 우리에게로 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누구나 출판의 선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글이 시대의 대작이 될 것이란 생각으로 투고하지만 한번 두번 거절 당하다 보면 점점 자신감은 바닥을 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돌고 돌더라도 어느 출판사에 안착하기만 해도 다행이지만 어디 집 한구석에 먼지 쌓인채 그대로 묵혀져 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채 소멸되는 소설 또한 얼마나 많을까. 하지만 분명 그 중에 보석은 존재하기 마련이기에 그런 선택 받지 못한 소설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다면 독자로서 궁금증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인정을 받는다는 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이해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해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작가들은 더욱 그렇다. 작가는 엉성한 감정의 왕국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며, 대개의 경우, 스스로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편집자 델핀과 그의 연인이자 데뷔작이 큰 실패를 한 소설 작가인 프레드는 델핀의 고향집에 들렀을때 선택받지 못한 소설들을 받아 보관하는 도서관에 가게 되고 거기서 우연히 앙리 픽이라는 피자를 만들던 할아버지가 쓴 소설을 발견하고 성공을 예감하며 책을 출간하게 된다. 역시나 그 책은 발매를 하자마자 엄청난 판매를 기록하게 되고 무엇보다 그 책이 출간되기까지의 이야기들은 큰 화제가 된다. 작가인 앙리 픽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났고 그가 생전 책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삶을 살았기에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런 흥미로운 스토리는 사람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 소설의 성공으로 연관된 사람들의 삶이 바뀌며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겨나고 또한 소설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의구심을 가진 한물간 루슈라는 기자는 앙리 픽이 그 소설을 쓰지 않았다는 직감으로 그 증거를 찾으려 고군분투 하며 제기의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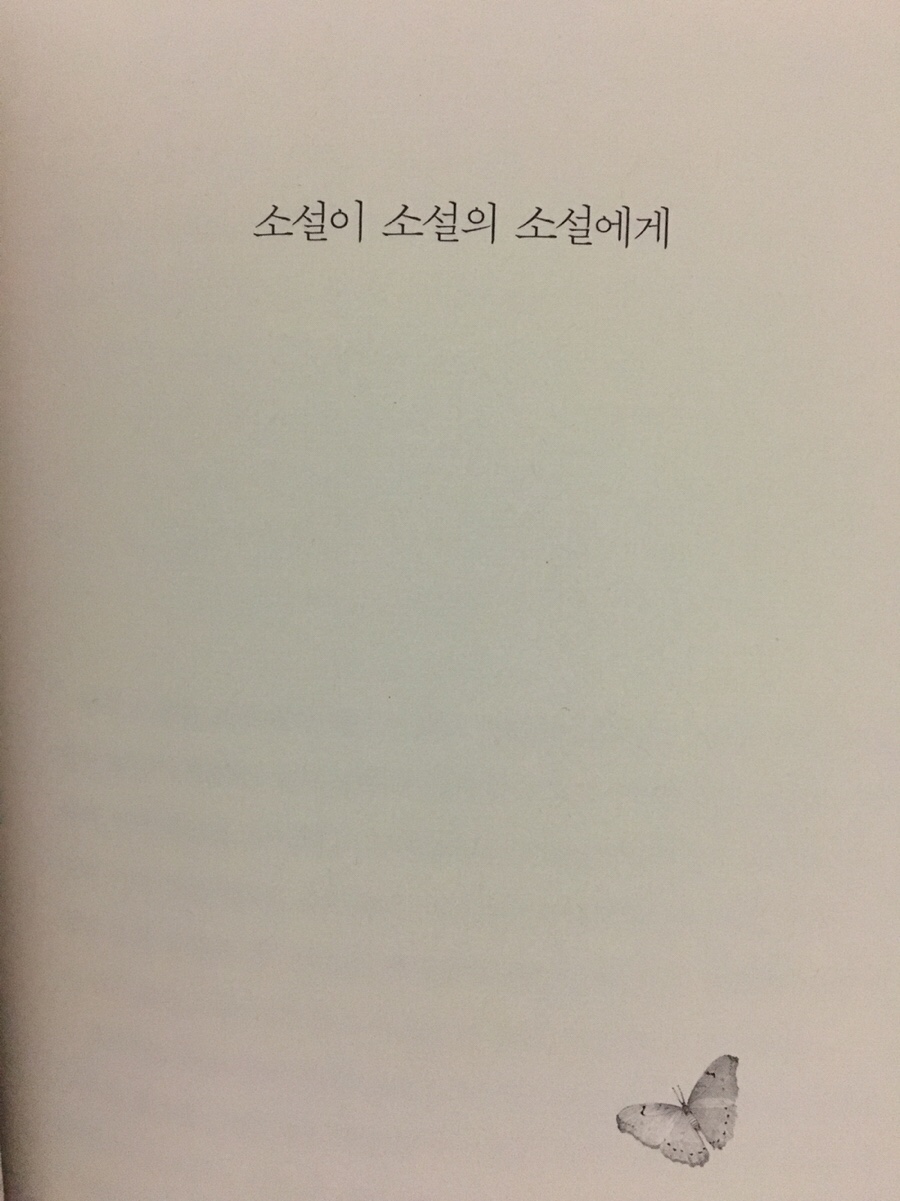
죽은자는 말이 없다 했던가. 약간의 실마리도 남겨 두지 않은채 딱 한편의 소설을 남기고, 그것도 출간하고자 하는 의지 없이 그저 선택 받지 못한 소설들이 모여 있는 도서관에서 잊혀져 가던 소설이 어떻게 쓰였는지 정말 앙리 픽이 쓴 것은 맞는지 진실을 밝혀줄 당사자는 이미 없기에 수많은 추측과 이야기들이 우후죽순 생기며 책의 내용이야 어떻든 책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엔 충분했다. 책에 얽힌 미스터리한 비화를 앞세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한 책속 출판사의 모습은 책의 내용보단 디자인이나 화제성만을 중요시하는 요즘 출판사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나도 표지나 강렬한 제목에 끌려 읽게 되었지만 내용은 형편 없었던 경험을 여러번 해본 경험이 있기에 과열된 마케팅 양상이 그리 반가운 현상은 아니다. 또한 누구도 원하지 않은 책들의 도서관에 맡겨진 수많은 소설들이 그렇게 거절 당하고 결국 빛을 보지 못하며 작가들이 하나의 소설을 쓰기 까지의 고통과 그것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 또한 프레드를 통해 실패한 소설이 가져다 주는 상실감 역시 느낄 수 있기에 소설이라는 장르가 가지는 특수성이 소설을 쓰는 소설가들을 더 크게 느껴지게 했던 것 같다.
자신만을 위해 글을 쓴다는 사람들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단어들은 항상 목적지가 있으며 다른 이의 시선을 열망한다. 자신만을 위해 글을 쓴다는 것은 여행 짐을 꾸렸지만 떠나지 않은 것과 같다.
이 소설은 책으로 시작해 책으로 끝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의 소설이 출간되는 과정과 수많은 작가와 책들이 등장하며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지루할 틈이 없었던 것 같다. 앙리 픽의 소설과 연관된 사람들의 인생이 책이 출간됨과 동시에 바뀌어 가며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들 역시 흥미진진하다. 사실 끝으로 갈수록 뭔가 흐지부지한 결말이 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반전적인 결말은 그간의 미스터리한 일들의 의문점을 해소해 주었다. 분명 미스터리물이지만 무겁거나 어둡고 무서운 이야기가 아닌 사람들간의 사랑과 가족간의 행복과 같은 따뜻한 이야기와 키득거리며 웃게 만드는 저자의 유머가 적절히 녹아 있기에 그 끝은 가슴 훈훈한 따뜻한 메세지를 전달해 주기도 했다. 그렇기에 책을 좋아하고 소설을 좋아하는 독자라면 실망하지 않을 만한 소설이란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