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 장애인과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 이유 ㅣ 아우름 32
류승연 지음 / 샘터사 / 2018년 10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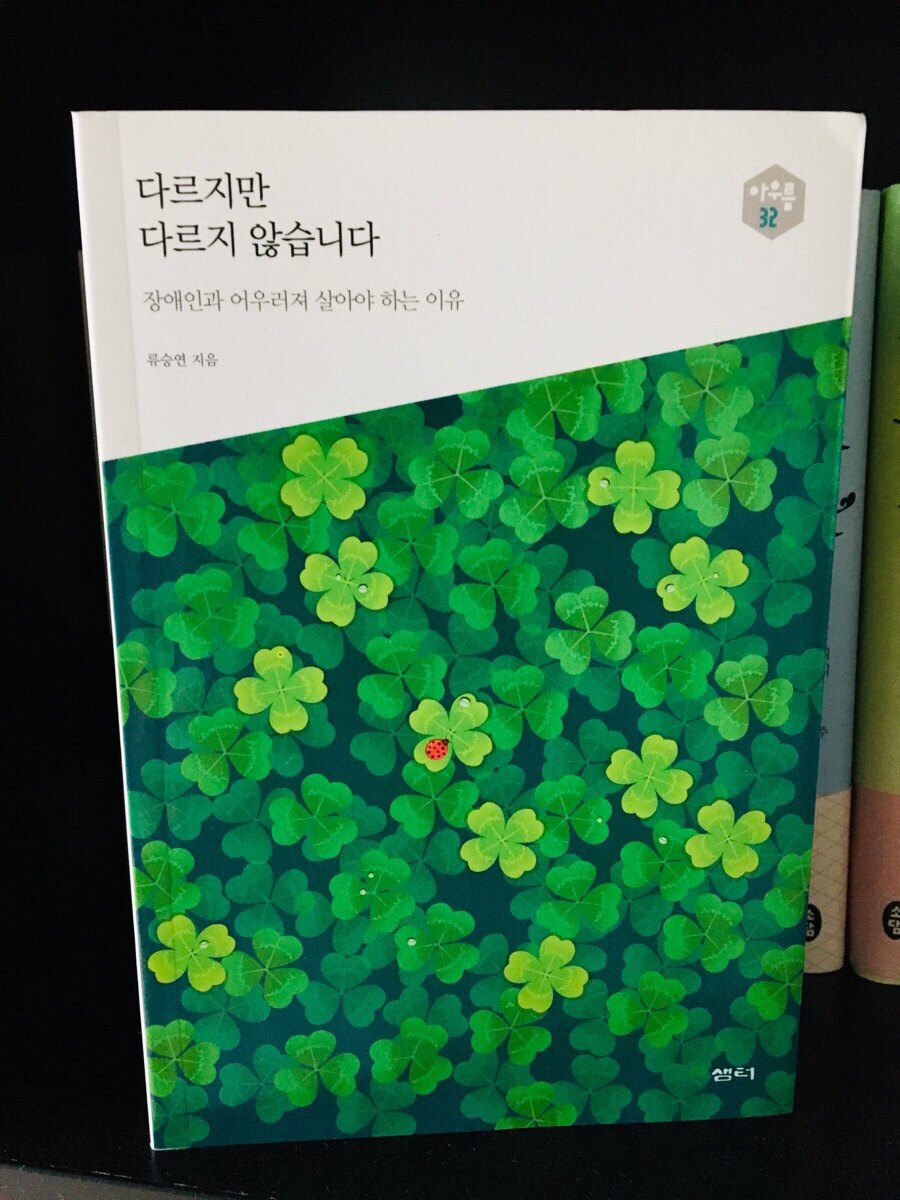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당사자가 되어 보지 않는다면 절대 느낄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 장애란 그런 것이 아닐까. 살면서 내게, 또는 나의 가족에게 장애가 생길 경우를 미리 생각해 보거나 대비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저 내겐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무신경하게 살아갈 뿐. 이렇듯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들이닥친 장애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만약 나의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내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순 없다. 언젠가는 받아들인다고 해도 아마 꽤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만큼 우리에게 장애란 멀고도 낯선 것이다. 한번도 장애를 가까이서 마주한 적이 없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본 적이 없기에 우린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밀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장애’라는 두 글자는 벼락같이 찾아옵니다. 한 사람의 삶에, 한 가정의 삶에 ‘장애’는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찾아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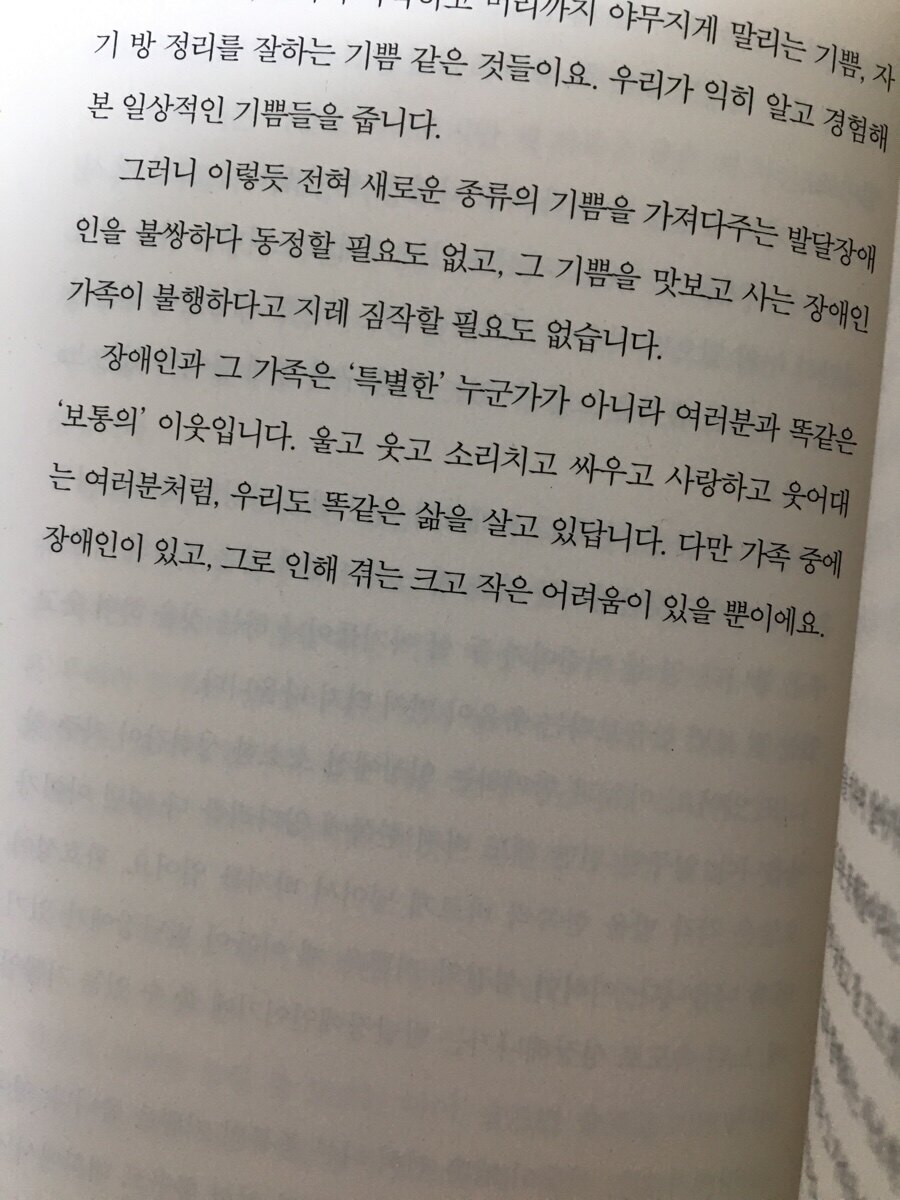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2017년 집계에 따르면 254만 명이 넘고, 그중 10% 정도가 발달장애인이라고 한다. 등록된 장애 인구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장애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즘은 전동 휠체어가 많이 보급되어 거동이 힘든 지체장애인들은 길에서 종종 마주치기도 한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발달장애인들을 길에서 마주치는 것은 힘들다. 그들은 왜 세상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걸까? 그것은 우리의 시선 때문이다. 발달장애인은 위험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혐오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동정의 눈빛을 끊임없이 보내기 때문에 우리의 그릇된 시선이 그들을 점점 더 숨어버리게 만드는 것이다. 마주치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지 못하기에 우린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다. 그들의 삶을 모르기에 점점더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을 둔 저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장애는 미안해할 일이 아니며 장애는 그냥 장애일 뿐이다. 곱슬머리를 갖고 있는 게 남들에게 미안한 일이 아니듯이, 지적장애가 있는 게 미안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누구도 원해서 장애인이 된 사람은 없다. 장애는 ‘그냥’ 찾아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장애인이기에 앞서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잊어버리곤 한다. 사람이기에 앞서 장애인으로 먼저 바라보는 것이다. 그 편견은 부정적이고 동정의 시선이 되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더욱 숨어버리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 갓이다. 발달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해 살아가기 위해 수많은 치료실을 전전하며 개별 교육을 받는 것 처럼, 장애가 없는 우리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우리 나름의 노력을 해야 한다. 거창한 무엇을 말하는 게 아닌, 바로 우리들의 편견과 시선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다.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에게 적응해 살아갈 방법을 익혀야 한다. 그것이 제대로 된 장애 이해 교육이고 그래야 진정한 사회 통합이 되는 것이다.
남들과 같은 속도로 자라가는 딸은 그 나이에 맞는 기쁨을 부모에게 선사해줍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는 아들은 장애가 있어서 예쁩니다. 느린 속도로 커가는 아이만이 줄 수 있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예상치 못한’ 기쁨을 매일 매순간 선물해줍니다. 장애 아이를 키운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불행하고 우울하기만 한 게 아니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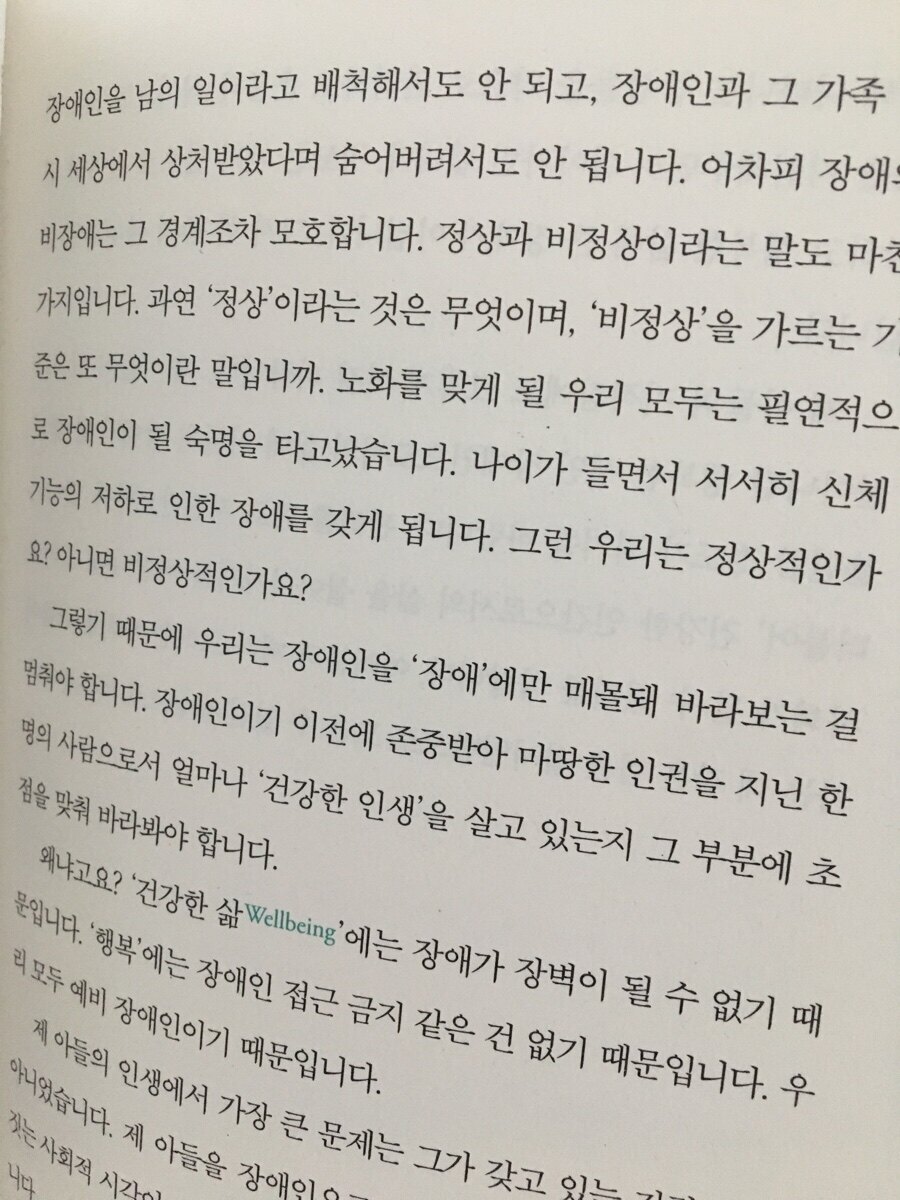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을 키운지 10년이 된 저자가 그간 겪었을 고통과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특히나 나역시 부모이기에, 자신이 아닌 아이가 받는 시선과 불공정함은 더욱 힘들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저자 역시 아들을 가정이라는 틀 안에 숨기고 살았던 시간도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숨기기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닫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사실 나도 잘 몰랐기 때문에 길이나 대중교통을 타고 가며 정말 우연히 장애인들을 마주칠 때면 나도 모르게 눈길을 주게 되고 그 시선엔 분명 동정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을 때가 많았을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며 그간 나는 몰랐기 때문에, 알아갈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라는 변명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말할 수 밖에 없어 부끄럽기만 했다. 하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음이 생기는데 저자는 그에 대해 시선을 잠시 거둬주고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오히려 관심을 보여주는 작은 배려, 사소한 실수는 너그럽게 눈감아주며 세상을 배울 수 있게 응원해주는 작은 여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저자 역시 자신의 아들을 장애라는 틀 속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아들의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며 장애가 있는 아들과 더불어 가족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아들에게 있는 장애를 그저 관리하고 지원하면서 살아가고자 한다. 우리의 가정과 별 다를바 없는 행복을 느끼며 말이다. 비록 아직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시선과 복지는 미흡하기만 하고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하지만 각자가 가진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자 하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은 나부터도 잘못된 시선을 거두고, 좀 더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장애’라는 단어를 가치판단 없이 순수하게 말할 수 있는 세상, 그래서 장애인이라는 말을 들어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 제가 바라는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