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흥미로웠던 부분 중 하나인 화자의 호모 소비에티쿠스에 대한 태도 변화다.
내가 그들을 깨워 그들 삶에 대해 묻는다면 그들은 주저 없이 선언할 것이다. 간혹 발생하는 기차의 연착을 제외하고는, 자기들이 사는 나라는 천국이라고 느닷없이 확성기에서 전쟁의 발발을 알리는 냉혹한 목소리가 흘러 나온대도 이 무리는 몸을 털고 일어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전쟁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고통과 희생을 감수할 것이다. 누추한 이 기차역, 철로 너머로 끝없이 펼쳐지는 평원의 추위 속에서. 굶주림이든 죽음이든 삶이든 그 모두를 당연한 듯 받아들이면서 말이다.
(중략)
입 안에서 맴돌지만 그저 피로 때문에 나오지 않는 말. 정신을 가다듬자. 돌이킬 수 없는 이 말이 빛을 발하며 터져나온다. 호모 소비에티쿠스!
18-19쪽
검정 혹은 회색의 투박한 외투를 입고 바삐 걸어가는 사람들은 스탈린 시대로부터, 전쟁과 궁핍과 말 없는 인고의 세월로부터 빠져나오고 있는 듯하다. 베르그는 인파 속에 섞여 들어 지하철 쪽으로 발길을 옮기더니 그 입구로 흘러드는 시커먼 무리 속으로 사라진다. 그의 긴장된 발걸음에서 변함없이 의연한 결의가 느껴진다. 층계 발치에 내려선 군중 속에서 간신히 찾아낸 그의 모습은 다음 순간 사라진다. '호모 소비에티쿠스.' 경멸의 기운이 밴 목소리가 내 안에서 중얼댄다. 그 소리를 침묵시키기엔 나는 너무 졸리다.
123-124쪽
초반부의 <어느 삶의 음악>의 화자는 호모 소비에티쿠스에 대한 비소를 숨기지 못한다. 화자에 눈에 비친 호모 소비에티쿠스는 맹목적인 바보들이다. 피로 때문에 뱉을 수 없다고 하지만 그들을 향해 터져나오는 비웃음을 참지 못한다. 호모 소비에티쿠스! (심지어 강조되어있다.) 그러나 베르그의 이야기를 들은 화자의 호모 소비에티쿠스를 향한 태도는 사뭇 다르다. 경멸의 기운이 뱄지만 안에서 중얼댄다. 경멸의 소리를 침묵 시키고 싶지만 수면욕에 져버린 나머지 내면의 소리로 울리는 '호모 소비에티쿠스'. 인고의 세월을 빠져나왔다는 표현은 그들을 향한 경건함 마저 느껴진다.
생존을 위해 호모 소비에티쿠스의 삶을 선택한 이들을 누가 감히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 그들은 작가였고, 피아니스트였으며 평범한 가정의 일원이였다. 후대는 왜 그들이 호모 소비에티쿠스가 되었는지 묻지 않는다. 또한 호모 소비에티쿠스 이전의 삶도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저 주입된 선전과 생존에 밀접히 관련되었던 강압으로 인한 결과물, 호모 소비에티쿠스만 존재할 뿐이다. 그들은 어디에도 있으나 동시에 어디에도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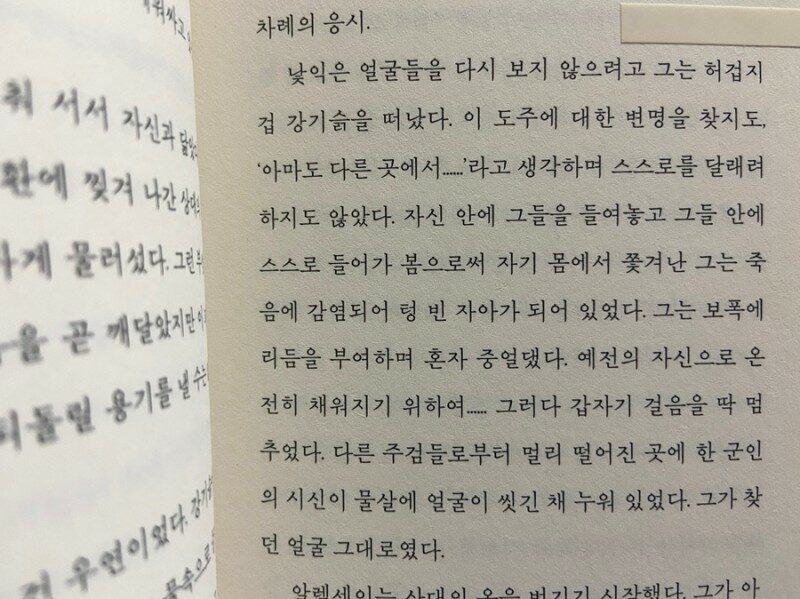
<어느 삶의 음악>의 작가 안드레이 마킨은 1995년 프랑스로 망명한 이후 본격적으로 문학 작품을 집필한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다만 그의 데뷔작에서 소련의 짙은 향기가 풍기는 것으로 보아 구소련 체제에서 문학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La Musique D'une vie, 내용은 감상적인 제목과는 거리가 멀다. <어느 삶의 음악>은 독재 통치 아래 비극적인 운명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한 청년이 이름을 잃은 나날에 도달할 때까지 함께 했던 음악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멋없이 이야기 하자면, <어느 삶의 음악>은 러시아 작가가 프랑스어로 집필한 러시아 작품이다.
그러나 소비에트 연방 체제에서 쓰러지는 풀처럼 탄압받았던 수많은 예술가들의 삶의 단편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이 있을까? 역사를 그대로 서술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안드레이 마킨의 <어느 삶의 음악>처럼 고통을 아름답게 연주하는 작품은 만나기 어려울 것이다. 작가가 프랑스에서 문학 활동을 했다는 것이 독보적인 한수였다. 스탈린 시대의 강인한 영혼을 노래하는 소설, 심지어 여타 러시아 작품에서 만나기 힘든 음유적인 <어느 삶의 음악>.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그들은 음악이 되어 아름다움으로 존재한다.
리딩투데이 지원도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