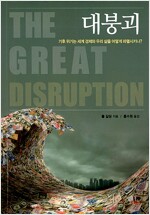모두가 이미 알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환경' 또는 '지구'라고 말하지만 사실 인간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매해 빙하가 몇퍼센트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몇미리씩 높아지며 대기중에 이산화탄소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여하며.. 우리 모두 알고있다. 하물며 초등학생의 포스터에도 환경파괴의 심각성은 경고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뿐이다. 우리는 그저 알고만 있다. 여전히 가열차게 소비하며 당장의 편리함을 위해 일회용품을 애용한다. 우리는 그저 알고 있을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 운동가들이 계속해서 경고의 메세지를 날린다. 하지만 동정과 위험의 상징이었던 북금곰은 이제 우리에게 갈증(코카콜라)을 일으킬 뿐이다. 월e가 아무리 열심히 쓰레기를 치운다한들 설국열차가 아무리 멈추지 않는다고 달린다한들, 그것은 지금과 같은 소비와 낭비 앞에서 경고의 메세지라기 보다는 오히려 희망의 메세지가 되어버린다.
이 책 또한 여타의 그러한 책들과 맥락을 함께한다. 책의 저자는 책의 앞날개에 잘 나왔듯이 이분야의 전문가 중 전문가라 할 수 있다. 특히 저자는 비단 환경분야 뿐만이 아닌 여러분야를 걸친 소위 요즘말로 하면 하이브리드한 또는 통섭적인 혹은 학제간 연계가 어느정도 된 사람이기 때문에 더 깊이있는 분석과 그를 바탕으로한 참신한 해결책을 몇 가지 제시한다. 예컨데 환경문제를 경제학적인 시각으로 풀어서 불평등, 광고 등의 문제로 끌어들인다던지 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마지막장이다.
아무리 깊이 있는 분석을 하고 현실성있는 참신한 대안을 마련한들 사람들의 뇌리에 기억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알고있음' 뿐이다. 다만 이론서로 기억될뿐 실천과 행동을 불러 일으키기는 힘든 것 같다. 환경문제는 매우 이성적인 문제지만, 때로는 이렇게 파편화된 사람들이 거대하게 얽혀있으면서 가시적이지만 즉시적이지 않는 이러한 문제들은 극도로 비이성적인 접근으로 해결되곤 하는 것 같다. 사실인지도 확실치 않을 뿐더러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지만 상대성이론에 대해 일반인들을 상대로 설명하던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설명을해도 알아듣지를 못하자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있을때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때 시간은 같은 속도로 흐릅니까?'라는 말로 시간의 상대성을 설명하자 그때서야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치자).
책을 읽는 내내 그래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것인지 알겠으며 우리가 무얼 해야하는지 알겠어.. 라는 생각도 들지만 당장 책을 덮고 실천에 옮겨야 겠다는 의지가 생기지는 않았던 것 같다. 나처럼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이성적인 문제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주는 것 보다는, 즉시적이고 감상적으로 만드는게 더욱 효과적일 때가 있다. 물론 쉽게 끓고 쉽게 가라앉는 것도 위험하지만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마지막 장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듯 하다. 암스테르담의 카페에 앉아 나눈 상상속의 대화는 매우 인상적이다. 피츠제럴드를 인용한 부분 또한 뇌리에 남는다.
이제 나는 책장의 마지막을 덮었다.
나의 행동이 조금이라도 바뀌어 이 책이 더욱 가치있어 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