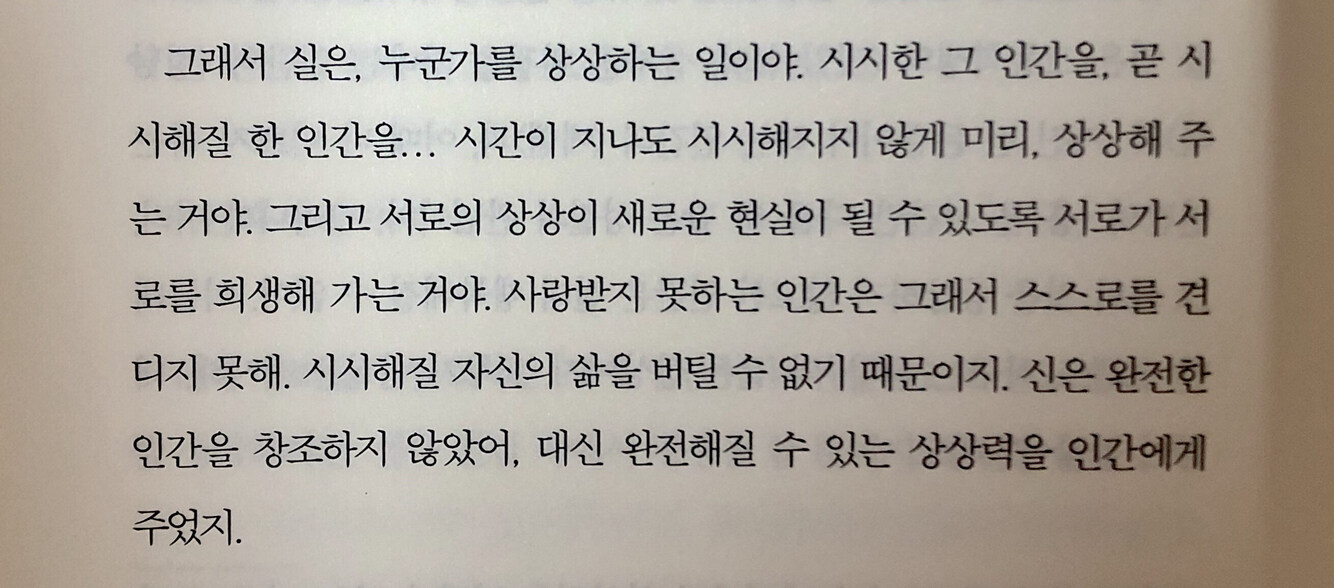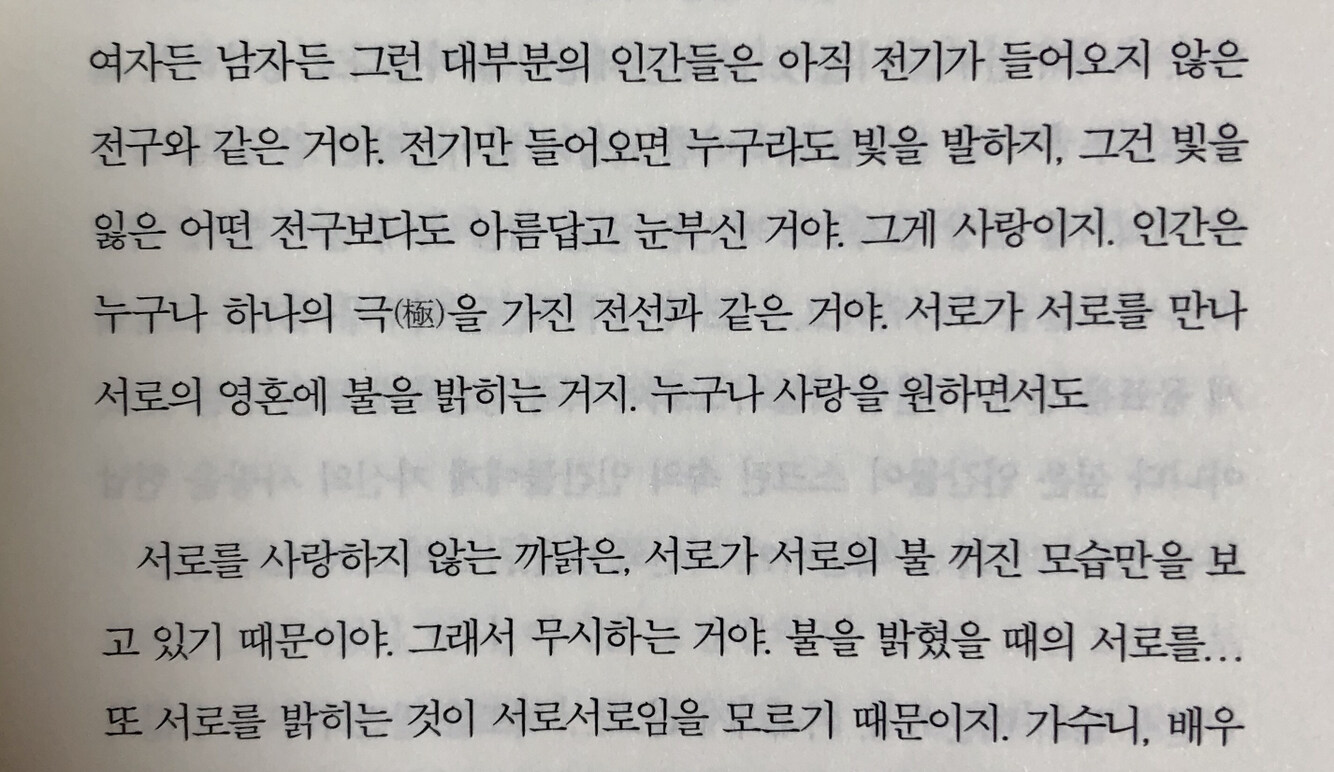-

-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박민규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09년 7월
평점 : 


‘그때까지도 꽤 많은 못생긴 여자들을 봐왔지만 나는 그녀처럼 못생긴 여자를 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것, 클래식에 조예가 깊다는 것, 화가들을 많이 알고, 토요일과 선인장 꽃을 좋아한다는 것...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지고, 서로에게 사랑이란 감정을 느낄 때쯤 그녀는 사라졌고 시간이 흘러서야 한 통의 편지를 받는다.
˝잘 지내셨나요? 정말 미안해요. 어떤 말로도 지금의 저 자신을 대변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요. 저는 당신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저의 어둠에 관한 이야기에요. 저는 이렇게 태어났어요. 어떤 기회도 어떤 노력도 할 수 없었어요. 세상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많다고 사람들은 말했지만 저는 그들이 부럽다는 생각을 한 적이 많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은 그들의 장애를 인정해주니까요. 사람들은 저의 어둠을 장애로 인정해주지도 않으면서 저를 장애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분명 세상이 만들어 낸 장애인입니다. 그렇게 저는 마음속에서 스스로의 얼굴을 도려낸 여자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제 자신을 믿을 수 없어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모두의 수군거림의 대상인 저의 손을 잡아주던 당신의 손을 저는 영영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당신을 보고 싶어하는 나라는 여자에게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닌 스스로에게 결국 무릎 꿇은 것이죠.
이런 얼굴로 태어난 여자지만 저의 마지막 얼굴은 당신으로 인해 행복한 얼굴일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꼭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해요.˝
못생긴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는 여자.
작가는 이 소설을 여자들에게 유독 엄격한 미의 잣대를 들이대는 이 사회에서 상처받고 외면당한 여성들에게 보내는 연서라고 말하기도 한다.
‘제가 아주 못생긴 여자라면...
그래도 저를 사랑해 주실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