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설 주목 신간 작성 후 본 글에 먼댓글 남겨 주세요.
소설 주목 신간 작성 후 본 글에 먼댓글 남겨 주세요.

1. 카인 (주제 사라마구)
카인과 아벨의 비극은 굳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익히 알고 있을 법한 이야기이자 가장 오래된 막장드라마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생을 시기하여 죽이고 도망친 카인. 그리고 그에게 평생 어느 곳에도 오래 발을 붙일 수 없는 운명을 내려 벌하는 신. 사라마구는 또 하나의 문제작인 이 소설에서 아벨을 죽이고 도망친 카인의 삶에 주목한다. 떠도는 카인이 목도한 구약성서의 여러 사건들, 그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들의 삐뚤어진 욕망, 그리고 어딘가 그 인간의 비틀린 모습을 닮아 있는 신까지. 이야기의 끝에서 그가 물으려 했던 것은 아마 선악의 경계와 그것을 정하는 자의 자격이었을지도 모른다. 누가 감히 카인을 죄인이라 하는가. 카인을 벌하는 신은, 우리가 믿고자 하는 만큼 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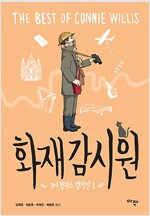
2. 화재감시원 (코니 윌리스)
SF계의 거장 코니 윌리스의 가장 뛰어난 작품만을 추려낸 걸작선 중 1권. 기발한 소재와 흥미로운 스토리, 주제를 막론하고 펼쳐지는 수다와 유머의 향연, 이라고 책 소개는 말하고 있다. 코니 윌리스는 타고난 이야기꾼이고, 그의 펜끝에서 모든 이야기는 새로운 색채를 입고 다시 태어난다. 그가 좋아하지 않는 주제라 말하는 외계인과의 전쟁을 제외하고 다양한 SF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유쾌한 단편들은 2016년 새해를 반짝반짝 빛나는 즐거운 세계로 이끌어주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너무도 무겁고, 우중충하고, 심각하니까 때로는 코니 윌리스가 보여주는 비현실적이고도 생생한 이야기의 강물에 오롯이 몸을 맡기는 것도 나쁜 생각이 아닐 것 같다. 오늘 하루 소리내어 크게 웃을 수 있도록.

3. 세상의 피 (카트린 클레망)
'테오의 여행'의 후속작으로, 12년 후 환경운동가 의사가 되어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병든 사람들을, 그리고 병든 지구를 만나는 테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수없이 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섥힌 지구, 그 곳곳에서 다양한 의견과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을 만나 치열하게 소통하며 환경 보고서를 완성해가는 테오. 그 곳에서 그가 맞닥뜨리는 진실은 결국 세상에는 온전히 희생적인 인간도, 온전히 이기적인 인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때로는 자연을 필요로 하고, 때로는 자연을 이용하며, 때로는 자연을 그리워하며 살아간다. 테오의 이야기가 알려주려는 것은 그렇게 때로는 뜨겁게 끓고, 때로는 조용히 흐르며, 때로는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세상의 피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닐까. 우리 모두 같은 피를 나누어 뜨겁게 공명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말이다.

4. 골든애플 (마리 유키코)
한 사람의 정신이상 증세가 주변 사람에게도 전염된다는 '감응정신병'. '골든애플'은 기이하게마저 여겨지는 이 소재를 중심으로 언제 어디로 광기가 흐를지 모르는 위태로운 사회를 창조한다. 독자를 더 두렵게 하는 것은 마리 유키코의 소설 속 세상이 결코 낯설지 않다는 사실이다. 온갖 미친 일들이 넘쳐나고, 그 미친 일들에 점차 둔감해지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들이 살아가다 어느 날 더 미친 짓을 감행할지도 모르는 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아닌가. 폭력이 폭력을 부르고, 광기가 광기로 이어지는 그런 사회 말이다. 정신병에 전염성이 있다, 는 기본 명제 자체에 대해서는 마구 반박을 하고 싶었지만 소설이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설득력은 어마어마해서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5. 바느질하는 여자 (김숨)
솔직히 말하자면 이 책을 추천하고 싶어서 1월 신간평가단 소설 추천 기간을 기다렸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작가 김숨의 반가운 일곱번째 장편소설. 늘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잔잔하게 뽀얀 빛을 내는, 곱고도 맑은 문장으로 글을 쓰는 작가가 바느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어쩐지 책에 수라도 놓여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숨의 소설에서 늘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엄마'가 이번에는 자식들을 먹이고 기르기 위해 끊임없이 어그러진 손으로 바늘을 잡고 한땀 한땀 수를 놓아나가는 바느질 하는 여자로 등장한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등에서 딸들은 인생을 배운다. 그 인생 속에서 어느날 어머니의 삶을 이해한다. 그리고 비로소 그 사랑의 의미에 가 닿는다. 김숨의 책을 읽으면 늘 엄마보다도 할머니가 보고싶어진다. 이유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늘 그랬고 이번에도 그럴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