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사랑한 소설들]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사랑한 소설들]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우리가 사랑한 소설들 - 빨간책방에서 함께 읽고 나눈 이야기
이동진.김중혁 지음 / 예담 / 2014년 12월
평점 :

품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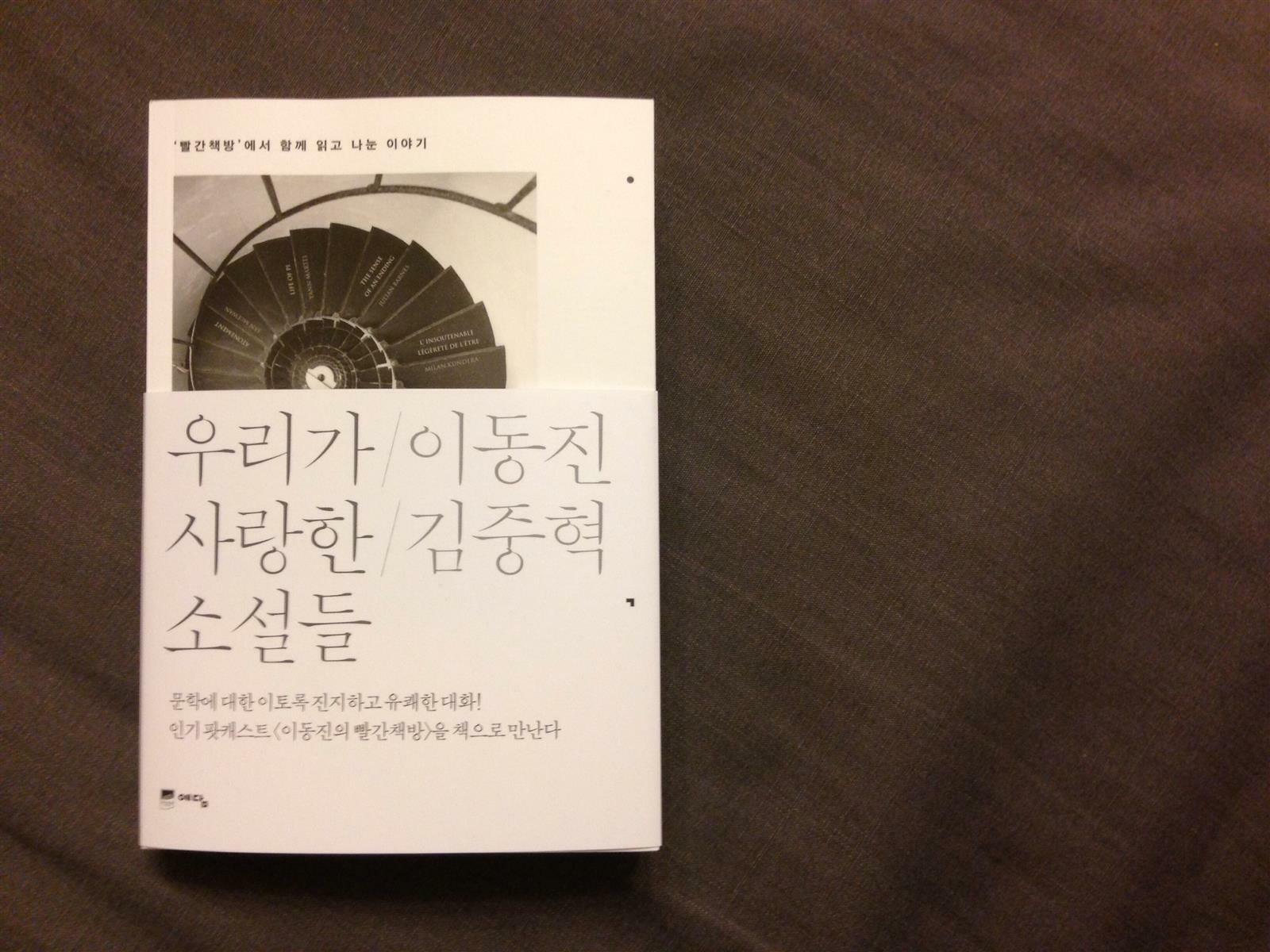
금요일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퇴근 후 몇 시간과 출근 전 몇 시간을 이용해 짬짬이 다 읽었다. 보통 적게는 두세 권, 많게는 열 권 정도를 왔다갔다 그때그때 읽고 싶은 책으로 골라 읽는 내게는, (정말 그 책에 빠진 경우를 제외하고서) 한 권의 책을 집중해서 끝까지 읽는 경우가 드문데 이 책은 오랜만에 한 호흡으로 끝까지 읽은 책.
2년 전, 팟캐스트 빨간책방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두 사람의 대화를 그냥 듣고 흘려보낼 게 아니라 녹취 풀듯이 기록으로 정리해놓고 꼼꼼히 읽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막연했던 생각이 진짜 책으로 나왔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부담없이 읽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책값을 9900원으로 매겼다고. 330페이지에 다다르는 볼륨감 있는 책치고는 저렴하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기존의 팟캐스트 방송 내용을 옮겨 다듬고 보충해서 만든 책이고 특별히 제작 과정에서 들었을 만한 품이나 요소도 없어 순전히 제작 단가가 놓고 봤을 때는 이 정도 가격이 적당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 안에 든 내용, 무려 7권의 대단한 소설을 담았고, 거기에 이동진 영화평론가와 김중혁 소설가가 각자의 해석을 곁들인 이 지적 가치를 생각하면, 게다가 이 책을 평생 소장해서 간직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책값 만 원은 저렴하다 못해 거의 공짜로 얻은 듯한 느낌이다. 카페에서 먹은 커피 한 잔, 케이크 한 조각보다 저렴한 책이라니.
무튼, 내가 빨간책방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 독서를 다양한 시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판을 짜주었기 때문인데, 만약 진행자가 책-영화-음악 등 콘텐츠의 스펙트럼이 넓은 이동진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 재미가 가능했을까 싶다.
빨간책방이 생겨난 후 우후죽순처럼 쏟아진 많은 책 관련 팟캐스트들을 다 들어봤지만, 빨간책방만큼의 풍성한 재미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동진 평론가만으로는 약간 부족하달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을 김중혁 작가가 기가 막히게 채워낸다. 둘이 함께 책을 얘기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호흡도 좋지만, 김중혁 작가는 책의 세계를 만드는 제작자 입장에서, 이동진 평론가는 책을 세계를 감상하는 독자 입장에서 각자의 견해를 내놓으니 책을 이해하는 시각이 훨씬 더 다채로워진다.
<우리가 사랑한 소설들>을 읽으면서 또 한 번 느낀 건, 빨간책방의 장점 중 하나가 책과 영화, 두 가지 콘텐츠를 융합하여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바로 이동진 평론가가 있기 때문인데, 어떤 책을 소개할 때 비슷한 맥락의, 혹은 비슷한 서사의, 비슷한 구성의 같이 보면 좋을 영화를 덧붙여 소개해준다.
P.120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아까 무지함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우스꽝스럽게 저는 두 영화가 생각났어요. 하나는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고 하나는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에요. 일단 제가 <괴물>의 프롤로그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도입부에 일종의 돌연변이로 태어난 작은 괴물을 낚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려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옆에서 친구가 말리고 있는 와중에 자살하려는 사람이 한강을 내려다보다가 괴물을 목격하게 되죠. 옆의 사람은 못 보고요. 저기 뭐가 있다고 해도 옆 친구들은 ˝어디, 어디?˝ 그러죠. 그러니까 싸늘하게 웃으면서 한마디 남기고 한강으로 뛰어내리죠. ˝둔해빠진 새끼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소설 속에서 베로니카가 한 말이거든요.
P.123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영화 <올드보이>의 아주 인상적인 대사를 인용해볼까요. ˝조약돌이든 모래알이든 가라앉기는 마찬가지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결정적인 불행과 비극에 빠뜨린다고 하면 그게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는 정도의 엄청난 일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올드보이> 식으로 이야기하면 남의 험담을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번 한 거죠. 심지어 자기는 그 험담한 사실도 잊어버리고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서 끔찍한 일을 당하죠. 이 소설에서도 중요한 것은 가라앉는다는 점이죠. 그것이 조약돌인지 모래알인지가 아니라요.
P.234 <파이 이야기>
마지막으로 <파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영화 <더 폴>이나 <판의 미로> 또는 <빅 피시>를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소설로는 커트 보네거트의 <제5도살장>도 권하고 싶구요. 화자와 그 화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관계가 흥미롭고 그 둘 사이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의미를 즐길 수 있거든요.
대체로 이런 식이다. 하나의 문학 작품을 그 작품 안에서만 곱씹고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작품, 또 다른 이야기를 가져와 좀 더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해준다. 단순히 해당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영화를 만나게 되고, 하나의 작품에서 뻗어나간 생각의 가지들은 다른 작품의 가지들과 만나 종으로 횡으로 마구마구 뻗어나가게 된다.
이 책을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먼저 이 책에서 다루는 원작 소설을 하나 읽고 나서 <우리가 사랑한 소설들> 속에서 이 소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읽고,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다른 책이나 영화를 감상해보는 것이다. 이 책을 먼저 읽고 원작을 찾아 읽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소설의 반전이나 결말을 다 알고서 보게 되니 그 재미가 덜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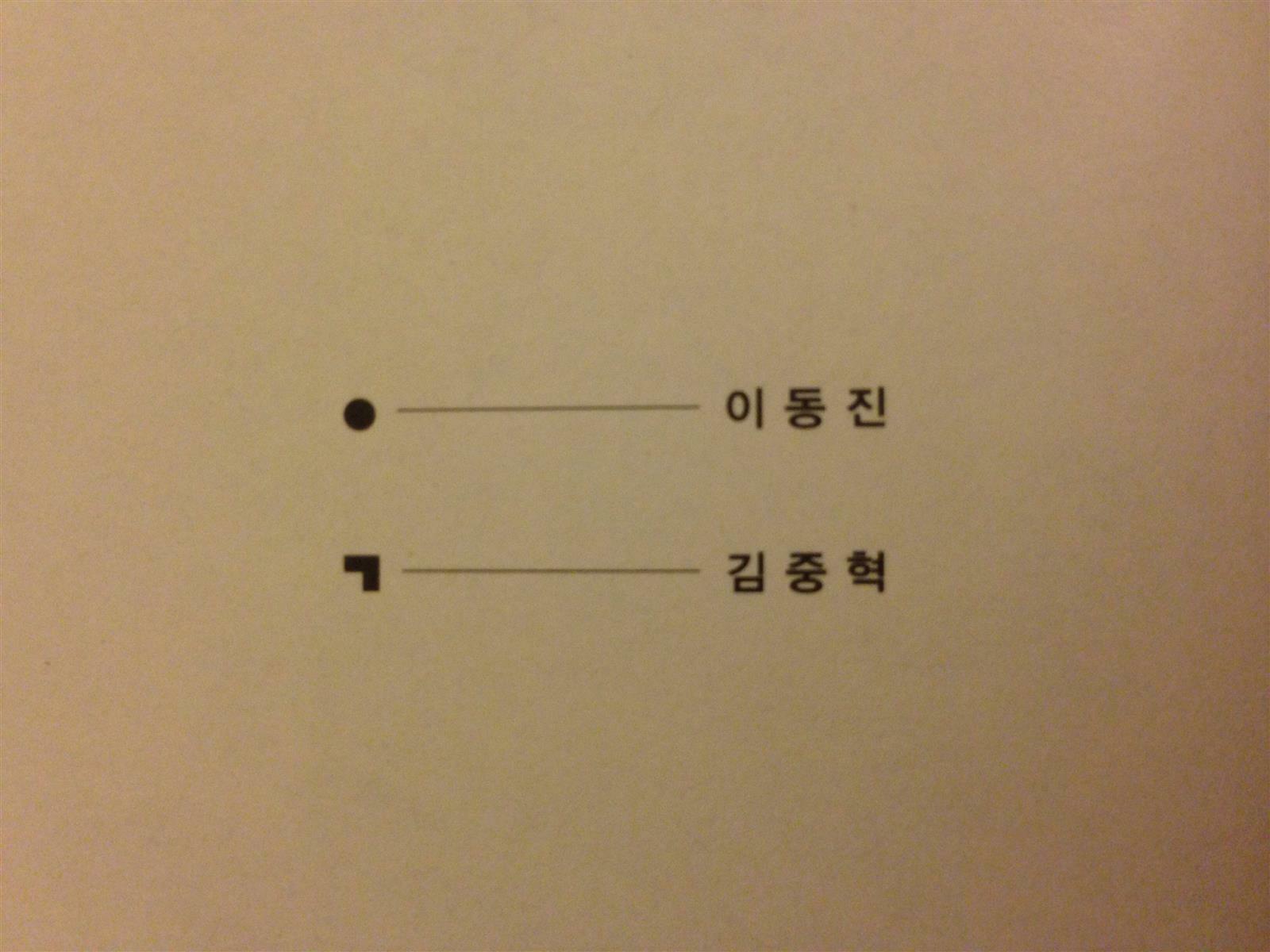
이동진 평론가와 김중혁 소설가가 서로 닮은 듯 다르게 쓴 저자 소개나 서문 읽는 재미도 이 책의 놓칠 수 없는 포인트.
빨간책방은 이제 팟캐스트를 넘어 하나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전에 빨간책방 카페를 다녀와 남겼던 포스팅에서도 썼지만, 이 모든 것은 이동진의, 이동진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가 만든 빨간책방은 자기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온전히 독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동진의, 이동진에 의한, 그러나 독자들을 위한 빨간책방. 빨간책방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통해 빨간책방의 매력을 한층 더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몰랐던 사람이라면 이 책이 빨간책방에 빠지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