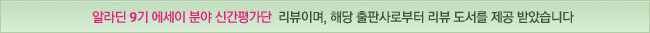[앗싸라비아] 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앗싸라비아] 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앗싸라비아 - 힘을 복돋아주는 주문
박광수 글.사진 / 예담 / 2011년 5월
평점 :

품절

고백컨데 내 사진책에는 네가 어쩌면 기대하는 아주 아주 멋진 풍경 따위는 없어. 왜냐하면 네가 기대했던 그런 풍경이 내 앞에 펼쳐질 때, 난 기민한 동작으로 카메라를 즉시 들지 못했거든...그래서 네가 보는 지금의 내 사진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막 지나간 찰나의 사진이야. 그러니 부디 내 사진을 보면서는 가장 아름다웠을, 사진의 바로 앞 순간을 상상해줘. 카메라를 바로 꺼내들 수 없었던 그 수많은 아름다운 풍경들과 나날을 말이야.
광수생각의 뽀리에 꽃혀 있던 학창시절에 손편지 마지막에 꼭, 맘에 담았던 한 장을 그려내 담아주었다. 한줄의 글이 한칸의 카툰이 가진 힘은 구구절절 풀어내는 열마디보다 나의 맘을 위로하였더랬다. 몇장을 고쳐쓰던 손편지도, 열심히 따라 그리던 뽀리도 이제는 뽀얀 먼지 앉은 기억이였는데 오랜만에 사진이 가득한 에세이로 다시 만난 박광수는 세월을 보태어 그래도 그만큼 많이 다져진 느낌이다. <앗싸라비아>를 실로 마주하기 전부터 들려 온 지인들의 호불호(好不好)에는 부디 흔들리지 말자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지나쳐 마지막장을 덮는다. 사진과 그의 이야기, 어쩌면 그보다 많은 유명인들의 주옥같은 한마디가 어쩌면 조금 식상하고 성의없어 보일진정 그가 에필로그에 고백하며 부탁하였듯 사진의 바로 앞 순간을 상상하는 조금 더 너그러워진 마음으로 함께 하기로 한다.
p.74 겉보다 속. 결혼하기 전 울 엄니는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다리미로 반듯하게 다려 주시곤 했다. 아들 사형제와 아버지의 뒷수발만도 충분히 힘에 부치실 터인데, 속옷까지 다리미질을 하시는 엄니를 옆에서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나는, 사람들에게 보이지도 않는 속옷을 왜 그리 열심히 다리시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그러자 엄니는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쓱 닦아내시고는, 다리미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내게 말하셨다. " 아들, 사람은 겉보다 속이 더 반듯해야 하는거란다."
기억을 소거해가는 엄니에게 바치는 마지막 책, 일지도 모른다는 첫 장의 그의 이야기에서 깊은 사랑을 느껴진다. 그가 이렇게 사람 마음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속옷을 다리미질하며 아들의 속을 반듯하게 키우고 싶으셨던 어머니의 곱고 바른 사랑 덕택이 아니였을까. 세계의 여러곳을 여행하며 찍은 사진은 언뜻 쭉 훑어보아도 '앗싸라비아'라는 주문답지 않게 칙칙하고 버거워보인다. 그의 모든 이야기에 맞아, 라고 고개를 주억거리기도 힘들다. 하지만 그것이 그대로 우리의 삶이 아닐까. 반짝반짝 웃으며 빨주노초 알록달록한 응원은 아니더라도 있는 구태여 꾸미거나 보태지 않고 그대로의 따뜻한 시선이, 가끔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그저 우리의 삶이니까. p.55 삶은 정답을 찾는 시간이 아니고, 질문을 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므로.
p.165 누군가가 그랬지. 나이가 드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단풍이 잘 물들면 꽃보다도 아름답다고. 서른을 눈 앞에 두고는 생각이 많아졌다. 나의 이십대가 이대로 끝나가는 것이 억울하기도 하고, 서른이 되는 것이 막연히 두렵기도 했다. 이십대를 맞이했던 성인이 되는 설렘과 두려움과는 또 다른 그 두려움은, 많은 이들이 이십대에 이루어 낸 것들은 나는 하지 못했음에 부끄러움과 그리고 남들처럼 태연히 삼십대로 살아내야 할 삶의 무게가 농밀하게 섞인 애매한 그것이였다. 그러다 문득, 나는 이제껏 내게는 너무 버거운 남들과 닮은 삶의 잣대를 드리우고는 왜 그만큼 닿지 못하냐고 다그치며 실망하고 애태우며 시간을 보내 온 건 아닐까 싶었다. 내 삶에 내가 제대로 주인이 되지 못하고 두리번거리며 다른 이들의 인생에 조연으로 기웃거리니 실망의 무게가 버거울 수 밖에. 나는 이렇게 책을 읽으며 나의 모지람에 그대로 순응하며 내 몫의 삶을 살아갈 용기를 조금씩 보태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