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불능 낙천주의자 클럽]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구제불능 낙천주의자 클럽]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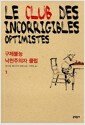
-
구제불능 낙천주의자 클럽 1
장미셸 게나시아 지음, 이세욱 옮김 / 문학동네 / 2015년 4월
평점 :

절판

어렸을 적, 읽고 엉엉 운 책이 있다. 제제와 뽀르뚜까가 나오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다.
나는 그 이후, 나이 든 사람과 어린 사람 사이의 우정에 관한 묘한 로망 같은 것이 생겼다. 이를테면, <세인트 빈센트>나 <기쿠지로의 여름> 같은 것에 대한 환상 말이다.
<구제불능 낙천주의자 클럽>을 처음 읽을 때에도, 어렴풋이 '그런 이야기겠지'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웬걸. 1권이 끝나고 2권이 시작하기 전까지도 '사샤'라고 불리는 사르트르는 제대로 등장하지 않는다. 미셸은 그저 자신이 그닥 극적으로 들어가지도 않은 그 클럽에 사르트르가 있다는 것을 알며, 그에게 말을 걸었다가 가벼운 무안을 당하는 정도로 1권은 끝이 난다. 도리어 중요해보이는 것은 미셸과 그 클럽에 있는 다른 인물들의 서사이다. 물론, 사르트르는 그 이후 점점 커지며 서사를 장악해오지만 말이다.
사실, 처음 우리는 한 사상가를 묻는 이 책을 읽으며 '사르트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파시즘을(정확히 말하면 파시즘적 성향을 보이는 공산주의를) 지지했던, 자신이 틀린 것을 어쩌면 알고 있었으나 끝까지 주장을 번복하지 않던 사르트르. 그는 어쩌면 최후의, '낙천주의자' 였을 것이다.
<구제불능 낙천주의자 클럽>은 이 사르트르의 문제를 조급하게 다루지 않는다. 이야기는 미셸로부터 시작한다. 독서하는 아이, 수학을 못하는 아이, 테이블 테니스를 잘 하는 미셸을 통해 점차 시대상이 드러난다. 알제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공산주의자들과의 대립, 반면에 만연해있는 '트로츠키'주의자와 이외 공산주의자들, 프랑스로 망명온 다국의 사람들까지, 모두가 미셸의 삶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다. 낙천주의자들이 모여있는 체스클럽이 나온 후, 소설은 미셸과 이들 인물 각각의 삶을 조금씩 섞는다. 어떻게 서로 반대편이던 러시아인들이 합쳐졌는지, 헝가리에서 온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소련에서 온 비행사는 어떤 연유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등등. 그 이야기 하나하나에 시대가 녹아있고, 인물들이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당시의 분위기가 묻어난다. 마치, 우리의 많은 후일담 소설들이 그러하듯.
물론 그것들은 낯설고 생소하다.
91년, 정확히는 92년에, 우리의 앞에서 공산주의는 끝을 고했다. 인류의 실험은 끝이 났고, 많은 사람들이 자괴감에 빠져들면서도 해방감을 누렸다. 92년 생인 나는 그 감각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것들을 체감할 수 없는데, 때문에 소설 속에 나오는 세실의 말이나 사라져버린 피에로의 말 같은 것을 읽노라면 궁금증이 밀려온다. 그 이상, 그 생각은 대체 어떤 느낌이었단 말인가?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적'과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다. 이 생각은 <구제불능 낙천주의자 클럽>이 그려내는 사회에서 유효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당시의 세상이다.
<구제불능 낙천주의자 클럽>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세상, 그 시절을 살던 사람들이다. 틀렸음을 어쩌면 알면서도 믿지 않을 수 없던 사람, 졸지에 먼 타국에 와 있게 된 사람, 순식간에 가족을 잃은 사람, 핑크빛 미래를 점차 잿빛으로 물들이다가 돌아가버린 사람까지. 그곳의 모두는 외롭고 쓸쓸해보이지만, 그들은 서로를 지탱한다. 서로를 비난하면서도 옭아매어 뿌리내리게 돕는다. "그런 식으로 사람은 자기가 걸어갈 길을 걷게 된다."(p.284)
그리고 삶은 변해가고, 시대 역시 변해간다.이 방식은 아주 은근하고 일상적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미셸이 로큰롤을 좋아하는 것 만큼이나 일상적이며, 삶에 스며든다. 변화란 그런 것이다. 작가는 이 점을 은근하게, 그러나 끈질기게 비춰준다. 마치 그 시대의 연애, 그 시대의 사랑, 그 시대의 친구를 노래하는 옛날의 소설들처럼. 그래서 일까? 분명히 낯선 타국의 이야기, 낯선 시대의 이야기인데도 빈번하게 우리의 옛날과 소설은 겹쳐보인다. 그땐 그랬지,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들었지, 읽는 내내 그 소리가 계속해서 반복된다. 좋은 소설이 그렇듯, 때로 작품은 체감할 수 없던 것은 체감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문학의 힘이란 어쩌면 그런 동일시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 있는지도 모른다.
* 알라딘 공식 신간평가단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우수 도서를 출판사로부터 제공 받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