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설 주목 신간 작성 후 본 글에 먼댓글 남겨 주세요.
소설 주목 신간 작성 후 본 글에 먼댓글 남겨 주세요.

P.160 : 보통 사람들은 말에 너무 많은 중요성을 부여한다. 말하는 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환상에 빠져 있다. 사실 말은 대체로 모든 논쟁에서 가장 얕은 부분밖에 차지하지 못한다. 말은 그 뒤에 숨어 격하게 요동치는 감정과 욕망을 희미하게만 보여줄 뿐이다. 혀를 놀리는 일을 그만둘 때 비로소 마음이 귀를 기울인다.
말, 언어가 아니라면, 내가 도대체 그의 속을 어떻게 알까? 하지만 말이 얼마나 많은 마음들을 품고, 혹은 가리고 태어나는지, 말만 들어서는 사람의 마음까지 파고들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문학이 그토록 쓰기 어려운 것인가보다. 계속 쏟아져나오는 말들 속에서 어느 때 침묵을 지켜야 하는지 잘 알기 어려워서.
이 묘사에 마음이 아파서, 그의 이야기가 읽고 싶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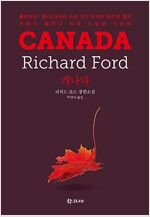
“나는 우선 우리 부모가 저지른 강도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다음에는 나중에 일어난 살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출판사 책 소개 말
시작을 이렇게 간결하게, 써내려간 점에서 흥미가 일었다.
소설은 늘,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인간의 성격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어떤 곳에 있든, 누구에게나 어떤 사건이든 일어날 수 있다. 난독증이었던 사람이 난독증을 극복하고 쓴 소설이 작가를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만들었다면, 읽어보고 싶다.

173~174
난 고문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왠지 모르지만, 고문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리라는 인상을 받아요. 왠지 알겠소? 고문은 개인의 책임이오. 상관의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라고들 하지만 용납할 수는 없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관의 명령이라는 초라한 변명 뒤에 몸을 숨기고 합법적으로 발뺌하며 자신을 지키지요. 이해하겠소? 근본규범 뒤에 숨는 거요.
고문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고문관이 있을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어차피 고문했는데 이름을 기억하나 하지 않나 무슨 소용일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고문하는 일을 거부하지 못한 대신 이름을 기억하여, 자신의 책임을 기억하겠다는 태도는 본받고 싶어졌다.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에서는, '상관' 뒤에 숨을 수 없다. 는 그의 위선적인 자존심이 좋아보였다. 이 모순을 표현한 그의 소설이 읽고 싶었다.

윤이형의 소설은 많이 읽어본 적이 없다. 그가 <쿤의 여행>을 썼을 때 느꼈던 이미지들이 흥미로웠다. <루카>의 일부분("너 역시 내가 왜 딸기인지는 묻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제 너와 함께가 아니고 여전히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채 살아간다. 어떤 일들은 어쩔 수 없고 어떤 일들은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으며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는 함께 살 수 없다. 그저, 그럴 수 없다."
윤이형 [루카], 제 5회 문지문학상 수상작품집, p61)을 읽었을 때, 그가 표현하는 문장들이 예뻐서 마음에 남았다. 그래서 이번 소설집을 읽어보고 싶었다.

오에 겐자부로의 소설 <익사>를 읽었을 때, 그의 어투가 꼭 할아버지같았다.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조근조근 들려주는 느낌. 비슷한 느낌의 비슷한 이야기는 돌고 돌아서 멀리 날아가지 않고 다시 되돌아왔다. 그리고 깊어졌다. 비슷한 느낌이었는데도 끝장을 넘길 때까지 지루하지 않았다. 아픈 이야기도 아프지 않게, 일상적인 이야기도 조금씩 아프게 스며왔다.
그의 다른 작품이 읽고 싶어지는 충분한 이유였다.
매달 추천 신간을 뽑는 것도, 사실은 쉽다고 여긴적은 없다. 하루는 책을 고르고, 하루는 할 말을 고르고, 그러고나서 작성하는데도 영 시원치 않은 기분으로 포스트를 올린다. 하고 싶은 말이 별로 없을 때도 많다. 침묵을 지켜야 하는 순간에는 말을 나불대는 경우도 많다. 생각의 방향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말이 쏟아져나와서 말을 가리기 때문일까. 말을 적절하게 하는 것은 본디 쉬웠던 적은 없다. 나는 늘 치우친다. 억지로 치우치지 않을 생각은 없다. 그래도 읽힐만한 글을 쓰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