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두운 기억 속으로]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어두운 기억 속으로]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어두운 기억 속으로 ㅣ 매드 픽션 클럽
엘리자베스 헤인스 지음, 김지원 옮김 / 은행나무 / 2012년 9월
평점 :

절판


“애인한테 맞아서…….” 혹은, “남편에게 맞으며…….”
엘리자베스 헤인스의 소설 『어두운 기억 속으로』는 악마적인 매력을 지닌 남자친구를 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굉장히 치명적인 매력을 지녔습니다. 너무나 치명적이라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본성을 알아챘을 땐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정말로 늦었을 때라고. 여인은 악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사랑인지 불안인지 공포인지 모를 끔찍한 경험을 합니다.
보통의 남녀 관계 문제에 있어서 극단적인 상황에 까지 이를 수밖에 없었다면, 그 문제의 원인 대부분은 양쪽 모두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양쪽이 똑같은 양의 잘못을 저지른 경우, 혹은 오로지 한쪽만 전적으로 잘못했을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봅니다. 극단의 상황에 이를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저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것도 일종의 잘못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신의 인생을 두고 그런 식의 무책임한 행동을 보인 것은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상대방의 죄가 더 크다고 해서 자신의 죄가 상쇄되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설은 달콤한 연애소설처럼 시작합니다. 시작은 평범한 느낌입니다. 일반적인 초콜릿. 하지만 한번 맛을 보니 그 맛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악마의 달콤함을 지닌 초콜릿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맛봄과 동시에 약간의 불안을 느낍니다. 맛있고 멋있긴 한데 무언가 굉장히 섬뜩한 느낌의 잔인한 공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허용될 수 있는 어떤 경계선 위를 아슬아슬하게 타고 흐릅니다. 그러다 조금씩 밀어붙이고 취향을 강요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영역으로 조금씩 들어오는 느낌.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 순간 자신의 공간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고, 세상의 모든 것이 인위적인 시험 무대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 여인은 결국 미치고 맙니다.
설마 이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야기가 흘러갈까 싶지만, 소설은 묘하게 그런 극단적인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막다른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아무에게도 도움 요청을 할 수 없어서 끊임없이 내달리다 어쩔 수 없이 어두운 골목의 끝에 이른 느낌. 아무도 믿을 수 없어서 결국 자기 안에 갇혀버린 한 여성의 모습. 연애소설, 혹은 치유소설이던 이야기가 어느 순간 스릴러로 변모하고, 소설이 흘러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간 거의 숨이 막혀버릴 정도가 됩니다. 어떻게 그 상황이 되도록 그러고 있었나, 혹은 그러고도 지금은 괜찮은가, 등등 묻고 싶은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기준의 차이, 정도의 차이일 수 있겠지만, 소설이 보인 모습만 보자면 이런 관계는 정말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섬뜩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같은 스릴러 소설보다 오히려 더 극단적이고 작위적일지 모른단 생각이 듭니다. 뉴스만 봐도 판타지 무협 소설 같은 일이 심심찮게 일어나니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소설이 또 다른 공포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도 어떤 악마의 초콜릿이 새어나오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더 두려움에 몸을 떱니다.
“당신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건 당신이 좋은 여자인지 나쁜 여자인지에 달렸지.” (69쪽)
이 모든 이야기의 이면에는 그가 나와 함께 있고 싶고 나와 함께 있는 걸 즐기는 이유가 오로지 우리 둘 다 연애 관계를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뛰어들 염려 없이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이 모든 게 내가 그에게 병신처럼 뛰어들기 직전에 그가 한 말이었다. (162쪽)
“넌 이제 한 사람을 사귀는 거야. 이건 전혀 다른 종류의 게임이라고.” (220쪽)
나는 회복 과정을 밟아나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편하지 않았을까 하고 수차례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사를 하면서 깨달음을 얻었다. 내 인생을 통제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나 자신이어야만 한다고. 다른 답은 없다고. 그래서 나는 주도권을 쥐고 매 순간을 통제했다. 일정을 초 단위까지 맞추고, 발걸음 수를 세고, 티타임을 정했다. 그것은 나에게 목적의식을 주었고, 아무리 지랄 같고 우울하고 외로워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제공했다. (264쪽)
나는 맞고 사는 관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여자들을 멍청하다고 항상 생각했다. 어쨌든 간에 상황이 뭔가 잘못 흘러가버렸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갑자기 자신의 애인이나 남편이 두렵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테니까. 그때가 바로 떠나야 하는 순간이다. 돌아보지 말고 떠나야 하는 거다.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다. 왜 남아 있는데? TV나 잡지에서 이런 여자들이 인터뷰한 것을 보면 항상 이렇게들 말한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279쪽)
“망할 정신과 의사처럼 말하지 좀 마요.” (40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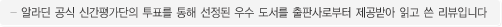
크롱의 혼자놀기 : http://ionsupply.blog.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