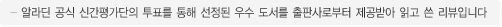[굿바이 동물원]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굿바이 동물원]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굿바이 동물원 - 제17회 한겨레문학상 수상작
강태식 지음 / 한겨레출판 / 2012년 7월
평점 :

구판절판

아아! 강태식의 『굿바이 동물원』을 읽다가 얼마나 웃다 울기를 반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희극과 비극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했던가요. 아니면 우리 인생은 무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했던가요. 아무튼 이 소설은 따뜻한 느낌의 행복, 웃지 않고는 배기지 못할 개그, 작은 위안을 줄 희극임과 동시에 떠올리기 싫은 현실, 고독한 처지, 절망과 고통 등을 보인 비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었고, 우는 게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크게 웃다가도 어느새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아! 내 똥꼬털, 캐어가 필요합니다.
오래 산 인생은 아니지만, 『굿바이 동물원』에서 보이던 다양한 인생의 우울한 이야기에 오백 배 공감합니다. 아마 요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소설을 보고 충분히 공감할 것입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누구나가 쉽게 공감하며 느낄 수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소설은 그렇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을 매우 작은 사건, 사소한 감정, 이유를 알 수 없는 기분까지 잡아내어 묘사합니다. 섣불리 맞아 맞아, 하며 공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워 숨기고 싶고, 두렵고 나약하기까지 한 감정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보고도 아무런 말없이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묘하게 불안합니다. 소설이 불안을 직접적으로 보이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묘하게 그러합니다. 겉만 보자면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영화로 치자면 <인생은 아름다워>같습니다. 그만큼의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은 아니지만, 씁쓸하게도 현재의 우리로선 충분히 보편적이라 여길만한 이야기입니다.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웃기려는 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소설은 소설일 뿐이고 이야기가 끝나면 우리는 곧바로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한 불안이 생겨날 때마다 수면제를 한 알씩 모으다 보니, 제 옆에는 어느덧 치사량을 넘을 만큼이 수면제가 소복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소설은 아주 천천히 조금씩 우리를 소설 밖의 현실로 내몹니다. 이것이 묘하게 사람을 불안을 만듭니다. 재미있고 감동적인 소설을 읽는 동안 크게 웃고 크게 운다 하더라도 그 시간은 마치 봉지에 가득 짜놓은 본드가 만든 환각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설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한꺼번에 밀어닥칠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놓인 현실을 지우기 위해 축 처진 팔다리를 흐느적거리며 흐릿한 눈을 뜨고서 이어 읽을 다음 소설을 허겁지겁 찾아야만 했습니다. 웃고 울면서 반쯤 열린 입에서 흘러나온 침을 닦고, 산만하게 떨리던 왼손을 오른손으로 세게 잡아 진정시키며 말입니다.
솔직히 산다는 것이 많이 힘듭니다. 그렇다고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어서 그냥 삽니다. 웃을 일도 없지만 그다지 크게 울만한 일도 없어서 그저 그렇게 삽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 분명 답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삽니다. 문제도 모르면서 답이 있다고 생각하며 말입니다. 그건 단지 착한 아내를 얻어서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거나, 철밥통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거나, 고기집 사장님이 되어서 떼돈을 벌었다는 식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무언가 다른 근본적인 해결책이 분명 있을 텐데, 설마 그 해결책이 콩고의 밀림으로 가서 자연을 벗 삼아 다른 고릴라 무리와 함께 산다는 것은 아닐 테지요. 진정으로 그 방법뿐이라면, 어서 힘차게 가슴을 두드려 '우후후후' 세상을 향해 포효하는 법을 익혀야겠습니다. 아아! 세게 두드려 멍든 내 가슴, 캐어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꿈과 환상의 나라로 떠나요. (29쪽)
그날은 하루 종일 강한 바람이 불었다. 대장 고릴라 만딩고가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을 기어오를 때도, 여자 고릴라 앤이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정상에서 가슴을 두드리며 포효할 때도, 내 마음속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몸을 가누기가 힘겨웠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는 폭풍우에 휩쓸린 난파선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며 어두운 밤바다를 표류했다. 등대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 장대처럼 쏟아지는 빗줄기와 갑판을 후려치는 험한 파도, 그리고 나라는 난파선을 사정없이 흔들고 있는 바람뿐이었다. (128쪽)
하늘에 떠 있는 구름 한 점처럼, 취직을 하는 게 어떻겠소? 연락책의 말은 고즈넉하게 들렸다. 반지하 단칸방이 고즈넉해졌고, 둘 사이에 머물러 있던 어둠과 침묵, 곰팡이 냄새 같은 것들이 고즈넉해졌으며, 그 속에 마주앉은 두 당사자 역시 10초쯤, 어쩌면 1분 가까이 고즈넉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취직이라……. 이렇게 고즈넉한 말이 또 있을까. (253쪽)
제3국! 나를 콩고의 밀림으로 보내주게. (287쪽)
나도 안다.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그저 낡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또 안다, 내가 낡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한 인간이라는 것도. 그래서 그때는 인생이 외로웠다. (330쪽)
크롱의 혼자놀기 : http://ionsupply.blog.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