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불능 낙천주의자 클럽]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구제불능 낙천주의자 클럽]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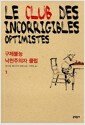
-
구제불능 낙천주의자 클럽 1
장미셸 게나시아 지음, 이세욱 옮김 / 문학동네 / 2015년 4월
평점 :

절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롤로코스트에 비유를 한다. 처음에는 천천히 올라가다가 정상에서 내리꽂는 그 요상한 물체. 포물선을 그리며 올라가다가 꼭대기에 이르면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쫄게 하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 그 물체를 타면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요동치는 가슴을 달래기 바쁘다. 몇 초 안되는 그 짜릿한 순간을 맛보기 위해 사람들은 길게 줄을 선다. 함성 소리에 따라 목을 뒤로 젖히고 하늘에 매달려 있는 그 요상한 물체를 물끄러미 쳐다본다. 그 안에 타고 있는 지구인들을 감상하는 묘미는 직접 타는 것 못지않게 즐거움을 준다. 이러한 즐거움을 주는 덕분에 청룡열차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놀이기구가 되었다. 함성을 지르게 하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정상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스릴 만점의 순간을.
스키를 타듯 전력질주하며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은 흡사 한 마리의 용을 연상케 한다. 그 순간의 짜릿함은 잠시지만 여운은 오래 남는다. 남는 것은 여운뿐만이 아니다. 오줌을 지릴 것 같은 순간에 천하장사의 힘이 손아귀에 들어간다. 공포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 덕에 손과 어께의 통증은 제 2의 선물이 된지 오래다.
삶이한 참으로 묘하다. 청룡열차처럼 짜릿함을 맛볼 수 있는 순간도 주지만, 우울증 환자처럼 만들기도 하니 말이다. 거의 이 세상을 다 산 표정을 짓게끔 하는 것은 마력을 지닌 마술사가 아니면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이다. 요즈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포물선과 같다. 단지 그 포물선의 주기가 점점 빨리 찾아온다는 것이 씁쓸하기만 하다.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오면 좋으련만, 그것은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이 포물선의 또 하나의 다른 모습은 우리를 낙천주의로 살다가 어느새 비관주의로 돌변하게도 한다. 이 소설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인생의 굴곡을 겪으면서도 어떻게든 살아갈 방도를 찾아내는 체스 클럽의 멤버들과, 역시 어수선한 시대 정세에 휘말려 평탄치 않은 사춘기를 보내며 성장해가는 미셸. 미셸은 이 시기를 체스 클럽에서 만난 소중한 우정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다.
나 또한 지금까지 많은 포물선을 그리며 그 포물선의 상한점과 하한점을 여러번 찍었다. 과연 이처럼 평탄치 않은 인생을 누가 지탱해 주는 것인가.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방점을 여러 차례 찍었지만, 그 순간이 되면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특히 하한점에 머물 때는 정말 사이코가 되는 느낌까지 든다. 이 또한 나의 성격 탓이겠지만, 정말 대책이 서지 않는다. 포물선의 상한점에는 희망과 사랑이 존재하지만, 하한점에는 무겁고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한다. 땅 밑으로 잡아끄는 마력이 끝없는 구렁텅이로 몰고 간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시간밖에 없음을 안타까워한다. 이럴 때는 시간이 만병통치약이 된다.
이 소설에서는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한다. 맞다. 그것이 정답이다. 이걸 누가 모르겠는가. 어는 한 순간에 감정이 폭발할 때는 이런 자제력이 생기지 않지만 말이다. 조절이 되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고 아파한다. 반복의 연속이다. 폭발까지 가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만, 그 인내의 한계라는 바닥이 금방 드러난다. 항상 이런 식이다. 그 한계를 뛰어 넘기에는 아직 성품이 뒷받침을 해주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이 책의 말대로 희망의 끈은 놓지 않으려 한다. 언젠가는 이런 극한을 이길 때가 있을 것이다. 아니 반드시 이런 점은 극복해야만 한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극복하고 싶다. 나의 인간성을 되찾고 싶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조금이나마 더 버틸 수 있으려면 말이다.
* 알라딘 공식 신간평가단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우수 도서를 출판사로부터 제공 받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