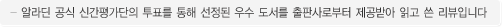[김수영을 위하여]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김수영을 위하여]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김수영을 위하여 - 우리 인문학의 자긍심
강신주 지음 / 천년의상상 / 2012년 4월
평점 :

절판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어느날 고궁을 나서며-를 처음 읽고 느꼈던 전율을 기억한다. 감성을 노래한 예쁜 시는 아니었지만, 시를 읽기 시작하자마자 내게로 착 감겨들며 가슴을 욱조이던 느낌을 기억한다. 압도적인 권력 앞에서는 비굴하게도 작아지는 내 모습을 숱하게 경멸해 보았으므로 시의 도입부분을 읽자마자 나는 한순간에 매혹되고 만 것이다. 단지 그 느낌만으로도 김수영이 누구인지 알고싶어졌고, 해서 그의 시집과 산문집을 거금을 투자해 구입했지만, 오랜 시간동안 책꽂이만 장식한 채로 김수영은 여전히 내게 오리무중의 그렇지만 언젠가는 꼭 알아야할 강렬한 사내로 남아 있었다.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날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로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김수영이 불의의 사고로 한창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고 한때 그것이 모종의 계략에 의한 사고가 아니었을까 추측 아닌 추측을 했던 적이 있다.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의 두번째 단락을 읽고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인데, 잘 모르는 내가 읽기에도 그 시대의 권력이 보기에는 충분히 불온하게 보였으리라는 생각에서 였다. 내가 김수영에 빠져든 것은 바로 그점이었다. 시 한편으로 김수영의 불온성을 상상할 수 있었던 것인데, 안타깝게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 였다. 이어지는 단락의 시어들은 김수영의 개인적 체험에 바탕을 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누가 그랬던가 시가 어려운 이유는 시인 자신이 느끼고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시를 쓰기 때문에 읽는 이로서는 난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제14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김수영을 위하여>에서 강신주는 어느날 고궁을 나서며-를 특별히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며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나머지 단락을 전부 이해할 수 있었다. 그가 자신의 반항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지는 시인의 아픔을 공감하게 되었다. 그리고나자, 단번에 전폭적으로 푹 빠져들고 말았던 어느날 고궁을 나서며-가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했는데, 그저 단순한 이해를 넘어 가슴에 갈고리가 하나 들어 내장 벽을 벅벅 긁어대는 듯한 아픔으로 느끼게 되었다. 절정 위에 서 있지 못하고 조금쯤 비켜 서 있노라고 고백하며 가슴을 치던 시인의 설움을 천분의 일쯤은 이해하게 된 것이다.
아무래도 나는 비껴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공통의 중심이 가르키는 방향으로 돌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벽하게 홀로 돌지도 못하면서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서 나는 아니라고, 나는 권력에 맹종하는 너희들과는 다르다고, 나는 나만의 스타일대로 내 신념대로 단독적인 삶을 살고있노라고 자신있게 외칠 수 없었던 시인의 처절함이 이제야 말로 제대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김수영이 느꼈던 서러움은 고스란히 생활인으로서의 설움이었는데, 그것은 내가 느끼는 설움과 같은 종류의 설움이었고, 나는 다만 그날그날을 안일하게 보내길 소망하고 있을뿐이다. 홀로 선다는 것은 그대로 고통이며, 두려움이다. <김수영을 위하여>를 다 읽고난 지금도 나는 여전이 두렵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으냐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작으냐
정말 얼마큼 작으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으로 쾌락과 권력과 안락을 살 수 있음을 나는 잘 알고있다. 돈을 얻기 위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복종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잘 알고있으면서도 그에 순종할 수 만은 없다고 자꾸만 삐죽대며 올라오는 숨은 내 자신이 두렵고, 타인과 나를 끊이없이 구별하고자 하는 나의 대책 없음이 두려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하면'이라는 중간사를 밥먹듯이 허용하는 나의 무의식이 두렵다. 이대로 가끔씩만 '나는 순응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외치는 것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을 것만 같아 두렵다. 그저 내가 작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음이 못내 서러웁다.
그러나, 내가 김수영일 수는 없는 일이다. 강신주가 김수영이 아니듯, 나 역시 김수영을 흉내내는것도, 강신주를 모방하는 것도 옳은 방식의 삶은 아니다. 다만 김수영을 읽고 강신주를 읽으며 나만의 단독적인 스타일을 만드는 것, 포즈를 버리고 사상을 취하는 것, 그것이 강신주가 말하는 김수영 식 자유다.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소리를 내며 때로는 아름답게 공명하는 사회는 영원히 불가능한 이상속에서나 존재하는 사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한번도 인간사에서 그러한 사회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한 이상사회는 불가능하리라는 생각을 저버릴 수 없는 것이다. 무리지어 구별하는 방법을 저버리지 않는 인간세상에서는 '이념'이나 '주의'가 사라진 온전히 '개인'만을 존중하는 그런 세상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저 김수영이라는 살아있는 역사는 궤도를 이탈한 별 정도로 이해되고 남겨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우리는 어디로 갔다가 어디서 돌아왔느냐 자기의 꼬리를 물고 뱅뱅 돌았을 뿐이다 대낮보다 찬란한 태양도 궤도를 이탈하지 못한다 태양보다 냉철한 뭇별들도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므로 가는 곳만 가고 아는 것만 알 뿐이다 집도 절도 죽도 밥도 다 떨어져 빈 몸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보았다 단 한 번 궤도를 이탈함으로써 두번 다시 궤도에 진입하지 못할지라도 캄캄한 하늘에 획을 긋는 별, 그 똥, 짧지만, 그래도 획을 그을 수 있는, 포기한 자 그래서 이탈한 자가 문득 자유롭다는 것을 -김중식, 이탈한 자가 문득
김수영 평전을 읽는 것보다도 더 김수영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된 이 책을 읽고나서, 김중식의 <황금빛 모서리>라는 시집에 실린 궤도를 이탈한 별-이 떠올랐다. 김수영, 그는 어쩔 수 없는 궤도를 이탈한 별이다. 순종이나 맹종이라는 궤도를 이탈해 자신만의 스타일로 돌기를 원했던 자유주의자 김수영을 내 가슴 속에 별 하나로 간직하며, 강신주가 쓴 김수영 이야기 감상을 마무리한다.
사족하나-강신주는 열 번에 걸친 김수영에 대한 강의를 녹취하고, 정리하여 사랑스러운 책으로 만든 편집자 김서연의 수고를 잊지 않고, 표지에 편집자의 이름을 적었다. 편집자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인문사회 출판시장 부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강신주의 주장이다. 편집자 김서연은 편집자의 말에 '네가 옳다'라고 '네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처음으로 말해 준 사람이 강신주 라고 했다.
여전히 선 자리에서 궤도를 이탈한 자가 되길 꿈꾸는 나에게, <김수영을 위하여>는 영원히 내 가슴에 담고 싶은 자유인 김수영 외에도, 자신만의 소리를 내며 아름답게 공명하는 두 사람을 알게 한 소중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