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느빌 백작의 범죄
아멜리 노통브 지음, 이상해 옮김 / 열린책들 / 2017년 8월
평점 : 



얇은 두께에 금방 읽겠구나 생각하고 책의 첫 장을 넘겼다.
그리고 이내 자그마한 책 속에 펼쳐진 미묘한 세계를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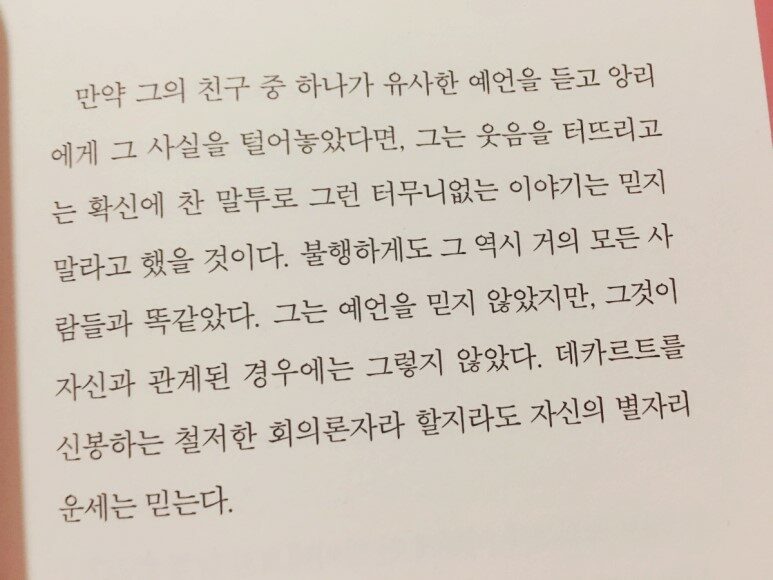
우리 인생에 아이러니가 얼마나 많은지 초반부터 느낄 수 있었다. 사람들은 별자리 운세, 손금, 타로점과 같은 점술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그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점을 믿는 사람을 만나면 무시한다. 자신이 처음부터는 아니어도 어느 순간 믿어버린 점을 타인이 믿고 있으면 무시하고 심하면 비난하기까지에 이른다. <느빌 백작의 범죄>에서는 대부분이 저지르는 '아이러니'를 이용하여 진정한 풍자를 보여주겠다고 초반부터 선포하고 있었다.
예언이라는 말 한마디의 효력이 큰 이유는 가장 행복하거나 가장 불행한 시기에 드라마틱한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이 힘들면 점을 보러 가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괴상한 징크스와 함께 하는, 그 모든 것이 이와 같은 작용이다. 느빌 백작이 만난 예언도 자신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을 팔아야 하는 시기에 마지막 파티를 앞두고 듣게되었다. 이런 상황이었 때문에 쉽게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만일 이 지점에서 하나라도 부족했다면 느빌 백작은 자신의 살인 예고를 이렇게나 두려워하고 고민했을까? 아마도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진 못했을 것이다.

<귀족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보다 적은 권리, 그리고 훨씬 많은 의무를 진다는 걸 의미한다.>
살인 예언으로 이어진 미스터리에 집중이 될 줄 알았던 이야기는 귀족들의 고질병 같은 이상한 집착에 초점이 갔다. 자신의 살인을 기획하는 단계까지 다가갔던 느빌은 어떻게 해야 가장 귀족다울지 고민하게 된다. 결말은 중요하지 않았다. 느빌 백작이 어떤 누구를 살인해도 상관이 없었고 예언이 틀려서 아무도 죽지 않게 되더라도 괜찮았다. 그의 삶에 연민이 생겼고 귀족들의 지긋지긋한 삶에 진절머리가 나던 것이 어느순간 웃음이 새어나왔다.

'범죄'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본다면 이만큼 맹탕 같은 소설이 있을까 싶을 것이다. 읽고 난 후에는 우화나 동화를 읽은 듯한데 그만큼 '범죄'는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도화선일 뿐, 중요한 주제는 아니란 것이다. 오히려 느빌 백작의 완전한 성장기로 보이기도 하는데 어릴 적 겪었던 느빌의 아픔과 더불어 그의 삶을 다루고 있다. 돌보지 않았던 지난날의 자신을 토닥여주고, 아름다운 두 자녀와 동떨어져있는 세리외즈의 르상티를 궁금해하는 아버지로서의 면모까지 다듬고 있다.
블랙코미디를 좋아하지만 쉽게 접할 수 없었는데 <느빌 백작의 범죄>로 유쾌하게 즐길 수 있었다. 깔끔하고 정갈한데 유쾌하고 익살스럽다. 많은 소설들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아니었다. 그렇기에 오래도록 찾고 있던 풍자의 유희를 오롯이 풀어낸 듯하다. 아멜리 노통브 작가의 작품은 처음으로 접하는 것인데 모든 작품을 읽어보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작가였다.
<괴물 같다고 해서 반드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소설다운 소설에서 무기가 나오면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느빌의 상식을 총을 빼앗아 던지는 세리외즈의 비상식으로 부수는 장면에서는 묘한 쾌감까지 느껴진다. 그만큼 우리의 상식과 비상식은 종이 한 장 차이다. '괴물 같다고 해서 반드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작가가 강조하는 말 또한 우리가 어떻게 그를 받아들이느냐의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괴물 그 자체로서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고 괴물이 그 어느 날엔 상식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느빌 백작의 범죄>는 시종일관 딱딱하지만 유쾌하고 매력적인 문장들로 우리를 사로잡는다. 이는 마치 비극과 희극의 양날을 가진 검을 만난 것과 같다. 그 검은 깊게 내면을 파고들어 아멜리 노통브라는 미묘한 세계에 발을 들이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