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바다의 얼굴 사랑의 얼굴
김얀 지음 / 달 / 2016년 8월
평점 :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부터 우리 곁에 왔던 것일까?
정말 이상한 일이다. 누군가는 그토록 원하는 사랑이 잘못이라는 것이.
사랑은, 한 단어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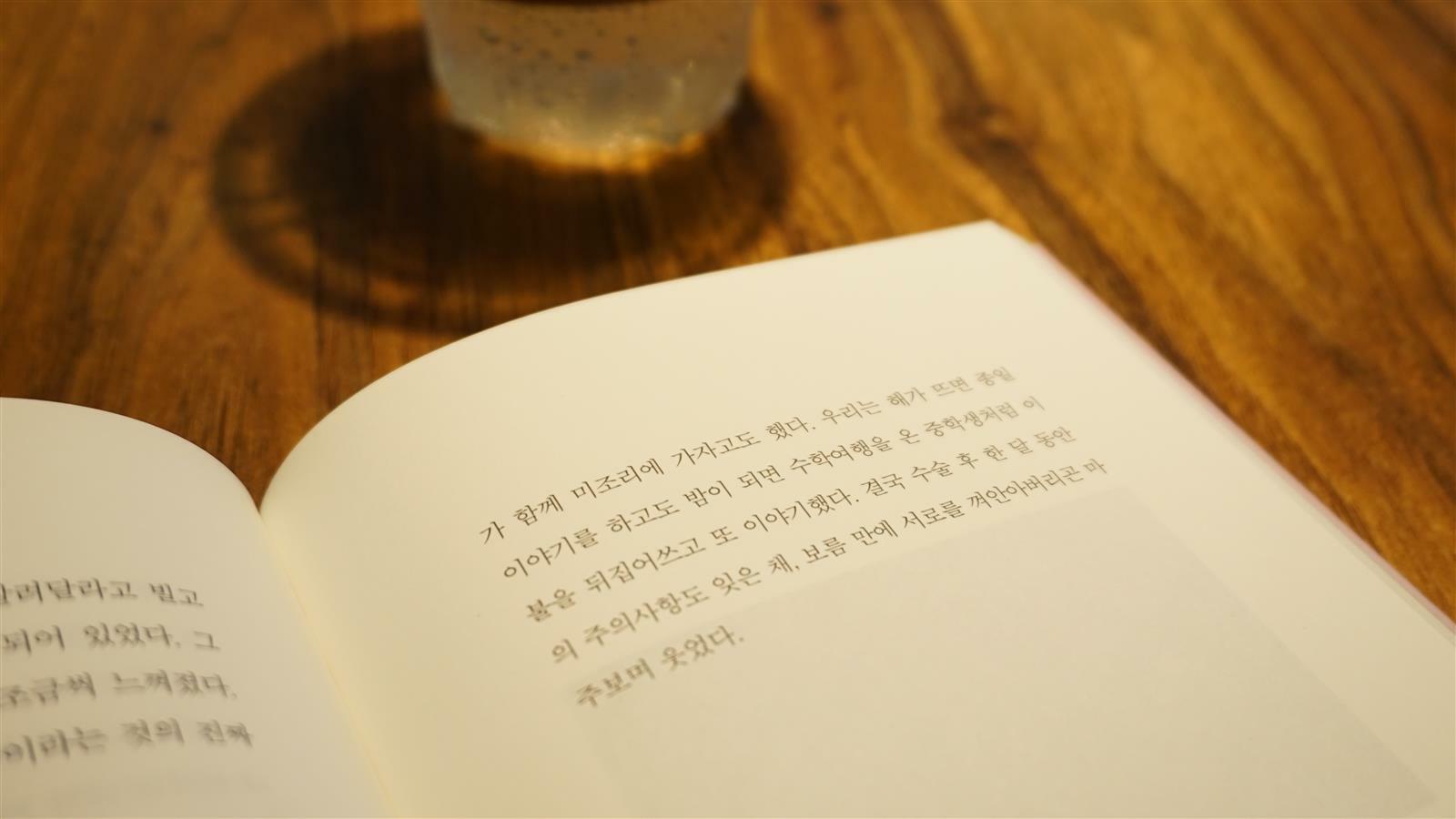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에 상상력을 조금 보탰다, 라는 글을 보았다.
이런 설명은 어느 쪽도 예측할 수 없다.
대부분의 이야기가 실화인지, 실화는 아주 일부분인지,
사실은 다 실화인데 너무 깊숙해서 상상력을 보탰다는 방어막을 치는 건지,
사실은 거의 다 지어낸 이야긴데 내가 이런 사람이다, 포장하는 건지.
어렵다.
어려운 이야기이다.
어느 쪽도 나는 아마 절대 알지 못하겠지만 이 글 속에 담긴 작가의 진심은 느껴진다.
사랑에 대한 진심.
ㄷ에 대한 진심과 애절함.
한숨에 다 읽게 하는 김얀 작가만의 흡입력과 서술 능력 덕분에 책을 읽는 동안 내내
표지에 있는 그림 속 파도에서 계속 일렁일렁, 또는 울렁울렁 흔들리게 하는 듯하다.
표현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거리낌도 없는 그녀가 나는 부럽다.
무언가 쓸 때 그저 솔직하지만은 못한다. 항상.
그러나 그녀의 묘사는 먹을 묻힌 커다란 붓을 잡고 끝이 없는 종이에 마음가는대로 휘두르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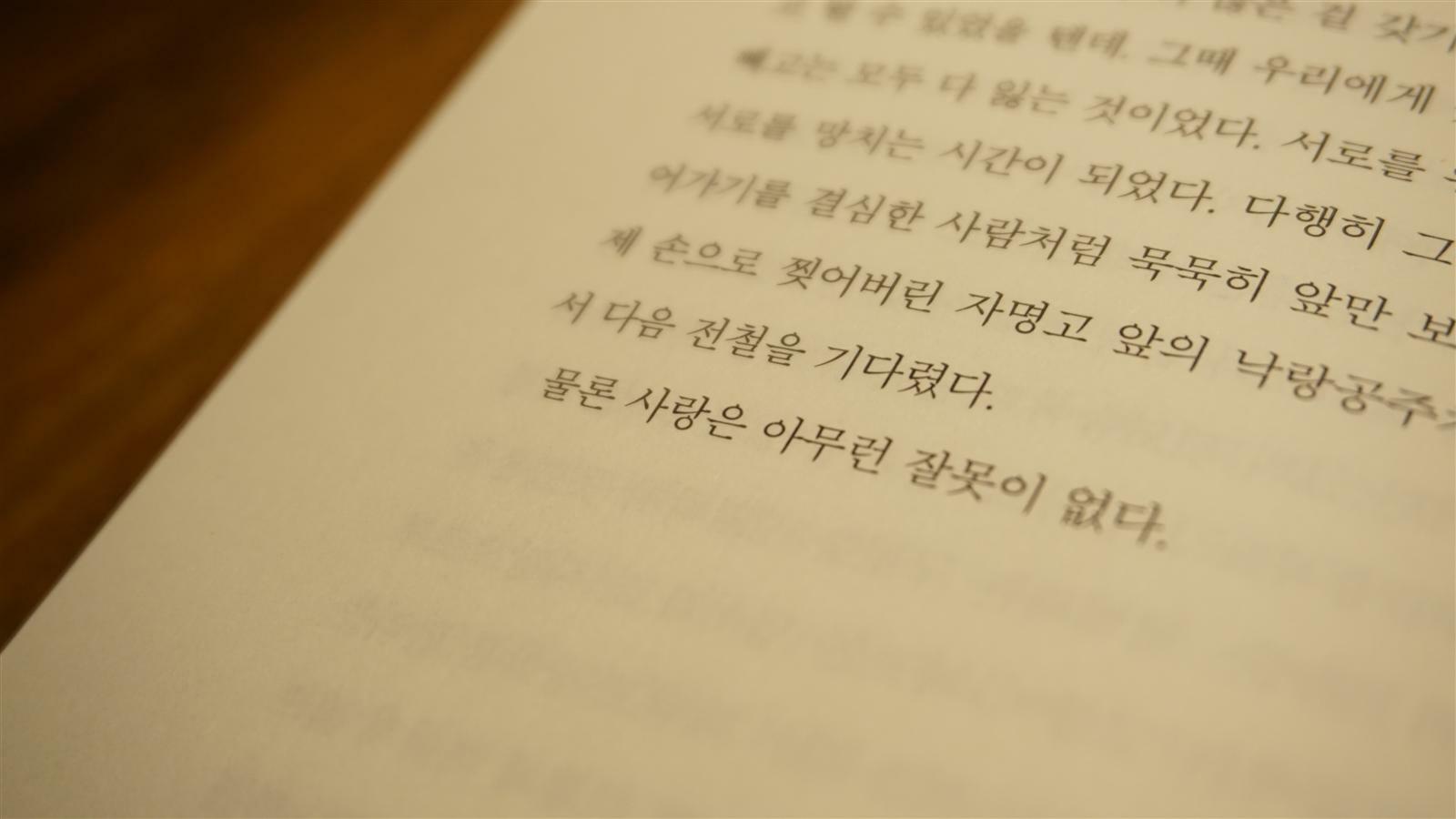
휘몰아치는 감정 앞에서 사람은 언제나 무기력하다.
그 사람을 떠나야만 그 무기력함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극복은 정녕 불가능한 것일까.
사실 사랑이란 단 한가지 종류는 아닐 것이다.
다양한 방식이 있고, 다양한 깊이가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얀 작가의 사랑의 얼굴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다. 언제라도.
그 얼굴에 우리가 휘둘리더라도,
물론 사랑은 아무 잘못도 없다.

책의 중간 중간에 있는 밑줄로 된 글이 좋았다.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과 어우러지는 현재의 작가의 이야기.
현재라 조금 더 생동감있고, 글이 조금 더 단조롭지만 명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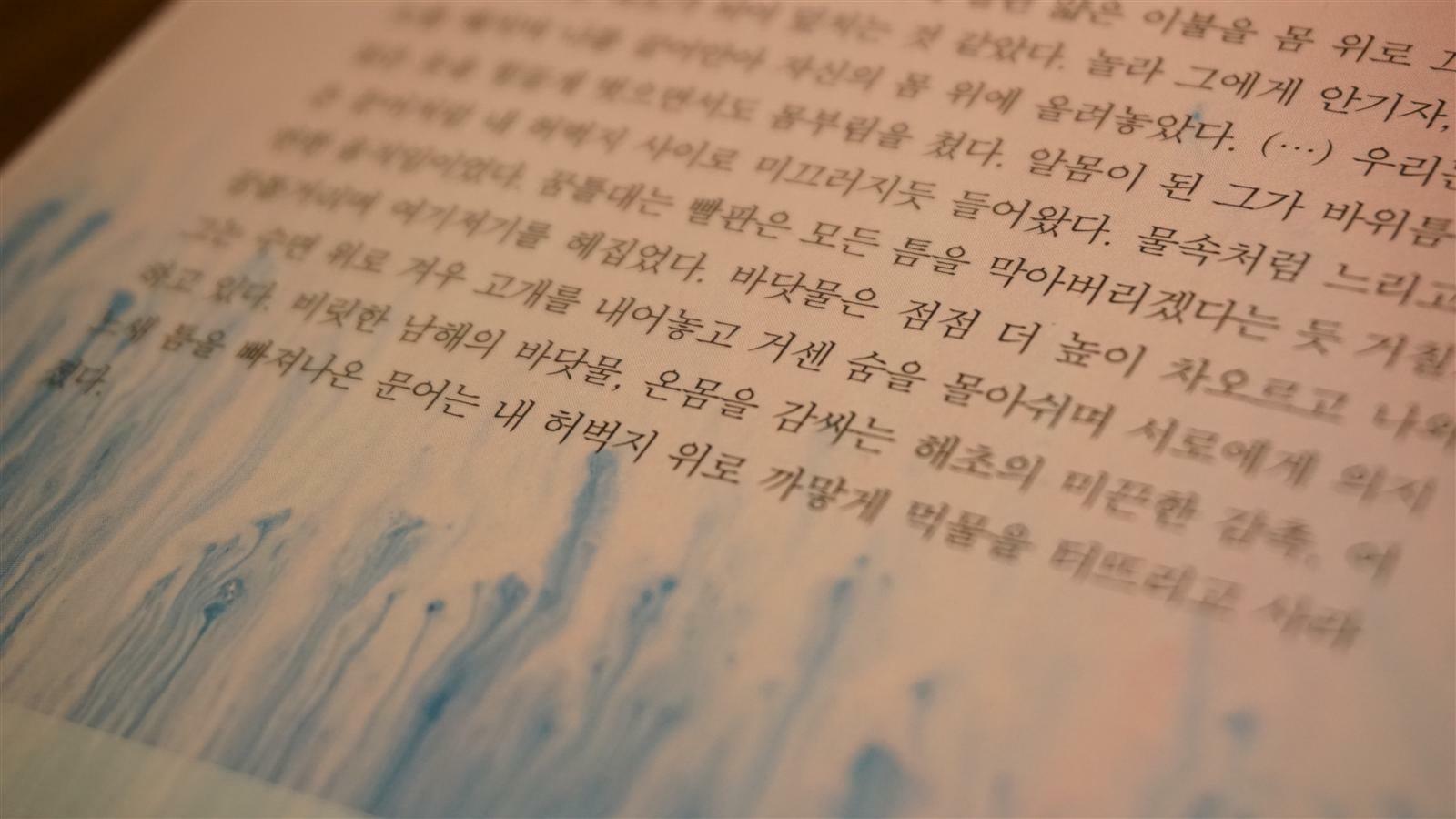
그녀의 문체는 미끈하다. 계속해서 물살을 부드럽게 가르며 헤엄치는 문어처럼 끈적하고 유연하다.
그녀의 글을 읽다보면 어쩔 수 없이 깊은 바다 속으로 계속해서 가라앉았다, 수면 위로 떠올랐다를 반복하는 기분이다.
아, 나는 김얀이 너무 좋아져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