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쓸쓸해서 비슷한 사람 - 양양 에세이
양양 지음 / 달 / 2014년 11월
평점 :



이른바 신춘문예 시즌이 다가오자 소싯적에 글 좀 썼다는 나도 마음이 들썩이는 건 어쩔 수가 없다.
글을 쓰며 살고 싶은 건 여전히 유효한 꿈이지만 대체 그걸 어떻게 쓰는지 아직도 감을 못 잡고 있는지라 노트북을 펴고 한글 창을 띄우면 하염없이 펼쳐진 하얀 여백을 쳐다보기만 할 뿐이다.
최근에 우연한 기회에 내가 어떤 감성적인 글을 쓰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절박하고 무지하다보니 블로그에 끄적인 내 글을 봤다는 사람에게 어떻더냐 물었고 소설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잠시 수긍했지만 며칠간 울고 싶은 마음이 든 건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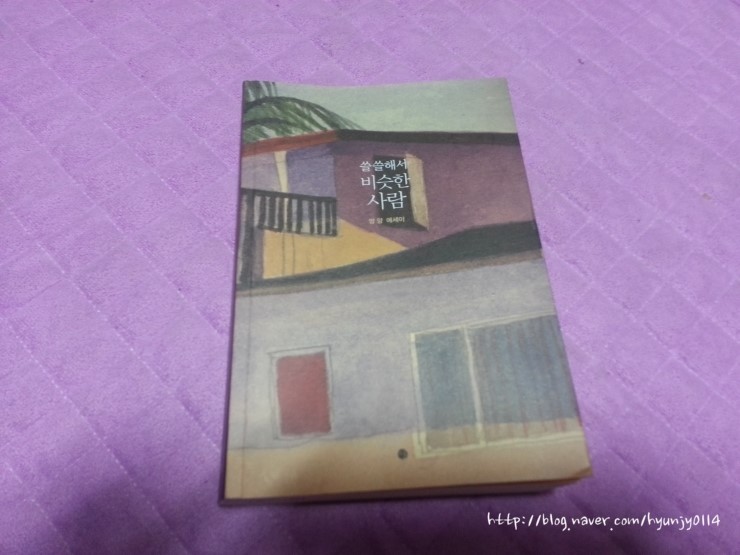
그러다 우연히 받아든 <쓸쓸해서 비슷한 사람>은 읽는 내내 감성 박약의 내 자신을 여지없이 꼬집어 주었다.
하다체로 시작하다 습니다체가 되었고 갑자기 나오는 시와 단문들.
소설이든 시집이든 산문이든 이건 이거, 저건 저거 식의 정돈된 편집과 글쓰기 스타일에 길들여진 탓인지 에세이집이라는 명명하에 이글 저글 아무거나 되는대로 흩뿌린듯한 글들을 주워 모아놓은 듯한 이 책에 먼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작가인 양양의 생각과 라이프스타일이 녹아든 글에서 팔십퍼센트의 감성을 걷어내고 이십퍼센트의 삶을 읽어내려는 습관 때문에 읽기가 힘들기도 했다. 이쯤되자 내가 벌써부터 글에 대한 편견을 가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글이란 상대방의 마음을 울리는 데서 시작되는 거니까.
편견을 걷어내고 읽기 시작했을때 드디어 양양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시간, 그녀의 공간, 그녀의 사람과 인연들에 대해서.
- 기다리는 것 외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지.
그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야.
- 봄은 내 작은 마당이 진가를 발휘하는 시간이었고, 그 좋은 볕에다 초록 식물들을 데려다 두고 함께 살았다. 여름은 밤이 좋아 모기와 다투어가면서 밖에 앉아 있었다. 가을에는 방에 누워 창문 틈으로 귀뚜라미 소리 들었고, 겨울에는 막을 수 없는 매서운 웃풍 때문에 이불에서 나오기가 싫었다. 이불 속에서 따뜻한 것들을 그리워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러했는데, 그렇다면 나의 하루하루는, 매일의 바스락거리는 시간들은 ……. 이제 그 시간들과 작별인사를 나누어야 한다.
-기차는 상해 남역을 출발하여 서른일곱 시간을 달릴 것이라 했다. (중략) 내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해서부터가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길 위에서부터였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려는 곳은 여기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저기이다.
- 그 밤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어떤 연으로 만나 그 밤에 그렇게 서로 웃었을까. 나는 소녀가 그날의 나를 웃게 하기 위해 국밥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천사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

감성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주로 고향이나 가족에 대한 추억이 근원인 경우가 많았다. 어린 시절에 뛰놀던 논두렁이나 보릿대를 태우는 불에 콩을 구워먹던 추억을 나도 가지고 있지만 양양의 에세이에 묘사한대로 외할머니의 넓은 등에 업히거나 엄마가 한여름에도 보일러를 돌려 뽀송하게 만든 이불을 덮고 잔 기억이 내겐 없다. 내가 가진 반쪽짜리 감성은 그래서 누구를 설득하지도 이해시키지도 못하나 보다. 결혼하지 않고도 조카에게 애틋할 수 있고 해줄 이야기가 많은 이모인 양양에 비해 나는 친자식들인 내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던가 비교도 하게 된다.
그리하여 내가 배울 것은 양양의 감성일까? 추억일까? 점점 헷갈려지기도 한다.

하지만 깨닫는 것은 그녀나 나나 시간을 좀더 내가 쓰고 싶은대로 쓰며 살고 싶어하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였다. 그녀는 노래를 만들고 글을 쓰는 일에 좀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싶어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게 비록 돈이 안되고 유명해질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삶의 질이라는 건 결국 가난도 품위있게 감내할 용기를 주는 거니까.
책 안에 삽입된 그림들 중 마지막 그림이 마음에 들었다. 커피집이나 우리집 책상에 내가 잘 올려놓는 커피잔과 휴대폰, 그리고 지갑(?). 여기에 책 한 권만 더 있다면, 아이들이 아직 학교에서 일과를 하고 있는 오전 시간대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이를 먹으니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채소를 좋아하게 된다는 점, 여행길의 고단함을 여행지보다 더 좋아하게 된다는 점, 불필요한 것에 마음쓰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작고 소박하고 낙천적인 삶이 행복해지는데 더 도움을 줄 거라는 걸 양양 또한 꽤나 두툼한 이 책에 그대로 나열해 놓았다.
- 아주 적게 벌고 번 만큼만 먹으며 산다. 매일이 특별할 것도 없고, 어떤 날은 나를 잊기도 한다. 부탁하면 손을 내밀어주는 좋은 사람들 덕분에 셀 수 없이 많은 도움을 받았고, 고마움과 미안함만큼 마음에 부끄러움과 슬픔도 그득 쌓였다. 그럼에도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날들을 가졌다. 이루기 위해 살지 않고 느끼기 위해서 하루를 살고 있다.
그러고 보니 이 여자. 나와 같은 나이였다. 비슷하게 무심하고 비슷하게 심심했다. 그러면서도 예민하고. 그래서 더 친근감이 들었나보다. 감성을 글로 배울 수 있다 치면 나는 동갑내기 이 여자, 쓸쓸해서 비슷했던 양양에게 배웠다고 우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