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쏘공이라 불리는 이 소설은 75년에 연작으로 발표되었다가 78년 6월에 초판으로 발행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96년에 100쇄를 돌파한 명실상부한 스테디셀러로 꼽히는 책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누구나 한번 피 마르게 아파서 소리 지르는 때가 있는데, 그 진실한 절규를 모은 게 역사요, 그 자신이 너무 아파서 지른 간절하고 피맺힌 절규가 `난쏘공`이었다고 조세희는 말한다. 긴 세월이 흐른 후에도 그 난쟁이들의 소리에 젊은이들이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난쏘공`이 시대 문제의 핵심, 인간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이다.
이런 절규를 소설로 쓸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로 보면 정말 위대한 일이다. 어쩌면 (진정으로) 죽을 수도 있는, (진정으로) 죽음을 각오한 글쓰기였다고 생각한다. 정작 조세희는 난쏘공을 쓴 후 또 다시 침묵으로 들어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더 위대한 점은 75년 당시 이런 주제는 대다수 대중이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시대였던 것을 기억하면 난쏘공의 가치는 대단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이런 주제의 이야기는 종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고, 그래서 아직도 반복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개인적으로 난쏘공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지점이 어려웠다. 난장이였던 아버지인가, 아님 어머니? 큰아들 영수? 둘째 영호, 막내딸 영희?? 누가 피해자인가, 누가 해결자인가? 전통적인 소설의 스토리가 잘 그려지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불쑥 등장하는 배역들은 자연스럽기도 하지만 생뚱맞기도 하였다는 평도 있다. 그만큼 난쏘공의 전개는 쉽지 않았다. 다 읽은 후 드는 생각은 “주인공은 난장이로 대변되는 모든 인물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정치인들과 지주들 일부만이 거인이고 그들은 가해자로서 악역을 담당하고 있는 전형적인 선악 구조 속의 이분법에 대입시켜 보면 된다.
이 책은 예전에도 읽었지만 지금은 21세기이고, 나도 제법 늙었다. 난쏘공이 쓰였던 때와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고, 절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난쏘공에서 말하고 있는 거인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들을 리더로 알고 있고 지도자로 따르고 있었는데... 나는 묻고 싶은 것이다. 그들이 거인이 맞았는가!!! 만약 DJ나 노무현 같은 사람이 그 시대의 거인이었다면 난장이 아버지는 죽었을까? 누구는 맞고 틀리다는 차원이 아니라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들이 그런 자격을 갖췄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역사는 분명하다. 적어도 그들은 거인은 아니었고, 당연히 지도자가 되면 안 되었다고….
“나는 내가 마지막 눈을 감는 날의 일도 생각했다. 나는 아버지만도 못할 것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은 그들 시대의 성격을 가졌다. 나의 몸은 아버지보다도 작게 느껴졌다. 나는 작은 어릿광대로 눈을 감을 것이다.” 계층이 있고 그 계층간 이동은 불가능하다는 ‘절망’을 보여준다. 폭력이란 무엇인가? 총탄이나 경찰 곤봉이나 주먹만이 폭력이 아니라 도시 한 귀퉁이에서 젖먹이 아이들이 굶주리는 것을 내버려두는 것도 폭력이다.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이 없는 나라는 재난의 나라이다. 누가 감히 폭력에 의해 질서를 세우려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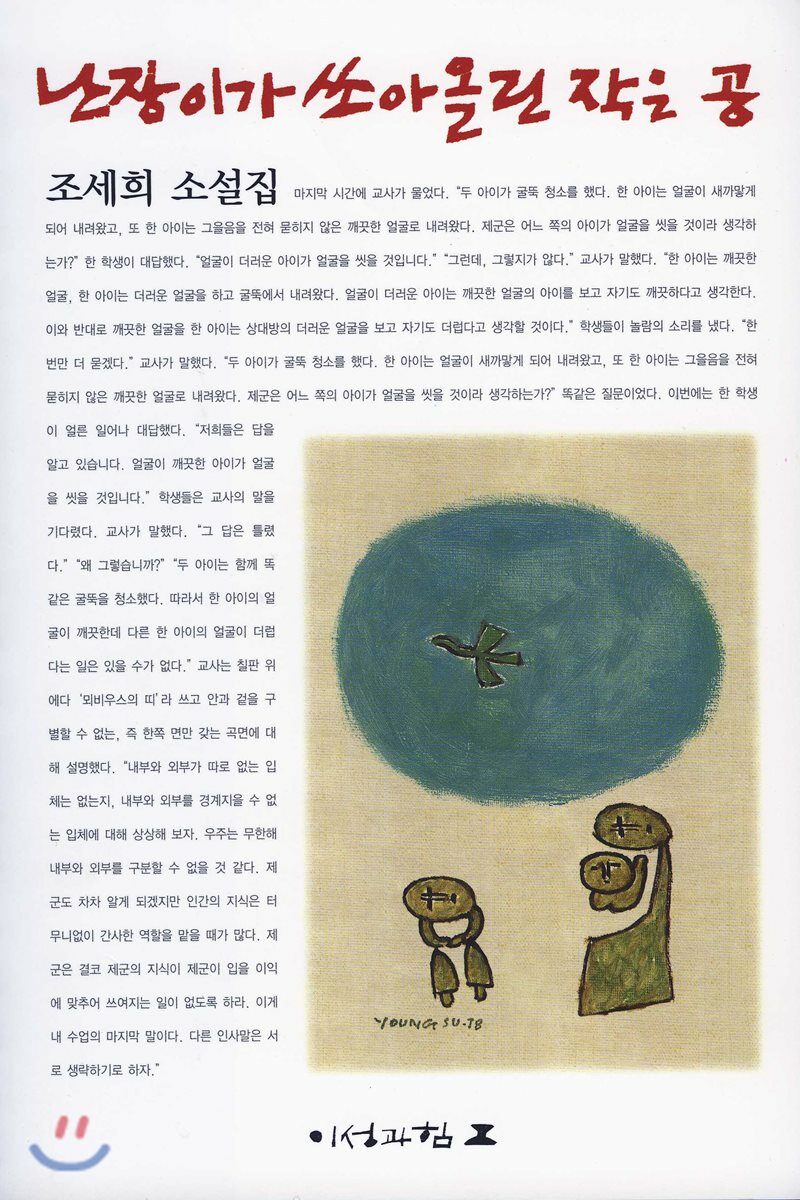

난 낙원구 행복동에 위장전입이라도 해서 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