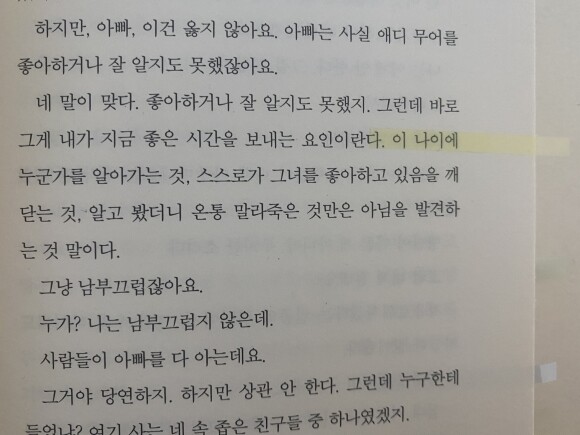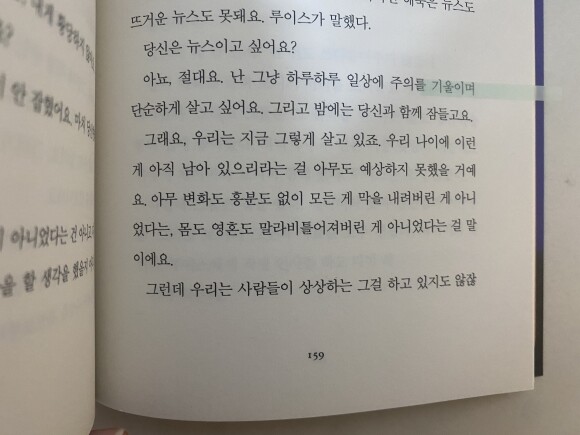밤에 우리 영혼은
켄트 하루프
뮤진트리
“왜 인간은 다른 사람들이 행복을 찾은 방식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는가.”
작은 시골 도시 홀트라는 곳에서 배우자를 사별한 일흔의 두 남녀 노인의 믿음과 우정 이야기
.
외로운 노인 애디는 한블럭 건너에 사는 이웃 노인 루이스의 집에 찾아간다.
“가끔 나하고 자러 우리 집에 올 생각이 있는지 궁금해요.”
“뭐라고요? 무슨 뜻인지?”
“우리 둘 다 혼자잖아요. 혼자 된 지도 너무 오래됐어요. “. (p.9)
놀라운 생각이었다. 단순히 외로워서 밤에 말친구가 필요했던 애디.
이윽고 그 이후 루이스는 앤디 집에 매일 밤 찾아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외로움을 달랜다.
한편, 앤디의 손자가 부모의 싸움으로 떨어져살게 되면서 갑작스레 애디 집에 머물게 되고 손자 제이미는 밤마다 악몽을 꾸며 고통으로 힘들어하지만, 이웃 할아버지 루이스를 만나 마음의 평화를 얻고, 유기견센터에서 강아지를 한마리 만나게 되면서 홀트마을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다시 찾아온 제이미의 부모는 제이미를 데리고 가면서 제이미는 루이스를 그리워한다.
한편,갑작스럽게 쓰러진 애디. 루이스와의 만남을 끔찍이 싫어했던 애디의 아들 진으로 인해 병원과 거처를 옮기게되고, 그렇게 아쉬운 이별로 밤마다 전화를 하며 외로움을 견디는 노년의 이야기로 마무리 된다.
어쩌면 계속인 건지도 몰라요. 그녀가 말했다. 아직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어지는 만큼은요.
오늘 밤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p.194)
밤마다 이 책을 읽으면 마음이 잔잔하고 따뜻해진다. 노년들의 대화글들이 나를 위로해주는 것 같다. 배우자가 죽고 혼자가 된 노년들의 삶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나라였다면 이런건 생각도 못할텐데..
소설은 역시 상상하는 즐거움. 애디와 루이스 노인들의 집을 상상하며 밤마다 오가면서 순수한 우정과 믿음을 그려낸 작품이 어른스럽게 느껴지는 소설이다.
나이를 먹어도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것을 놓치지 않겠다는 루이스. 또 노년의 나이가 되어도 자유로워 지고 싶은 그들의 열망이 느껴졌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기 전까지 반짝거릴 수 있다는 걸..
언제 죽음이 나에게 찾아올지 모르기에, 매 순간 자유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해보는 것 어떨까..
네 말이 맞다. 좋아하거나 잘 알지도 못했지. 그런데 바로 그게 내가 지금 좋은 시간을 보내는 요인이란다. 이 나이에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 스스로가 그녀를 좋아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 알고 봤더니 온통 말라죽은 것만은 아님을 발견하는 것 말이다. (P.59)
자유로워지겠다는 일종의 결단이지. 그건 우리 나이에도 가능한 일이란다.
십대 소녀처럼 구시네요.
십대 시절에도 이러지 못했다. 그럴 엄두좌 못 냈지. 하라는 일만 하며 자랐으니까. 내 생각엔 너도 너무 그렇게 살아왔어. 나는 네가 자발적이고 추진력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P.60)
루이스가 애디 손주를 어린 꼬맹이가 아닌 한 인격체로 대우해주고 존중해주고 마음을 열 수 있게 함께 있어준 모습을 떠올리면서 ‘아름다운 노인이구나’ 하고 반짝였던 기억들.
그저 일상도 조용하고 잔잔하게 흘러가기를 바란 그들의 삶을 존중해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인생과 고독의 무게감이 절실히 느껴졌던..
읽는 내내 행복했다. 다 읽고서 아쉬움이 남는 책. 켄트 하루프 작가님의 다른 책도 꼭 읽어봐야지.
초콜릿은 안 먹는 게 좋다지만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죽을 거예요. (P.40)
진실은, 이게 좋다는 것. 아주 좋다는 것. 이게 사라진다면 아쉬울 거라는 것. 당신은 어떤데요?
아주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요. 좀 신기해요. 여기 깃든 우정이 좋아요. 함께하는 시간이 좋고요. 밤의 어둠속에서 이렇게 함께 있는 것.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잠이 깼을 때 당신이 내 옆에서 숨 쉬는 소리를 듣는 것. (p.102)
난 그냥 하루하루 일상에 주의를 기울이며 단순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밤에는 당신과 함께 잠들고요.
그래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죠. 우리 나이에 이런게 아직 남아 있으리라는 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무 변화도 흥분도 없이 모든 게 막을 내려버린 게 아니었다는, 몸도 영혼도 말라비틀어져버린 게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P.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