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을 죽인 여자들
클라우디아 피녜이로 지음, 엄지영 옮김 / 푸른숲 / 2023년 12월
평점 : 



붉은 색 표지가 인상적인, 그리고 왜 '여자들'일까란 물음으로 소설을 읽는 독자들을 집중케 한 작품이었던 것 같다.
추리나 범죄 소설 등 무언가를 파헤치는 과정이 흥미로워서 그 분야의 책을 주로 탐독하는데, 이 두 가지가 녹아있으면서 사건의 주체가 여성인 점이 소설을 바로 읽기 전 목차를 쉼없이 읽게 만든데에 영향을 준 것 같다. 나의 경우, 이 유형의 작품은 바로 읽기 시작할 소설일 법한데 인물별로 목차가 나뉘어 있다는 것은 인물마다 이야기할거리가 많다는 것을 알려주기에 더 집중력을 요하는 장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시나..인물이 목차일 수 밖에 없는 이유들이 사건안에 가득했다.
첫 인물의 목차를 읽을 때는 가족의 역사인가? 자매들의 어린시절? 우리가 왜 알아야하나?라고 이끌며 집중력이 흐려질 때 즈음 가족임에도 껄끄러운 만남의 시작이 집중도를 높인다. 자매들 중 한 사람의 죽음으로 개개인이 가정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찢겨나가고 작가는 진실을 알려주기위해 인물들마다의 기억과 시간을 이용해 독자들을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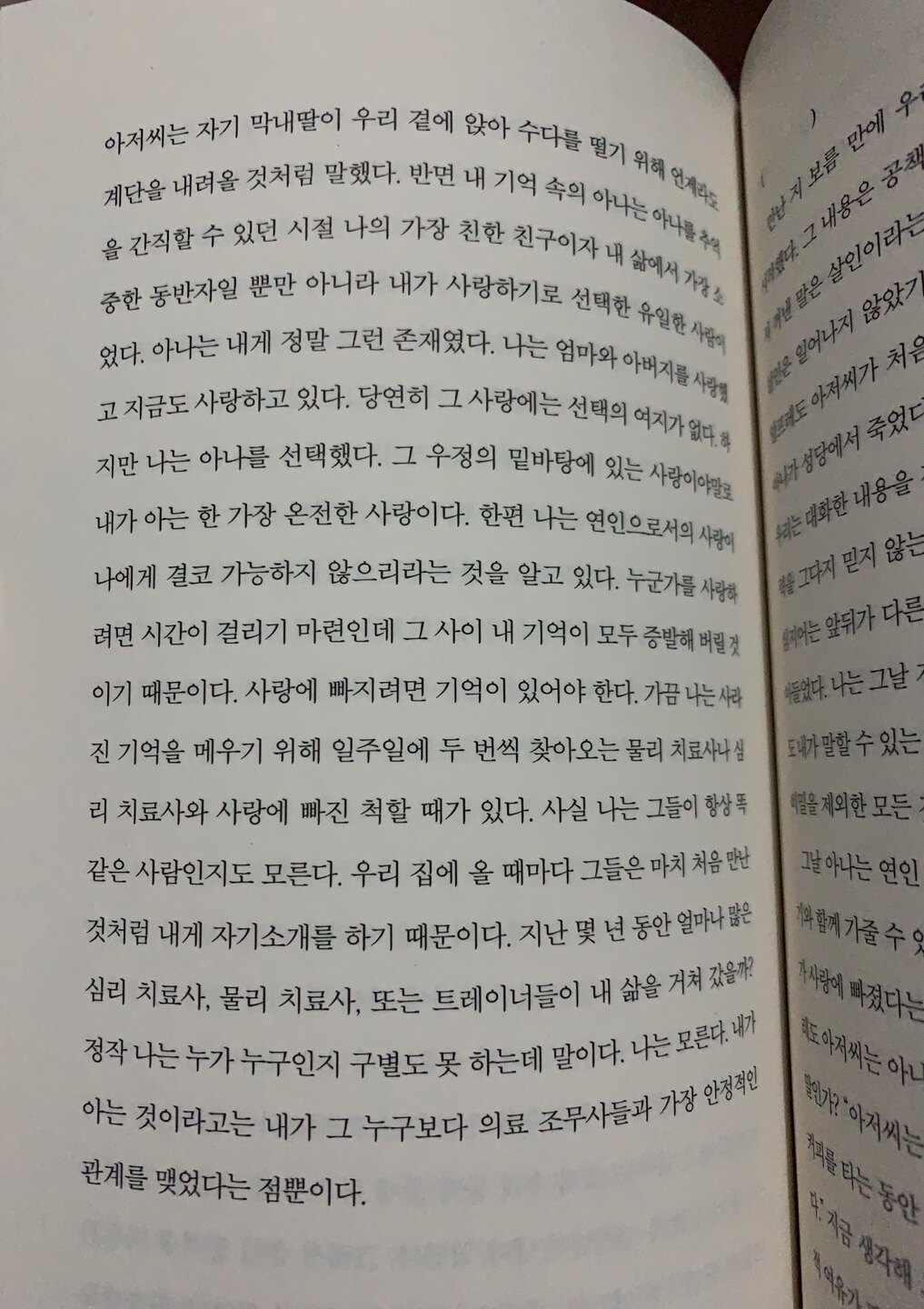
죽음이라는 요소는 범죄의 가장 크고 아픈 결과물이기에 보통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자 문장들이 펼쳐지는데 이 작품의 경우 각 인물마다의 고유 이야기와 삶에 대해 한 인물의 목차 안에서도 세부적인 목차를 숫자로 또 나눈다. 그만큼 간단히 원인-결과로 끝나는 범죄가 아니라 연루된 사람들의 당시 상황과 이야기, 혹은 인간성과 종교성을 알 수 없으면 안되는 이유있는 복잡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초반부를 읽을 때 왜 가족끼리 멀어졌나?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왜 가족들은 만나야했나?를 한참 고민했다. 그러다가 2-3인물의 목차를 지나가면서 사건의 피해자의 어린 시절을 읽게 되고, 그녀의 친구의 시점과 아버지를 지나 사건의 중요 쟁점을 쥐고 있는 인물들에게 다가가면서 개인적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설의 어디까지를 소설로 받아들여야하나를 고민하면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빨려들어가며 읽었던 것 같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유와 은폐로 한 생명이 세상을 떠나고, 그것이 결국 사랑 때문에 덮혀져야했던 것과 십자가와 종교 앞에서 자신이 나약한 인간임을 성스러운 이유가 아닌 행동의 타당성으로 이용해 진실까지 왜곡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지점까지 읽게 되며 작가의 장치가 견고하면서 흥미를 잃지 않게 만드는 단단한 것임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결국 죽은 사람은 존재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과거의 행동과 생각으로 진실이 드러나는 시간이 너무 흘러버렸고, 피해자와 동성인 개인의 입장에서 슬픔이 너무 많이 버무려진 이야기였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만큼 흡입력있는 인물들의 개인 서술부분들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고 다시 읽으면서 잘잘못을 먼저 따지지 말고 이 소설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다려보는 재미로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