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죽음의 에티켓 - 나 자신과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 대한 모든 것
롤란트 슐츠 지음, 노선정 옮김 / 스노우폭스북스 / 2019년 9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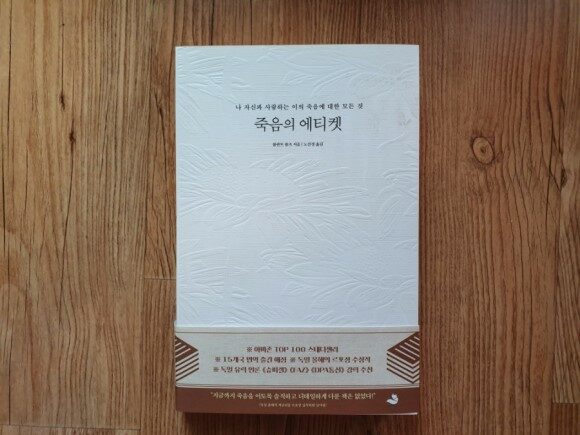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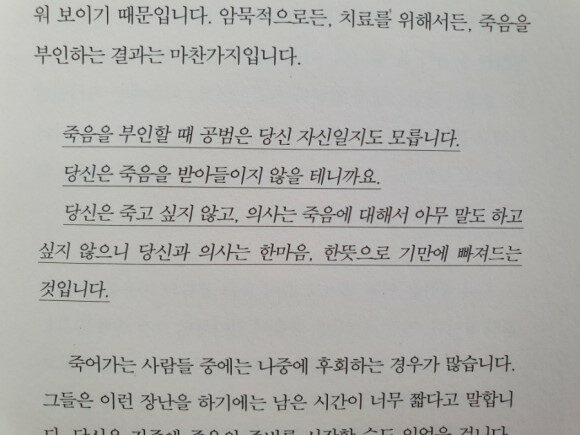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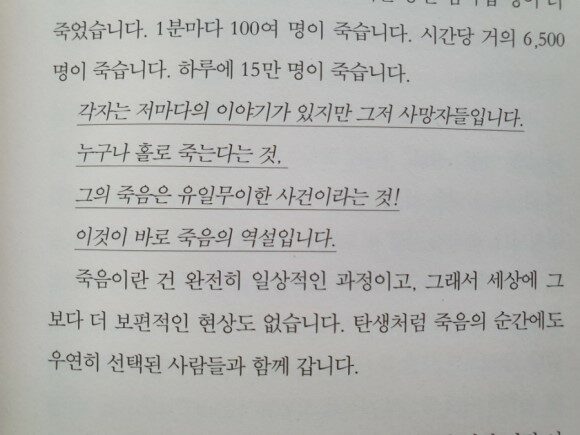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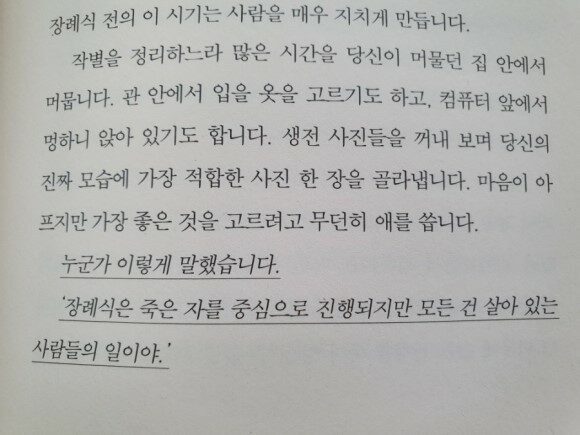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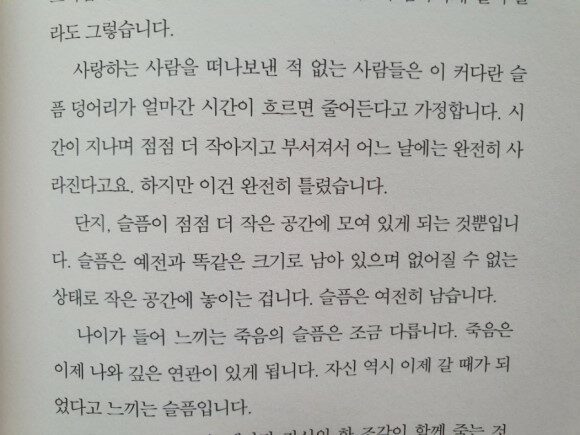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걸 모두 알고 있지만 자신이 죽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책으로도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네가 살고 있는 오늘이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원하는 오늘이다같은 말이 나왔겠는가. <죽음의 에티켓>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죽은 이후의 사람들을 위한 에티켓에 관해 자세히 소개한다. 참 신선하게 다가왔다. 출산에 대한 정보는 너무 많아 소화시키기 힘든 지경이면서 죽음에 관한 건 뭔가 침묵하게끔 만드는 분위기라서 말이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하는지 모른다. 죽음을 목격하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아니 그전에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얼마나 돈이 드는지, 죽음 이후 남은 흔적들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조차 모른다. 독일 사람이 쓴 책이라 독일에 한정하여 모든 과정을 서술해놓았는데 뭐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생각해보니 응급실에서 죽음을 많이 목격했지만 막내라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슬픔을 다 추스르기도 전에 유족에게 '장례식장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다. 아마 그땐 죽음을 너무 쉬이 목격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터라 그저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장례식장을 잠시 지켰을 뿐 그 이후의 과정은 어른들이 처리하였으니 몰랐다. 한 사람이 태어나 어느 한 국가의 국민이 되고 죽음으로 인해 사라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누구나 다 죽는 건데 나는 내가 죽은 이후의 사람들을 위해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라 자신이 죽은 이후의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살아 있는 동안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걸 상상하며 준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재산이 많은 사람은 죽고 나서 가족들이 분쟁까지 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
슬픔은 예전과 똑같은 크기로 남아 있으며 없어질 수 없는 상태로 작은 공간에 놓이는 겁니다. 슬픔은 여전히 남습니다.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 그만 좀 하라는 사람들은 아마 겪어보지 않아 쉽게 말하는 것이리라. 슬픔을 잊는 방법이란 게 있을리가. 시간이 지났다고 죽음이 일어나기 전 삶으로 돌아가긴 쉽지 않다. 죽음을 의학적 현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죽음을 앞둔 사람의 감정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난 이후의 행정적인 절차와 팁까지, 죽음에 관해 마치 신입사원 교육처럼 잘 다루어져 있다. 내가 죽고 나면 남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죽음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죽음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성스럽고 조심하게 이야기해야한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는 것 같다. 아주 솔직하게 필요한 정보를 담은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