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간을 읊조리다>는 시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특색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림과 곁들여진 짧은 한 문장이
마음과 감응하는 순간,
시는 마음 깊이 뿌리박기 시작한다.
언젠간 그 문장이 왕벚나무처럼 환한 꽃을 피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하며
자기 전 침대에서 한 두 문장씩 읽었다.
그리고 잠자는 동안 밤새 그 문장을 품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마음에 와닿는 문장들은
원문을 찾아보곤 했다.
(그렇게 해서 찾아본 시들이 20편이 넘는다.)
마음의 키가 얼마나 자라야
남의 몫도 울게 될까요
이 문장을 만났을 때도 그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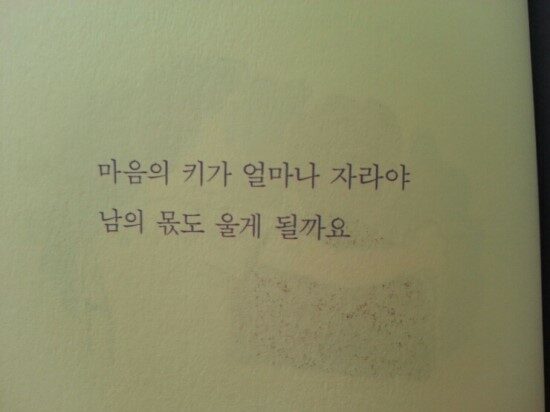
그렇게 만난 시가 바로 유안진의 '키'다.
키
유안진
부끄럽게도
여태껏 나는
자신만을 위하여 울어왔습니다
아직도
가장 슬픈 속 울음은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하여
터져 나오니
얼마나 더 나이를 먹어야
마음은 자라고
마음의 키가
얼마나 자라야
남의 몫도 울게 될까요
삶이 아파 설운 날에도
나 외엔 볼 수 없는 눈
삶이 기뻐 웃는 때에도
내 웃음만 들리는지
내 마음 난장인줄
미처 몰랐습니다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시, 알고 보니 <다보탑을 줍다>라는 시집에 수록되었다.
그 시집이라면... 엄마 돌아가시기 전
내가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선물해드렸던 시집이다.
이 모든 게 엄마의 선물 같다.
엄마는 유독 보라색을 좋아했는데
이 책에선 이 문장이 보라색으로 쓰여 있다.
그리고 옆의 그림도 보라색 바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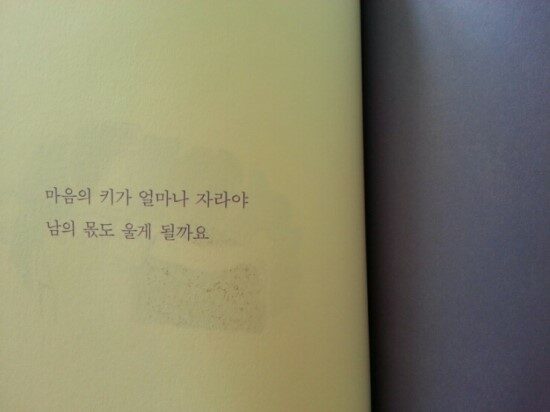
생각해보면 엄마가 좋아하셨을 시다.
내가 선물한 그 시집에서
이 시를 두고두고 읽으셨을 엄마를 생각하니 뭉클해진다.
내가 엄마 곁에 없을 때도 나는 그런 식으로 엄마랑 함께 했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내게 온 거구나.
이 시는.
엄마 돌아가신지 만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종종 막막해진다.
그런데 엄마는 순간순간 이런 방식으로
나를 찾아오신다.

노트에 시를 옮겨 적는다.
엄마가 좋아했고, 나도 좋아하는
보라색 펜으로.
이 책이 아니었다면 가질 수 없었던 시간이다.
시는 이렇게 기억을 환기시킨다.
그 기억은 살아가는 힘이 되어준다.
'순간'은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만든다.

그리고 시를 쓴 종이를 돌돌 말아 통 안에다 담았다.
한동안 엄마 때문에 경황이 없었고, 엄마 돌아가신 뒤로는 망연자실해 있느라
2010년 겨울부턴 트리를 만들지 못했다.
올 겨울, 실로 오랜만에 트리를 만들고 선물을 받을 때마다 트리 옆에 쌓아놨다.
시를 담은 통도 선물들과 함께 트리 옆에 놓아두었다.
이제부턴 좋은 시를 만날 때마다
노트에 옮겨 적은 뒤
통 안에 넣어둬야겠다.
저 통이 시로 꽉 차는 날,
저 통을 엄마 묘에 갖다놔야지.
생전에도 시를 좋아하셨으니
분명 좋아하실 거다.
엄마,
아직도 가장 큰 울음은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해서였다고,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마음의 키를 점점 키우도록 노력할게요.
남의 몫도 울 수 있도록.
그래서 슬피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게요.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사랑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