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화이트블러드
임태운 지음 / 시공사 / 2020년 12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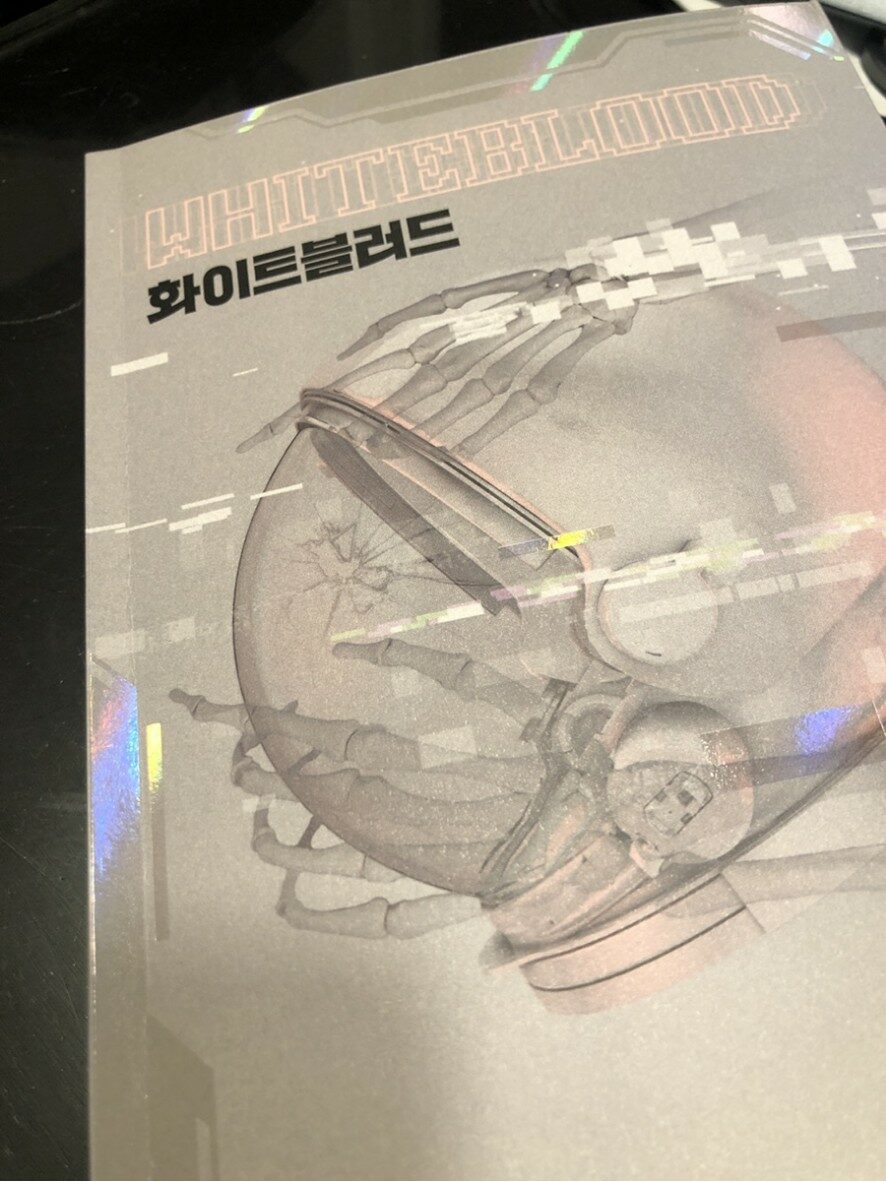
소설은 주로 추리 장르를 읽는 것을 좋아한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실마리를 좇으면서 범인을 찾거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때문이다. SF는 글을 읽으면서 상상하기보다는 실체화된 형태로 보고 싶어서 영화를 선호하는 편이다. 하지만 작년, 출간과 동시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해도 무방한 김초엽 작가의 단편집을 접하면서 SF를 글로 읽는 것에 큰 흥미가 생겼다. 화이트 블러드도 그런 맥락에서 흥미를 가진 작품이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특별한 건 없는 책이었다. 좀비도 아포칼립스도 다른 행성으로의 탈출도 SF장르에서 주로 다루는 클리셰들이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흠뻑 빠져들어서 읽고 있었다. 주인공 일행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하다가도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 책을 읽어나갔다. 이렇게 쭉 읽어나가게 만든 힘이 무얼까 생각하면, 독자가 스쳐지나가는 문장과 상황마다 무수히 많은 떡밥(복선)을 뿌리고 있어서라고 생각한다. 작가가 놓치거나 버리고 가는 떡밥은 없었고 그 많은 떡밥들이 회수될 때마다 '이걸 위한 장치였구나'하면서 감탄했다.
요새 들어 주로 읽은 책은 비문학이었다. 원래 문학 장르를 좋아하는 편이라 주로 소설을 찾아 읽었는데 이제는 비문학도 좀 읽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일부러 더 비문학을 읽고 있었다. 비문학은 모르거나 자세히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 새롭게 배울 수 있어서 재밌다. 하지만 아무래도 정보전달이 주가 되다보니 문학작품처럼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해질만큼의 흥미를 끌지는 못한다. (그래서 비문학, 특히 정보 전달서들이 점점 '이야기' 중심으로 변해가나 싶다)
SF장르의 클리셰로 가득했지만 그랬기에 더 쉽게 소설 속 무대를 머리 속에 그릴 수 있었다. 진부한 클리셰를 다룰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독자들에게 너무나도 친근하기때문일 것이다. 친근하기 때문에 더 생생하고 피부에 와닿는 것이다.
아쉬운 게 있다면 문체와 결말이었다. SF이니 만큼 SF가 갖는 날카롭고 차가운 분위기를 기대했는데 펼쳐놓고 보니 굉장히 낭만적이고 인간적이어서 아쉬웠다. 물론 그 부분이 문학의 묘미이니,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말이다.
재밌게 읽기는 했지만 결말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뭔가 얼레벌레 끝난 것 같은 느낌? 집중해서 읽었는데 갑자기 그 집중을 차단당한 것 같았다. 물론, 한권으로 끝내고자 했다면 그런 결말이 차라리 낫다는 생각도 든다. 상상력이 아무리 무한하대도, 생각해낼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순간 멈춰버리면 상상에도 한계가 그어져 버리니까 말이다. 아무튼, 2021년 독서생활에 스타트를 끊어준 즐거운 시간이었다.
* 서평이벤트로 책을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