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월이 되면 그녀는
가와무라 겐키 지음, 이영미 옮김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17년 8월
평점 : 
구판절판

소설은 많이 읽지만, 로맨스 소설은 그다지 읽지 않게 되었어요. 로맨스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4월이 되면 그녀는>은 로맨스 소설이라기 보다는 '연애 소설'이라는 말이 더 맞지 않나 싶네요. 로맨스란, '남녀 사이의 사랑 이야기'나 '연애 사건'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소설 중 대부분의 내용은 사랑에 대한 회의감으로 가득 차있거든요. 물론 그래서 결말이 더 와닿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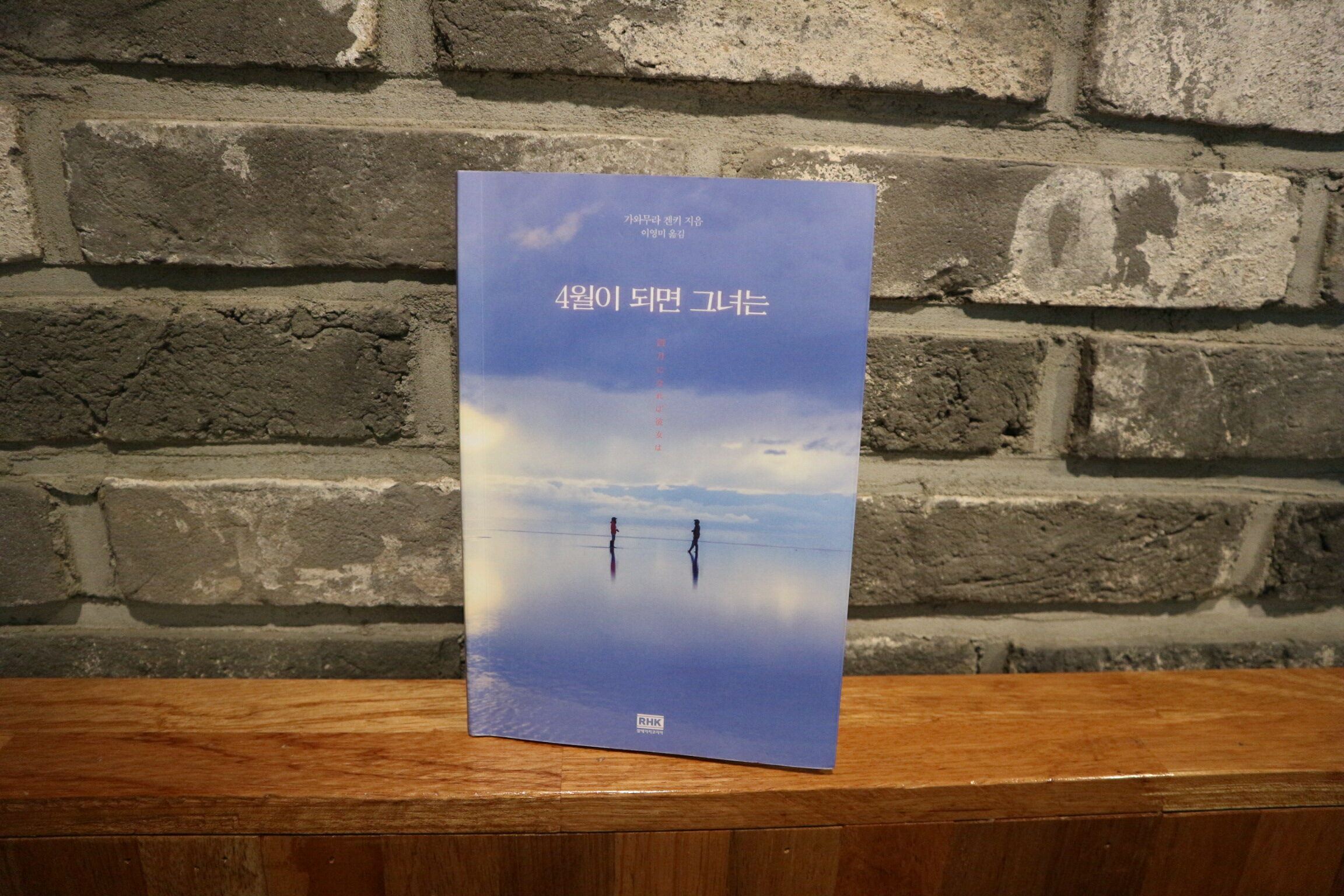
"어린 시절 여름날 해질녘, 베란다에 앉아 거세게 쏟아지는 소나기를 바라보던 나는 비가 그치기 몇 분 전에 미리 예감했죠. 아, 이제 곧 비가 그치겠네. 태양이 모습을 드러낼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언제나 비는 그쳤고, 황금색 빛이 하늘에서 내리쬐었죠. 나는 그런 예감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당신과의 사랑의 시작이 내게는 그런 거였어요.
그때의 내게는 나보다 소중한 사람이 있었죠. 당신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일이 분명 잘 풀릴 거라고 믿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는 그 4월이 아직도 어렴풋한 윤곽을 유지하며 계속 이어지는 기분이 들어요. 어렴풋하게, 그렇지만 언제까지고."
이 소설의 시작은 9년 만에 도착한 첫사랑의 편지로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9년 만에 첫사랑에게 편지를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지금 연락한 거지?'하면서 괜히 화나기도 할 것 같고, 그 시절과 많이 변해버린 지금을 생각하면 조금 슬플 것 같기도 해요.
'하루'의 편지를 받았을 때, '후지시로'는 '야요이'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이미 동거도 하고 있고 결혼도 별다른 문제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상하게 무언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마치 금방이라도 깨져버릴 것 같은 평화가 후지시로와 야요이를 감싸고 있습니다. 하루의 편지로 뭔가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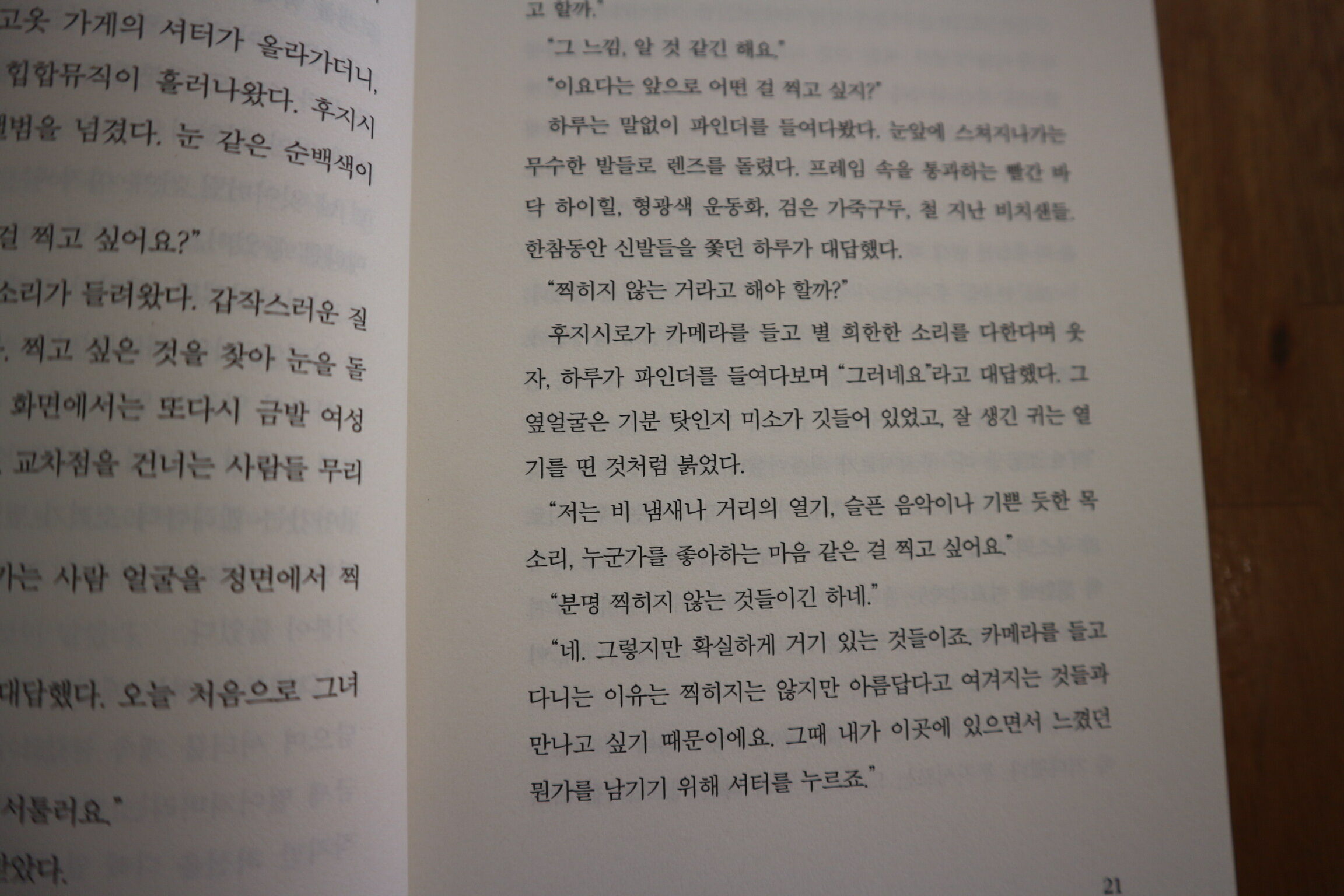
"저는 비 냄새나 거리의 열기, 슬픈 음악이나 기쁜 듯한 목소리,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같은 걸 찍고 싶어요."
하루와 후지시로는 대학 시절 카메라 동아리에서 처음 만납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을 회상하는 장면에서 카메라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소재로 등장해요. 특히 이 소설에서 다른 인물들을 변화시키는 '하루'라는 인물은 커다란 필름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데요. DSLR에 익숙해진 요즘, 솔직히 '필름 카메라'라는 단어를 들은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하루와 후지시로는 사진을 찍고 함께 동아리 방의 암실에서 인화를 해요. 필름 카메라는 찍고 나면, 내가 무엇을 찍었는지 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림'을 거쳐야만 결과물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필름이 한정되어 잇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찍고 싶은 것만을 찍게 돼요.
아날로그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런 감정선들이 이 작품 곳곳에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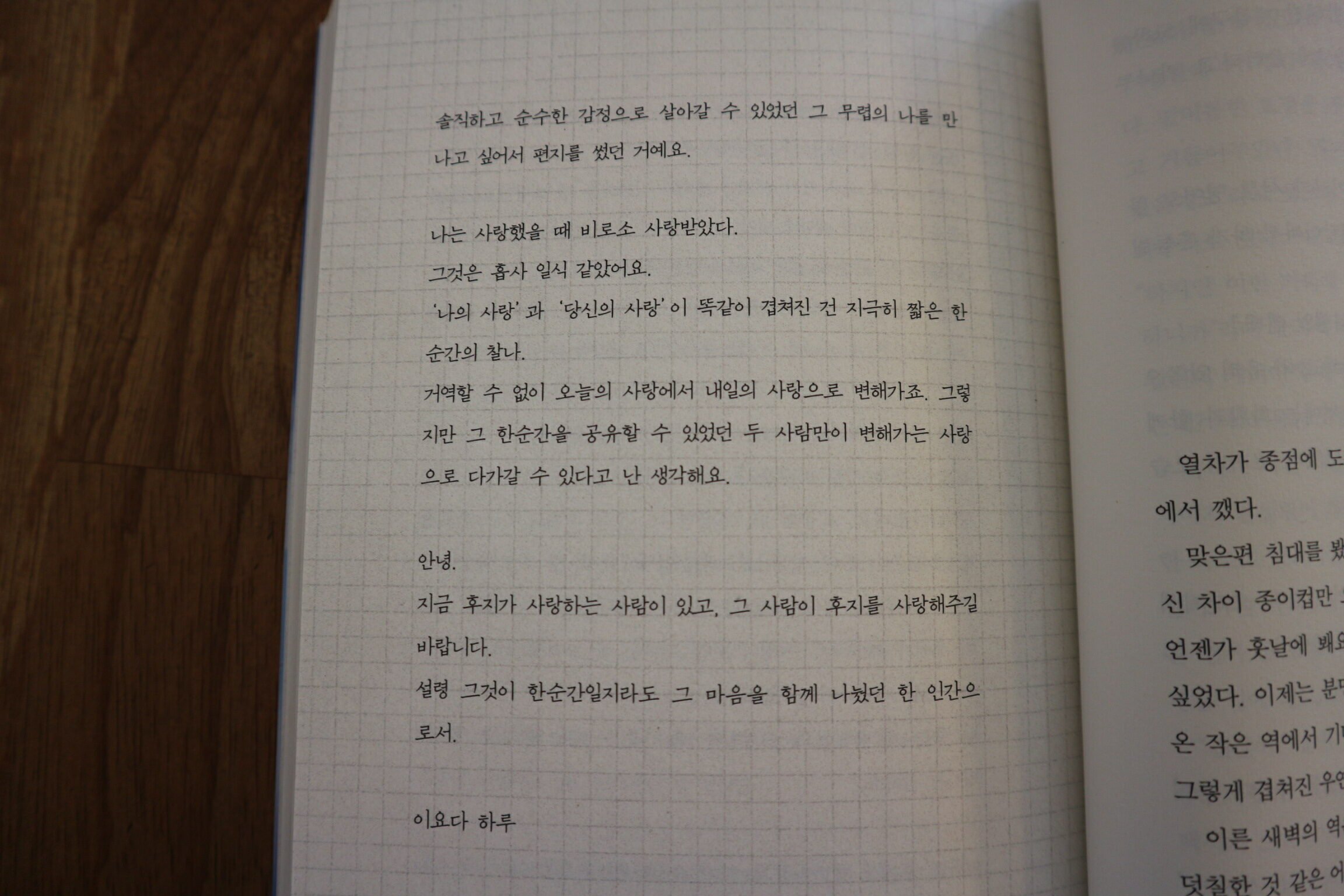
"어두운 하늘에 뜬 오렌지색 구름. 눈부신 모래밭에 짙게 드리워진 사람 그림자. 아무도 없는 오락실. 울면서 웃는 아이. 비 내리는 교차로에 쏟아지는 태양 빛. 사람도 사물도 시간도 색도 소리도. 하루는 '서로 다른 두 가지가 겹치는 순간'을 옅은 색의 세계 속에 가두어갔다."
책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가 겹치는 순간'을 강조하고 잇어요. 하루가 촬영하는 사진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들이죠. 옅은 색들이 섞여있는 사진들이에요. 어쩌면 이 책의 표지도 그렇게 정해졌을지 모르겠네요!
서로 다른 두 가지가 겹쳐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랑'을 빗댄 이미지 같아요. 그래서 <4월이 되면 그녀는>을 읽고 나서, 사랑이란 분홍색으로 표현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글오글) 하루가 찍고 싶었다던 '두 가지가 겹쳐지는 순간'이란 보이지 않는 사랑을 순간이나마 볼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니었을까요!

"콘크리트와 쇠로 에워싸인 우리 속 동물들은 연극 소품처럼 꼼짝도 않고, 눈동자만 굴리며 지나가는 인간들을 좇고 있었다. 후지시로가 보기에는 그 눈에서는 하나 같이 의지란 찾아볼 수 없고, 그저 습관만 남아 있는 것 같았다."
작품에는 하루, 후지시로, 야요이, 나나, 태스크, 준 등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가장 특징적이었던 부분은 이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나 연애관이 각자 다 다르다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이 중에서 무조건적으로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대부분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일상의 권태로운 사랑만을 습관처럼 하고 있었거든요.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규칙을 어기지 않기 위해 사랑한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서 태스크나 나나 같은 캐릭터들은 그에 대한 반향으로 결혼이라는 제도를 부정하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제 주위에서도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공감 됐어요. 자신의 생활이 중요해서 타인을 인생에 끼워넣고 싶지 안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그저 결혼을 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요즘 트렌드는 혼자 사는 삶을 강조하고 있지만, 또 다른 대답을 얻고 싶은 친구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사랑했을 때 비로소 사랑 받았다. 그것은 흡사 일식 같았어요. '나의 사랑'과 '당신의 사랑'이 똑같이 겹쳐진 건 지극히 짧은 한 순간의 찰나."
<이터널 선샤인>, <HER> 등의 영화를 후지시로와 야요이가 함께 보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이 영화들 또한 모두 사랑 영화이면서, 각기 다른 형태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들이에요. 작가는 각기 다른 사랑의 형태들을 이야기하고, 인정하면서 열정적인 사랑에 대한 향수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연애소설을 쓰려고 보니, 주변에 열렬한 연애를 즐기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싱글들은 좋아하는 상대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결혼한 부부는 사랑이란 정으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소설은 '연애가 사라진 세계'에서 사랑을 찾으려 발버둥 치는 남녀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희미한 '빛'과 함께 마지막 장면을 완성했을 때, 비로소 사랑에 대해 알고 싶었던 해답의 조각이 보인 것 같았습니다."
작가가 책 끝 부분에 쓴 부분을 따왔습니다. 작가의 말을 읽고 나니 이 책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크게 바라보면, 요즘 시대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사랑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오히려 사랑과 연애를 강조하는, 트렌드에 반향하는 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싱글, 오랫동안 연애 중인 커플, 결혼한 부부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랑이란 게 있기나 하니?'하고 비관적으로 바라보기 보다 이따금 그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도 중요할 것 같네요!
<4월이 되면 그녀는>을 읽으며, 사랑에 대해 생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