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느 공무원의 우울 - 오늘도 나는 상처받은 어린 나를 위로한다
정유라 지음 / 크루 / 2021년 11월
평점 :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나간 일들의 기억이 점점 잊혀간다. 그나마 남아 있는 기억들도 대부분 흐릿해져서 어렴풋하게나마 남아 있을 뿐이다. 특히 사회 초년생 일 때 가족들과의 기억이 별로 없다. 동생들과는 나이차가 많아 내가 직장에 다닐 때 남동생은 고1, 여동생은 초6이었다. 때문에 당시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기억들이 무척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흐릿한 기억 속에 즐거운 것도 있지만 가슴 아픈 일도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다. 지나간 추억이 모두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갔기에 그 순간 고통스러웠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기도 하다. 하지만 <어느 공무원의 우울>을 읽으면서 누군가는 지나간 기억일지라도 가슴속 깊숙이 박혀 물에 닿으면 쓰라린 상처처럼 어느 순간순간 아픈 기억으로 평생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공무원의 우울>을 읽는 내내 가슴이 먹먹하였다. 읽으며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였다. 어쩌면 개인적인 치부일 수도 있는 일들을 이렇게 글로 써내야만 벗어날 수 있었던 저자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용기 있다고 말해주고 싶기도 하다.
<어느 공무원의 우울>속에서 저자의 어린 시절은 마치 드라마의 한편처럼 우울하다.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에게 받은 감정을 저자에게 풀어내는 어머니, 그리고 철없는 남동생 속에서 저자의 어린 영혼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었다.
읽으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저자는 부모에게서 학대를 받고 폭력을 받으면서도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하려 애쓴다는 점이다. 화가 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p110
그날 저녁 아빠는 술을 진탕 먹고 와서 집에 혼자 있던 나를 개 패듯이 팼다. 정말 개 패듯이 팼다고 밖에 할 수 없겠다. 그 두터운 손바닥으로 내 뺨을 연달아 때렸고, 싹수없는 년이 지 어미가 하는 것처럼 지 아비를 무시한다며 쓰러져서 부엌 구석으로 기어가는 나를 발로 밟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던 아빠가 잠시 한눈파는 틈을 타서 현관문을 통해 도망치려고 했지만 문을 나서자마자 머리채를 잡혀 다시 끌려들어 갔다. 그리고 그 뒤로 진짜 엄청난 폭력이 쏟아졌다.
(중략)
세월이 흐른 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가족과 연락 두절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빠의 환갑을 못 챙겨 드린 게 미안했던 나는 작년 아빠의 칠순에 몇십만원대의 모직 코트를 선물해 드렸다. 연인은 어떻게 아버지에게 그렇게 당하고도 선물을 드릴 수 있냐며 대단하다고 했다. 성인이 된 나는 그저 부모이니까 나의 도리를 한 것이고 어릴 적 당했던 폭력을 잊은 것은 아니다. 난 아직도 어릴 적 아빠의 폭력이 큰 트라우마가 되어 모든 남성에 대해, 특히 중년 남성의 폭력에 큰 트라우마가 있다.
저자가 동성애자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어린 시절 가장 많이 접하는 어른 남성이 아버지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 어른 남성에게 어려서부터 폭력에 줄곧 시달렸다고 하면 남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어느 공무원의 우울>속에서 저자의 어머니에 대한 외사랑 이야기가 나온다.
p160
슬프게도 나는 이렇게 엄마에게 당하고도 아직 엄마를 사랑하고 있다. 상처받은 나를 치유하고 싶어서 쓰기 시작했던 글은 어느새 엄마를 향한 나의 외사랑을 끝내기 위한 글이 되었다. 내 외사랑은 끝나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어린 시절에는 엄마와의 교류가 가장 많다. 때문에 엄마에게 받는 영향도 매우 많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엄마에게서도 힘의 폭력과 언어 폭행들을 수없이 당하였다. 그럼에도 항상 저자는 엄마의 마음에 들고 싶어 하였고,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려 노력하였고,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결국 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한 맺힌 하소연 아니면 핀잔, 심하게는 화풀이로 되돌아올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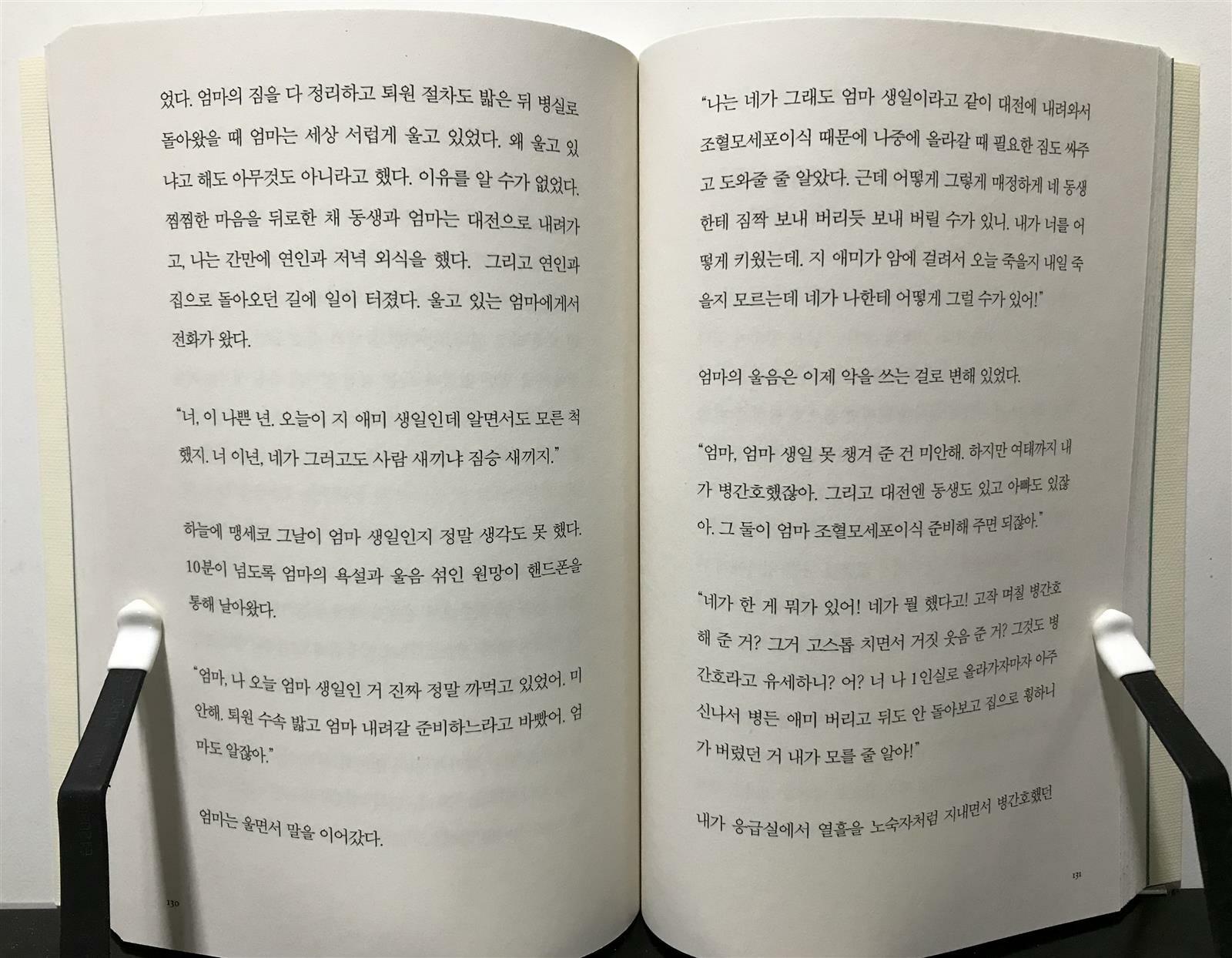
나도 어려서 엄마에게 많이 혼이 났다. 어떤 때는 굳이 혼날 일이 아닌데도 혼이 났다. 어린 시절에는 엄마라는 존재가 너무 컸기에 혼이 나면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 그리고 엄마에게 혼이 나지 않으려 애를 써보지만 엄마는 항상 만족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어려서는 엄마가 무서웠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엄마에게 이야기하면 엄마는 기억하질 못한다. 나는 가끔 내가 그렇게 혼날 일을 했었나 하며 의아해하는데 정작 나에게 상처를 준 엄마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엄마의 기억 속에 나는 혼자서도 다 잘했던 딸로 남아있다.
모든 부모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전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매도 들고 혼내기도 많이 혼냈다. 그런데 그 도가 지나쳐서 때로는 본인의 감정을 실어 훈육을 하다 보니 그것이 아이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기도 한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느 공무원의 우울>의 저자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자상한 연인이 옆에 있다는 것이다. 연인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간간이 등장하는 저자의 연인은 저자에게 매우 헌신적인 듯하다. 그래서 저자가 버틸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몇 번의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연인이 달려와 살려주었고 또 살아서 고맙다고 말하는 연인이었다.
<어느 공무원의 우울>을 읽으며 저자가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려서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치료를 받으며 글로 써냈다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린 시절 상처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많이 희석이 되어 저자에게 더 이상 물에 닿아도 쓰라리지 않는 상처가 되었으면 좋겠다. 부디 저자가 더 이상 부모에게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위해 살아가기를 바라며 응원하고 싶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