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침묵 박물관
오가와 요코 지음, 이윤정 옮김 / 작가정신 / 2020년 9월
평점 : 


죽은 사람들의 유품을 모아 박물관을 만드는 이야기 '침묵 박물관'. 알공예품을 표지로 해둔 것이나, 소개글을 봤을 때까지만 해도 사람이 죽은 뒤 유품에 얽힌 따뜻한 이야기를 기대했었다. 한 사람이 남긴 유품에는 어떤 이야기가 깃들어있을까 궁금하기도 했고. 하지만 직접 만나보게 된 침묵 박물관은 기대와는 몹시 다른 이야기였다. '그로테스크 미학의 정점'이라는 문구가 책을 받고나서야 눈에 들어왔다고 해야겠다. 그러니까 예상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소설이었단 말이다.

주인공인 남자는 고즈넉한 마을에 한 노파가 세운다는 박물관 기사가 되기 위해 면접을 보러 간다. 기차를 타고 온 남자를 마중나온 노파의 수양딸을 따라 간 곳에서 남자는 기괴한 노파를 마주하게 된다. 쪼그랄대로 쪼그라들어 주름에 파묻혀버린 사람같다라는 게 노파의 인상. 게다가 성격 또한 몹시도 고약해 남자에게 불쑥 성을 내기도 한다. 미적거리는 것이 딱 질색이라며. 그런 노파의 반응에 남자는 자신이 면접에 탈락했다 생각하고 다시 짐을 꾸리지만, 노파의 수양딸인 소녀는 남자가 면접에 통과해 박물관의 기사로 일하게 되었단 소식을 전해준다. 이후 시작된 박물관에 대한 계획과 물건들의 정보정리. 하지만 다른 모든 일을 제쳐두고 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으니, 그 일은 바로 유품들의 수집이었다.
이 유품 수집이라는 게 기묘하다. 유품을 모으기 위해 훔치기까지 한다라는 정보를 알고 시작했음에도 사람이 죽은 뒤 며칠 지난 다음에야 수집하러 가는 줄 알았지 이렇게 금방 방문해야할줄은 몰랐다. 역시 미적거리는 걸 딱 질색하는 노파의 성격에 맞게 기사인 남자는 마을에서 사망자 소식이 들리자마자 유품을 수집하러 가게 된다. 어린아이의 귀처럼 만들기 위해 일평생 귀를 잘라온 메스, 평생 가게 구석을 지킨 점원의 마른 헝겊,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는 화가가 연명하기 위해 먹은 바닥의 물감들. 듣기만해도 어딘가 기분이 나빠지는 것 같은 유품들은 노파인 할머니가 평생 수집해왔고 앞으로 기사인 남자도 수집해야 할 물건들이었다. 게다가 훔칠 수 밖에 없는 물건들. '육체가 틀림없이 존재했다는 걸 생생하게 증명하는 물건'이여야한다는 조건 때문인지 유품들은 대개 비밀스럽거나, 신체의 일부이거나, 마지막까지 지니고 있던 물건일 때가 많았다.
그런 유품들을 훔쳐내는 일을 보고 있자니 윤리의식이 고장나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다. 훔쳐낸 유품들로 박물관을 만드는 데 동조하는 사람들이나 이해한다고 말하는 침묵의 사제들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음침한 분위기임에도 소설이 잘 읽힌다는 게 참 아이러니 하긴 했지만 어쨌든 공감하며 읽을만한 소설은 아니었다. 그리고 마을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에 대한 반전과 결론 또한 마찬가지였고. 음습한 분위기가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말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다. 게다가 노파의 막무가내식 대화나 윽박지름은 어떤 광기에 절여진 의무감으로 움직이는 인물을 보는 기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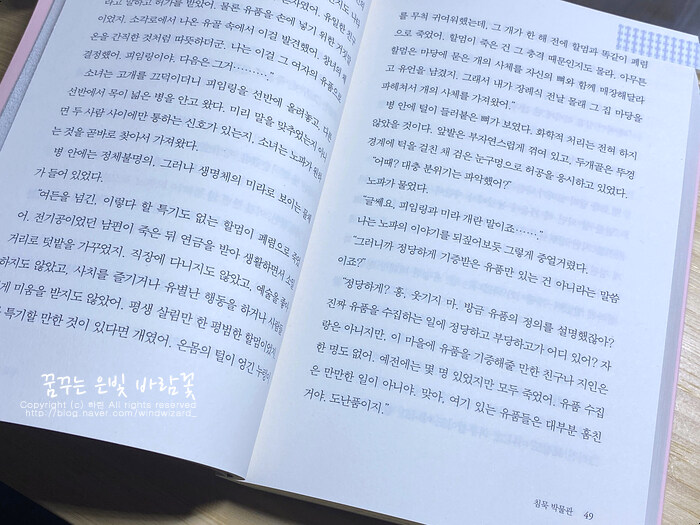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1인칭인 글이지만 특이한 점이 있다. 다 읽고 나서야 깨달았는데 등장인물이 모두 노파, 소녀, 소년, 정원사, 가정부 등 지시대명사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등장인물의 이름이 없는 건 유품으로만 한 사람의 삶을 보겠다는 작가의 뜻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점에서 보면 왠지 유품으로 사람의 지난 삶을 판단하는 노파의 모습이 작가와 겹쳐보이기도 한다. 물론 이것이 의도한 장치인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소설이 유품을 훔치고, 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한 준비과정만 보여주느냐면 그건 아니다. 마을 한가운데에서 폭파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마을에서 연쇄살인사건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사건은 죽음의 다양성을 말하기위해 넣었나 싶기도 했으나 주인공인 남자가 폭파 사고현장에서 사망한 침묵의 전도사가 착용하고 있던 옷을 훔치고 유두가 도려내진 채 사망한 살인사건의 피해자의 유품으로 유두가 걸맞다라고 생각하는 걸 보고 묘한 기분이 들었다. 이게 제정신인가라는 게 정상적인 감상이지만, 애초에 유품박물관 자체가 비정상적인데다 주인공 남자보다 주변 인물들이 더 비정상 같아서 할말을 잃었다. 일본 소설 특유의 괴기스러움이 결말까지 지배하고 있어서 뒷맛까지 찜찜했던 소설이다.
물건은 그냥 내버려두면 삭아서 없어지고 말아.
벌레, 곰팡이, 열, 물, 공기, 소금, 빛, 전부 적이지.
하나같이 세계를 분해하고 싶어서 안달해.
변하지 않는 건 이 세상에 없어. - 86p
